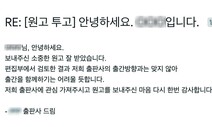함께 읽은 그림책 중 한 권인 <버섯 소녀>의 작업물들.
5월 어느 저녁, 부산의 한 서점에서 호를 그리며 둘러앉은 사람들 사이에 있었다. 맞은편에는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 저자인 무루 작가가 자리했고, 그는 그림책 두 권을 두 번에 걸쳐 낭독했다. 한 번은 책 속의 문장을, 또 한 번은 그림을. 청중은 처음엔 고요히 집중하며, 나중엔 동요하고 참여하며 그림책을 함께 읽었다.
우선은 표지 그림의 인상부터. 신비롭다, 무섭다, 편안하다, 슬프다, 귀엽다, 서늘하다, 아련하다… 하나의 그림에서 비롯된 감상이 맞는지 믿기 어려울 만큼 느끼는 모양이 사뭇 다르다. 이것은 오독일까?
그림책 작가들의 작가로 유명한 비올레타 로피스는 한 인터뷰에서 “그림은 시간과 공간을 관통하는 여행의 기억”이라고 답했다. 그렇기에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정보를 전해”준다고. 이처럼 그림책은 필연적으로 ‘오독’(誤讀)이라는 단어와 거리가 먼 장르인지도 모르겠다.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만이 크게 열려 있을 뿐이다.
문자언어에 익숙한 성인은 그림언어에는 낯설어하는 경우가 많다. 글만 집중해 읽고 그림은 대충 훑어보고선 그림책을 빈약하다고 느끼거나, 반대로 그림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의심하며 그림책을 어렵다고 느낀다. 어른들이 그림책을 같이 읽는 일은, 그리하여 그림언어와 화해하며 자신의 감정을 믿고 타인의 눈을 믿으며 층층으로 쌓아가는 대화가 된다.
분량이 적고 글밥도 적어 누구나 짧은 시간에 가볍게 볼 수 있지만, 그림책을 여럿이 같이 읽는 시간은 그래서 결코 짧거나 가볍지 않다. 더군다나 좋은 그림책은 그림에, 글에, 글과 그림의 긴장에, 숨겨진 것들과 빈칸으로 가득한 것을.
5월의 부산에서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결말부의 한 장면에 한참을 머물렀다. 버섯의 포자처럼 보이지 않게 무수히 흩날리며 어디론가 떠나는 듯한, 펼침면 가득 색들이 칠해졌지만 마치 글도 그림의 서사도 모두 멈춘 듯한 그 그림을 두고 무루 작가는 ‘나를 채우는 빈칸’에 대해 질문했다. 예상치 못한 동요로 쏟아져 나오는 감정들, 갑자기 열려버린 기억과 꿈의 서랍들, 저마다의 소중한 존재들. 그날 처음 만난 우리는 자신의 유년과 미래를 가로지르고, 서로의 현재에 잠시나마 깊숙이 연결된 것 같았다. 독자의 작은 점 하나하나가 작가가 마련해놓은 빈칸을 점점이 가득 메우는 광경을 목격한다.
그림책을 짓고 읽는 어른들은 <우리가 아는 모든 언어>에서 존 버거가 말한 ‘일종의 고아’ 같다는 생각을 한다. 이들은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프리랜서’이자 ‘어떤 성운에도 속하지 않는 외톨이별’이다. 그러나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세계’의 이면 혹은 바깥을 그려낸 그림책들을 읽으며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눌 때면 “모든 성운을 다 합친 것보다 그 별들이 내는 빛이 더 많”다.
혹시 외롭다면, 그림책을 펼쳐들었지만 도무지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세상에 무감해졌다면, 어릴 때 보던 명작 동화에 그쳐 있다면, 그림책 모임의 문을 두드려보기를. 지금만큼 성인 그림책 모임이 활발한 때도 드물다. 찾기만 한다면, 그림책 읽기의 매력을 발견할 지도가 보일 것이다. ‘신비로움과 무서움과 편안함과 슬픔과 아련함’이 공존하는 세계의 지도가.
그리고 분명 알게 될 것이다. “그 섬에 아직 내가 찾지 못한 작고 아름다운 것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무루,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 어크로스 펴냄)
글·사진 지우 오후의소묘 편집자
*책의 일: 출판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소개합니다. 직업군별로 4회분 원고를 보냅니다. 3주 간격 연재.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이정현 국힘 공천관리위원장 사퇴…“생각한 방향 추진 어려워”
![[단독] 이태원 참사 다음날 용산구청장, 대통령 경호처 ‘8100’번과 통화했다 [단독] 이태원 참사 다음날 용산구청장, 대통령 경호처 ‘8100’번과 통화했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3/53_17733793058302_20260313501532.jpg)
[단독] 이태원 참사 다음날 용산구청장, 대통령 경호처 ‘8100’번과 통화했다

배현진 “참 어렵게 산다, 장동혁”…징계 중단하잔 말에 SNS 글

미 공중급유기, 이라크 상공서 추락…“적군 공격·오인사격 아냐”

“아빠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길”…60일된 딸 둔 가장 뇌사 장기기증

이하상 “특검 안 나온 재판은 불법” 트집…재판장, 17초 만에 “기각”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1/53_17732246670747_20260311503553.jpg)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

한준호 “김어준, 사과·재발방지해야”…김어준 “고소·고발, 무고로 맞설 것”

박지원 “레거시 언론과 언어 차이”…김어준 ‘공소 취소 거래설’ 제기 두둔

‘미국 vs 일본 4강전 용납 못 해’…또 대회 중 바뀐 WBC 대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