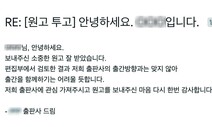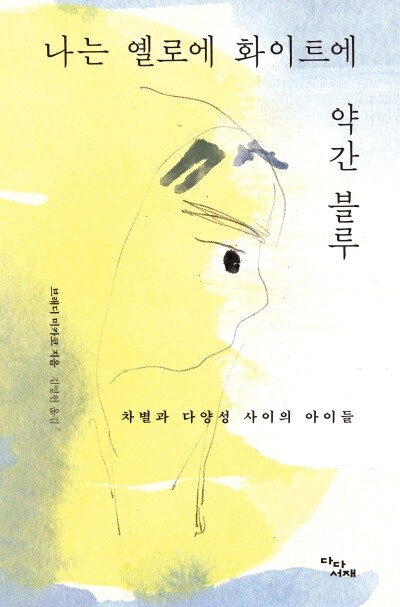
출판편집자들 사이에는 ‘마흔이 되면 실무는 끝’이라는 풍문이 떠돈다. 처음 출판사에 입사했을 때부터 선배들은 나에게 조언했다. 지금부터 중년을 대비해야 한다고. 편집자 생활 길어야 마흔까지라고. 그러다 술에 취하면 말했다. “야, 진짜 마흔 넘으면 어떡하냐… 귀농이라도 해야 하나….”
마흔이 된 선배들은 실제로 회사를 많이 떠났다. 중간관리자 역할에 지쳐 떠나고, 조직에 상처받아 떠나고, 때로는 출판이 지겨워 아예 이 바닥을 떠났다. 진짜 귀농하기도 했다. 나 역시 어쩌다보니 회사를 나왔다. 퇴사할 땐 출판사를 돌아보지도 않겠다고 결심했다. 책이라면 지긋지긋해서 그 좋아하던 독서까지 딱 끊었다. 딱히 다른 궁리가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절대 출판사에는 취업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리고 출판사를 창업했다. 무슨 개그 같지만 사실이 그랬다. 취업을 거부하자 창업이 온 것이다. 벗어날 수 없는 출판의 늪이었다.
창업한 건 사실 내 의지라기보다는 남편의 의지였고, 상황의 의지였다. 부부가 나란히 퇴사하고 재취업을 고민하던 어느 날, 남편이 말했다. “외서 들여와서 내가 번역하고 당신이 편집하면 그럭저럭 출판사 아닌가?”
처음엔 반대했다. 차라리 공부를 하라고, 내가 돈 벌어 학비를 대겠다고 했다. 그게 더 미래가 있어 보였다. 출판사에 들어가 10여 년간 ‘건국 이래 최대 불황’이 아닌 해가 없었다. 부부가 함께 투신했다간 평생 가난을 못 면할 것이다. 그러나 남편은 웬일로 고집을 부렸고 점점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다. 퇴사한 편집자 부부가 갈 수 있는 가장 그럴싸한 길은 출판사 창업이라는 걸 나도 알고 있었다. 알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며칠 고민하는데 남편이 꾸준히 나를 설득했다. 그중 귀에 꽂히는 한마디가 있었다. “우리만의 안목으로, 우리만을 위한 일을 하고 싶어.” 우리만을 위한 일. 그러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일. 그런 일이 세상에 있을까. 마음이 흔들렸다.
생각해보면 나는 나만을 위해 일한 적이 없었다. 누군들 그럴까. 조직에 속한 사람이 자신만을 위해 일하는 건 불가능하다. 일이 좋아서, 자아실현을 위해 한다 해도 일의 결과는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 나 역시 그랬다. 좋은 영향일 때도 있었겠지만 손해를 끼치는 일도 많았을 것이다. 조직의 수혜자가 되기도 하고 희생자가 되기도 했다. 누구나 그렇다. 결국 조직에 속한다는 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일일 것이다.
‘나만을 위한 일’을 한다는 건 수혜도 희생도 없이 제 몫을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남의 떡고물을 먹을 요행은 없겠지만 남의 똥을 치우는 수고도 없다. 내가 내고 싶은 책만 내고, 책이 팔린 만큼만 내가 얻는다. 그렇게 일하는 건 과연 어떨까. 적어도 억울한 일은 없지 않을까. 그때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마음을 굳히자 남편에게 조건을 걸었다. “딱 3년. 3년 해도 퇴사 전에 받던 연봉을 못 벌면 접고 취직하는 거야. 빨리 시작하자.” 호탕하게 말했지만 내심 3년 하다 망해도 (만으로) 30대라는 나름의 계산이 있었다. 마흔도 안 됐는데 취직이 어렵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 빨리 망하려면 빨리 시작하는 수밖에.
출판계 실무 정년이라는 마흔을 3년 앞두고 우리는 그렇게 창업했다. 수중에는 단돈 200만원이 있었을 뿐이다. 1년이 지난 지금, 두 번째 책 <나는 옐로에 화이트에 약간 블루>로 월매출 1500만원을 넘겼다. 다행히 3년 안에 망하진 않을 것 같다.
김남희 다다서재 편집장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다카이치 “독도는 일본 땅, 국제 사회 알려야”…민주 “즉각 중단” 촉구

“중동 에너지 시설 잿더미로”…이란, 미 하르그섬 공격에 보복 예고

이 대통령 “‘이재명 조폭 연루설’ 확대 보도한 언론들 사과조차 없어”

북, “상대국 삽시 붕괴” 600㎜ 방사포 쏜 듯…한·미 연합연습에 무력시위

“윤석열의 꼬붕” “이재명에 아첨”…조국-한동훈 SNS 설전

“국내 선발 3~4명뿐인 KBO의 한계”…류지현 감독이 던진 뼈아픈 일침

고 이해찬 총리 49재…“김대중·노무현 대통령과 옛이야기 나누시길”

트럼프 ‘이란 석유 수출 터미널 있는 하르그섬 파괴’

“바레인서 이란으로 미사일 발사”…걸프국 개입하나

이정현 “조용히 살겠다…내 사퇴로 갈등 바라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