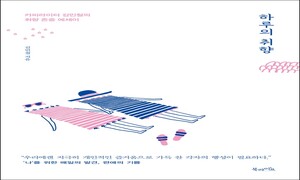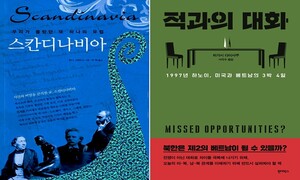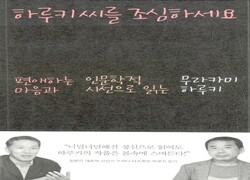‘서울의 교통혼잡과 공기오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대문 내 진입 차량을 통제한다.’ ‘600년 서울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문헌학자 김시덕은 어쩌면 당연하게 느껴질지 모르는 이 문장들에 물음표를 단다. 어째서 사대문 안만 서울인가? 한성 백제는 서울의 역사가 아닌가? ‘서울 사대문 안’을 귀히 여기는 이들이야말로 조선시대 한양의 경계에 집착하면서 왕족주의에 젖어 있는 게 아닌가?
어릴 적부터 잦은 이사로 서울과 이웃 수도권 도시들을 두루두루 경험한 (열린책들 펴냄)의 김시덕에게 서울은 여전히 만들어지는 도시, 사람들에게 ‘발견’되기를 바라는 도시, ‘존중’받기를 기다리는 도시다. ‘조선의 서울’인 사대문 안은 현재 서울의 일부분일 뿐 서울은 계속 몸집을 불려왔다. 특히 1936년과 1963년 대규모 행정구역 변경을 통해 ‘대경성’ ‘대서울’로 팽창하며 현재의 꼴을 갖췄다. 이 때문에 서울 곳곳엔 풍납토성 일대처럼 백제시대의 왕성, 조선시대에서 근대에 이르는 시기의 서민 동네, 현대 고층 아파트 등 ‘삼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이 있다.
서울을 특정 시대의 특정 계급을 위한 특정 공간으로 한정짓는 편견을 버린다면, 우리는 궁궐·왕릉·관아가 아니더라도 서울 사람들의 삶과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더 넓은 텍스트를 얻게 된다. 이로써 “문헌의 사료적 가치나 문학적 가치를 따지기 이전에 눈앞에 있는 문헌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문헌학자로서의 기본적 태도가 서울 답사에 적용된다. 그는 “모든 옛책이 동일하게 귀중한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 속의 모든 공간과 사람도 동일하게 가치 있다”면서 유명한 건물이나 사건 현장을 보고 다니는 것보다 특별할 것 없는 곳을 걸어다니며 감춰진 재미와 변화를 찾는 것이 훨씬 높은 단계의 답사라고 힘주어 말한다.
이에 그의 발길은 자신이 인연을 맺었던 잠실·부천 소사·안양 평촌·방배동·중계동·고양 일산·개포동을 훑은 뒤, 청계천·남산·신용산·동부이촌동·잠실·송파·반포·중랑촌·영등포·여의도·흑석동·가리봉·시흥 등지로 ‘실전 답사’를 떠난다. 서울의 모습을 크게 변화시킨 것은 한강종합개발계획이나 대규모 택지개발 같은 인공적 조처가 많았지만, 1925년 을축년 대홍수는 1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짙은 흔적을 남기고 있다. 을축년 대홍수는 한강 물길까지 바꾸며 서울 곳곳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현재의 서래마을도 이때 반포리 저지대 사람들이 서리풀 공원 기슭으로 옮겨오며 생겨난 것이다.
서울의 정체성이 뭐냐는 그의 고민은 논쟁적인 지점으로 이어진다. 사직단 확장을 위해 1960년대 지어진 종로도서관 건물을 철거하는 게 맞나? 태릉 주변 묘역을 확장하기 위해 태릉선수촌을 없애야 하나? 그의 답변은 이렇다. “왕조시대의 유적을 확장 복원하기 위해 근현대 서울 시민들의 유산을 헐어도 된다는 사고방식에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왕조의 신하가 아니라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의 시민입니다.” 그의 주장이 앞으로 풍부한 토론으로 이어진다면 서울이라는 도시는 더 깊은 의미를 담게 될 것 같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이정현 국힘 공천관리위원장 사퇴…“생각한 방향 추진 어려워”

미 공중급유기, 이라크 상공서 추락…“적군 공격·오인사격 아냐”

“아빠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길”…60일된 딸 둔 가장 뇌사 장기기증

배현진 “참 어렵게 산다, 장동혁”…징계 중단하잔 말에 SNS 글

한준호 “김어준, 사과·재발방지해야”…김어준 “고소·고발, 무고로 맞설 것”

이하상 “특검 안 나온 재판은 불법” 트집…재판장, 17초 만에 “기각”

오세훈, ‘장동혁 2선 후퇴’ 압박 초강수…서울시장 추가 모집 ‘버티기’

미국,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련 조사 개시…한국 포함
![이 대통령 지지율 66% 최고 기록…민주 47% 국힘 20%, 격차 커져 [갤럽] 이 대통령 지지율 66% 최고 기록…민주 47% 국힘 20%, 격차 커져 [갤럽]](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3/53_17733660011987_20260313500923.jpg)
이 대통령 지지율 66% 최고 기록…민주 47% 국힘 20%, 격차 커져 [갤럽]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1/53_17732246670747_20260311503553.jpg)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