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의 명성과 음악적 성취만 놓고 보면 엘턴 존이 한 수 위라고 생각하지만, 영화 <킹스맨: 골든 서클>에서만큼은 존 덴버가 엘턴 존을 이겼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다. 존 덴버의 공연 모습. 한겨레
“죽은 존 덴버가 산 엘턴 존을 이기는 영화.”
얼마 전 영화 을 시사회에서 먼저 보고 나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남긴 말이다. 영화 스토리와 관련된 스포일러는 아니다. 그저 영화에서 두 음악가가 남긴 여운을 언급한 감상평일 뿐이다.
영화 내용은 이렇다. 영국 비밀 첩보조직 ‘킹스맨’이 악당의 습격으로 궤멸되다시피 한다. 주인공 에그시(태런 에저턴)와 멀린(마크 스트롱) 요원만 겨우 살아남는데, 이들은 대서양 건너 미국에 형제 조직 ‘스테이츠맨’이 있음을 알게 된다. 결국 킹스맨이 스테이츠맨의 도움을 얻어 범죄조직 ‘골든 서클’을 일망타진한다는 이야기다. 이 과정에서 영국의 신사 문화와 미국의 카우보이 문화의 대비는 중요한 관람 포인트 중 하나다.
음악과 관련해선 특히 재밌는 교차 지점이 등장한다. 영국 출신 멀린 요원은 미국 가수 존 덴버를 좋아한다. 존 덴버는 미국 정서를 대변하는 컨트리와 포크로 유명한 싱어송라이터다. 반면 미국 출신 범죄조직 우두머리 포피(줄리앤 무어)는 영국 가수 엘턴 존을 좋아한다. 포피는 영국 여왕에게서 기사 작위까지 받은 엘턴 존을 납치해 자신만을 위해 연주하도록 한다. 엘턴 존은 영화에 본인 역으로 직접 출연해 ‘신스틸러’급 활약을 펼친다. 자신의 히트곡 (Saturday Night’s Alright for Fighting)을 상황에 맞게 “웬즈데이(Wednesday)…”로 노랫말을 바꿔 부르는 대목에선 환호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하지만 엘턴 존의 이 모든 장면들을 더해도 이 하나의 장면에는 못 미치는 듯하다. 멀린 요원이 존 덴버의 노래 (Take Me Home, Country Roads)를 부르는 장면이다. 그는 이역만리에서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이한 순간 이 노래를 부른다. 영국 고향땅이 그리워서였을까? 그저 평소 가장 좋아하던 노래여서? 뭐가 됐든 이 노래만이 주는 포근하고 안온한 정서가 긴박한 상황과 아이러니하게 맞물리면서 인상적인 장면을 만들어낸다. 가수의 명성과 음악적 성취만 놓고 보면 엘턴 존이 한 수 위라고 생각하지만, 이 영화에서만큼은 존 덴버가 엘턴 존을 이겼다고 하는 게 무리는 아닐 것이다.
존 덴버는 1943년 미국 남서부 뉴멕시코주 로스웰에서 태어났다. 독일계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름 헨리 존 도이첸도르프 주니어(Henry John Deutschendorf Jr.)를 쓰다가 나중에 존 덴버라는 예명을 지었다. 덴버는 그가 오래 살았고 무척 좋아한 지역인 콜로라도주의 주도 이름이다. 존 덴버는 미국의 대자연을 사랑했고, 실제 (Rocky Mountain High) 등 자연에 관한 노래를 많이 발표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환경보호운동에도 앞장섰다. 하지만 존 덴버는 1997년 자신이 몰던 경비행기 추락 사고로 캘리포니아 바닷가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의 나이 54살이었다.
존 덴버가 1971년 발표한 노래 는 그의 이름을 널리 알린 출세작이자 대표곡이다. ‘시골길이여, 날 고향으로 데려다주오’라는 제목이 상징하듯 전원적이고 목가적이다. 시작부터 그렇다. “천국이나 다름없는 웨스트버지니아, 블루리지산, 셰넌도어강….” 나는 웨스트버지니아주에 가본 적도 없고, 그곳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 블루리지산이며 셰넌도어강은 더더욱 모른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생소한 지역을 품어낸 이 노래에 감정을 이입하게 된다. 마치 동요 이나 나훈아의 을 듣거나 부를 때처럼 말이다. 누군가 이 노래를 들으며 ‘천국이나 다름없는 내 고향 구례, 지리산, 섬진강…’을 떠올린다 해도 하등 이상할 게 없다. 미국인이든 영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전세계 사람들이 각자 자기 고향을 떠올리며 평온한 마음을 갖도록 해주는 노래, 그게 바로 의 힘이다.
나는 서울 출생이다. 이 노래를 들으며 떠올릴 법한 고즈넉한 시골 풍경은 내 기억 속에 없다. 대신 나는 이곳을 떠올린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스무 살 무렵까지 성장기를 보낸, 내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다. 둔촌주공아파트는 1980년 첫 입주자를 받았다. 1단지부터 4단지까지 한데 모여 143개동 5930가구 대단지를 이룬데다 그 안으로 시내버스는커녕 마을버스도 들어가지 않아 마치 하나의 마을 같은 느낌이었다. 예전 아파트들이 대체로 그렇지만 특히 동 사이 간격이 널찍하고 녹지가 많았다. 심지어 단지 안에 작은 동산도 두 개나 있었다. 아파트 단지 바깥으론 논밭과 과수원이 있었다. 겨울이면 논이 스케이트장으로 변해 근사한 놀이터가 돼주었다.
처음 이사 갔던 1980년대 초반만 해도 아파트 앞 주차장에 차가 많지 않았다. 우리는 주차장을 운동장 삼아 주먹야구며 오징어며 다방구 등 놀이를 했다. 단지 내에 오르막·내리막길도 많아 중학생 때는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누볐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죽마고우가 유학길에 오르기 얼마 전, 우리는 단지 안 동산에 올라 잘 마시지도 못하는 소주를 들이켜며 송별회를 했다.
이런 추억이 서린 둔촌주공아파트가 곧 사라진다. 낡을 만큼 낡아 재건축에 들어가는 것이다. 지난 7월 공식 이주 기간이 시작됐고, 내년 1월 본격적인 철거 작업이 시작된다고 한다. 이곳을 고향처럼 생각하는 이가 꽤 많은가보다.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이곳을 기록해두자는 움직임이 일었고, 이는 ‘안녕, 둔촌주공아파트’ 프로젝트로 이어졌다. 곳곳에 쌓인 추억을 담은 글과 사진을 모아 책을 냈고, 페이스북 페이지도 만들어 글·사진·영상 등을 꾸준히 올리고 있다. 이를 통해 본 지금의 둔촌주공아파트에는 아파트보다 더 키가 큰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다. 1980년에는 어린 묘목이던 나무들이다. 그 나무들도 사라질 거라 생각하니 착잡해졌다.
지금은 뿔뿔이 흩어진 동네 친구들끼리 약속을 했다. 가을이 가기 전 둔촌주공아파트에 가서 구석구석 돌아보며 추억을 곱씹자고. 그곳으로 가는 길에 나는 를 들을 것이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동사무소 직원 ‘점 하나’ 실수로 남동생이 남이 되었다

이 대통령 “산골짜기 밭도 20만~30만원”…부동산 타깃 확대

스케이트 날이 휘면 다시 펴서…아픈 누나 곁 엄마에게 메달 안긴 아이

‘800만원 샤넬백’…받은 김건희는 무죄, 전달한 전성배는 왜 유죄일까

트럼프 말리는 미 합참의장…“이란 공격하면 긴 전쟁 휘말린다”

‘계엄군 총구’ 안귀령 고발한 전한길·김현태…“탈취 시도” 억지 주장

멀쩡한 치킨 쌓아놓고…‘배민온리’에 처갓집 속타는 사연

“누가 반대했나 밝혀라”…통합안 보류에, TK 의원-지도부 내부 충돌

대전·충남 통합 불발되면, 강훈식은 어디로…

대출 연체 ‘5일’ 넘기지 말고…상환 힘들면 채무조정을

![<span>[뮤직박스] 다시 불러보는 “그대 고운 내 사랑~”</span>](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612/53_15919406315765_4215919406200643.jpg)
![<span>[뮤직박스] 지금이 어쩌면 ‘화양연화’</span>](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508/53_15889189060769_211588918890229.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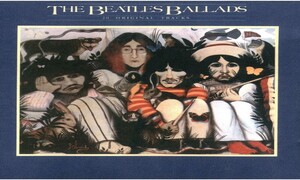



![[속보] ‘공천헌금 1억 수수’ 강선우 체포안 가결 [속보] ‘공천헌금 1억 수수’ 강선우 체포안 가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4/53_17719178646426_2026022450315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