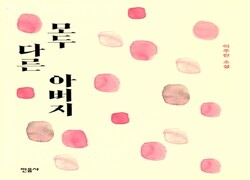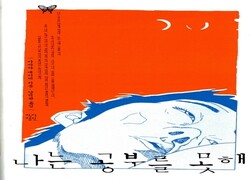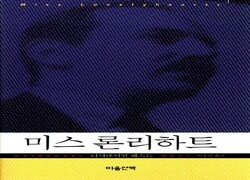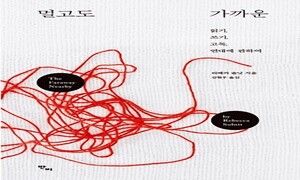몇 해 전, 지인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 “현진씨는 가족 이야기할 때 꼭 우리라는 말을 붙이네요.” 듣고 보니 그러긴 했다. 가족을 화두로 올릴 때면 으레 ‘우리’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온다. 우리 엄마가 어쩌고저쩌고, 우리 동생이 어쩌고저쩌고. 우리라는 말 대신 ‘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건 어쩐지 이상하다. 가족과 오래 떨어져 산 탓일까? 유난히 ‘우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나이지만, ‘내 엄마’라는 말을 낯설다 느끼는 것은 비단 나만의 경우는 아닐 것이다. 손위 형제를 칭할 때도 마찬가지다. 내 오빠, 내 언니라는 말을 나는 들어본 적 없다. 문법적으로 전혀 틀린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우리 엄마’ 대신 ‘내 엄마’라고 하는 순간, 엄마의 전부를 부른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든다. 뭐랄까, 엄마와 나의 관계를 통칭하는 데 실패한 단어를 사용한 것만 같다. 그런데 동생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내 동생’이라는 말이 그다지 어색하지 않게 들린다. ‘내’를 붙일 수 있는 대상이 이토록 제한돼 있다는 사실은 놀랍다. 심지어 ‘우리 동생은’보다 ‘내 동생은’이라는 말이 훨씬 자연스럽게 들린다. 아마 누나인 ‘나’는 내 동생을 나의 한 부분으로 여기는 건 아닐까?
일본 만화가 마스다 미리의 를 읽은 것은 바로 ‘내’ 누나라는 호명 때문이었다. 문득 궁금했다. 동생들은 누나 이야기를 입에 올릴 때 어떤 식으로 말문을 여는지. ‘우리 누나’라고 하는지, ‘내 누나’라고 하는지. 과연 누나라고 부르기는 하는지. 의 지하루와 준페이는 나이 차이가 큰 남매다. 누나 지하루는 직장 생활을 한 지 오래됐고 동생 준페이는 이제 막 입사했다. 그 바람에 둘은 오랜만에 한집에서 살게 됐다. 누나는 애인이 있고, 퇴근도 준페이보다 늦어 늘 귀가 시간이 늦다.
준페이가 보기에 누나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요리에 전혀 취미가 없으면서 제빵책을 산다. 가끔 소설책을 읽는 것 같긴 한데 몇 달 동안 같은 책을 가방에 넣어다닌다. 읽기나 하는 건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남자친구와 결혼할 생각이 아예 없지 않지만, 하루 10시간만 누군가의 아내로 살고 나머지 14시간은 지금의 나로 살고 싶다고 한다. 툭하면 건강식을 먹어야겠다, 핀란드로 여행을 떠나야겠다,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등등 더 나은 삶을 위해 잦은 결심을 하지만 실천에 옮기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누가 봐도 혼잣말이 분명한데 모두의 귀에 들릴 만큼 큰소리로 한다는 게 특징이다. 준페이는 누나가 밥 대신 빵을 먹으면서, 생소한 치즈를 먹으면서 맛있다고 거듭 중얼거리는 이유가 왜 빵을 먹는지, 이 치즈는 어떤 치즈인지 물어봐달라는 제스처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못 들은 체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귀찮기 때문이다.
귀찮은 이유 역시 명백하다. 질문을 던지는 순간, 누나의 대답은 곧장 잔소리로 이어진다. 몸에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 나열하면서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꼬리를 문다. 동생 역시 아는 정보인데, 누나의 설명은 당최 끝날 기미가 없다. 혹 다시 누나와 떨어져 살게 되더라도 잘 챙겨먹으라는 취지의 이야기일 테지만, 동생은 누나에게 그런 잔소리를 듣는 게 불편하다. 게다가 동생이 보기에 누나의 건강식은 며칠 가지 않는다. 편의점 도시락을 사서 퇴근하는 일상으로 금세 돌아오는 걸 봐선 잔소리를 들어야 할 사람은 바로 누나였다.
하지만 누나와의 대화가 늘 잔소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쓰레기봉투를 버리러 가다 말고 준페이는 물었다. 누나, 뭐 버릴 거 없어? 누나의 대답은 뜻밖이다. 너무 열심히 살려는 마음, 직장에서 무시당했던 분통함, 누군가 배려 없이 던진 한마디, 지긋지긋하게 혼난 기억을 죽 늘어놓으면서, 누나는 “버린 것을 확인할 수 없어서 인간은 고뇌하는 거야”라는 아리송한 말을 던진다.
말하자면 누나는 매일 나쁜 기억들을 버리며 살고 있지만 제대로 버렸는지 남은 건 없는지 확인할 길은 없어 찝찝하다. 누나의 돌발적이고 불필요한 쇼핑 목록은 그걸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헤어진 남자친구의 선물은 어떻게 하냐는 물음에 누나는 비슷한 대답을 한다.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릴 뿐, 헤어지고 말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필요 없는 물건과 같은 나쁜 기억을 버린 자리에 새로운 무언가를 채워나가는 것, 그건 일찌감치 독립한 누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체득한 비법 같은 거였다. 막 신입사원이 된 누나가 동생에게 넌지시 던지는 충고랄 수도 있다.
가끔 길에서 가족을 만나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질 때가 더러 있다. 데이트 중인 누나의 웃는 모습,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우연히 목격했을 때 문득 준페이는 누나라는 사람의 전부를 알 것도 같다. 아니, 누나라는 사람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다. 한번도 실행된 적 없는 누나의 결심들은 그녀를 이해하는 다양한 퍼즐 중 하나였다. 혼자 자신만의 삶을 꾸려가는 누나의 삶에 깃든 진지함이 희미하게 엿보이는 순간. 어쩌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알고 이해하는 사람은 누나라는 것, 그래서 우리 누나가 아니라 ‘내 누나’라는 걸 준페이는 이제 안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홍준표, 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맞장구…“부동산 돈 증시로 가면 코스피 올라”

일본, 이제 ‘세계 5대 수출국’ 아니다…한국·이탈리아에 밀려나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29억원에 내놔…“ETF 투자가 더 이득”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물로 내놔…부동산 정상화 의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직 사의…사법 3법 추진에 반발

이진숙 “한동훈씨, 대구에 당신 설 자리 없다” 직격

러시아 “돈바스 내놓고 나토 나가”…선 넘는 요구에 우크라전 종전협상 ‘난망’

민주 “응답하라 장동혁”…‘대통령 집 팔면 팔겠다’ 약속 이행 촉구
![왜 부자는 수돗물을 마시고 가난한 사람이 병생수 마실까 [.txt] 왜 부자는 수돗물을 마시고 가난한 사람이 병생수 마실까 [.txt]](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7/53_17721459993113_20260226504293.jpg)
왜 부자는 수돗물을 마시고 가난한 사람이 병생수 마실까 [.txt]

송언석, 천영식 8표차 부결에 “당 의원 일부 표결 참여 못해,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