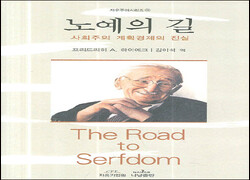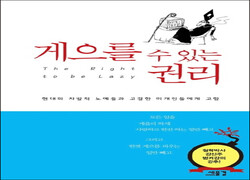1
“이 자식 불온학생이구만. 막스 책을 갖고 다니네.” “그거 막스 베버인데요.” “그래, 카를 막스 베버.” 1970~80년대 군사정권의 불심검문이 횡행하던 때, 카를 마르크스와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막스 베버 책을 가지고 있으면 경찰서에 잡혀갔다는 일화다. 오늘 소개할 책은 그 이름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았으나 실제로는 자본주의 정신을 찬양한 막스 베버의 정치학 고전 (폴리테이아 펴냄).
이 책은 그가 1919년 독일 뮌헨대학의 한 학생단체의 요청으로 한 강연을 책으로 펴낸 것이다. 주요 내용은 국가란 무엇이고, 정치의 본성은 무엇이며, 정치인은 어떤 자질을 가져야 하는가다. 특히 그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암울하기 이를 데 없는 독일 정국과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의회를 의식한 듯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그러나 전체 글에서 그가 더욱 중요하게 강조하고 오늘날에도 고민해볼 만한 주제는 정치인은 어떤 소명의식을 가져야 하는가다. 유명한 ‘신념윤리’와 ‘책임윤리’가 여기서 등장한다. 베버가 보기에 정치인은 신념을 바탕으로 행동하되 그것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그는 ‘열정’ ‘책임감’, 그리고 양자를 조율하는 ‘균형적 판단’을 강조한다. 달리 말하자면 이상과 현실의 조화랄까. 어찌 보면 당연한 이 명제를 베버가 유독 강조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1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독일 전역에서 벌어지는 혁명적 상황, 특히 좌파의 행동이 지나치게 자신의 신념만을 강조하고 일체의 타협을 배제한다고 판단해 신념과 더불어 ‘책임’을 강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을 시작으로 하여 진보신당, 지금의 노동당까지 10년 넘게 정치를 하고 있는 내 입장에서도 베버의 주장은 경청할 부분이 있다. 정치인은 신념과 동시에 결과를 예견하고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진보정치인과 활동가가 자신의 신념과 동시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활동한다. 그러나 가끔 베버의 이 주장을 근거로 하여 진보세력이 오직 신념윤리만을 강조할 뿐 책임윤리는 무시한다고 비판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다. 예를 들어 1997년 김대중-이회창이 대결한 대통령 선거에서 끝까지 완주해 이후 민노당 건설에 초석을 놓은 권영길의 선택은 책임윤리를 저버린 것인가. 진보정치가 성장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한국 정치의 중요 과제로 본다면, 권영길의 선택은 내가 볼 때는 올바른 것이었다.
베버는 자신의 주장을 책에 열정적으로 서술했지만 실제로는 독일 정치에 비관적이었던 것 같다. 책의 말미에 그는 “여러 정황으로 미뤄볼 때, 10년 후에 우리는 반동의 시대에 접어들 거라는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전망한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아무리 세상이 어리석고 비열해 보일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말할 확신”을 언급하며 청년들에게 ‘소명’을 가진 정치인이 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자신은 책을 쓴 지 1년 만에 폐렴으로 세상을 떴고, 그의 비관적인 전망대로 독일은 10여 년 뒤 히틀러의 지배하에 들어가고 말았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1/53_17732246670747_20260311503553.jpg)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

관세 ‘만능키’ 꺼낸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한국 포함

장동혁 “지방선거 전 징계 논의 중단”…오세훈 인적 쇄신 요구는 외면

‘왕사남’ 장항준 “막살고 싶은데…와이프가 경거망동 말라 해”

침묵하던 장동혁 “절윤 진심”…오세훈, 오늘 공천 신청 안 할 수도

‘오래된 지도로 잘못 공격’…미군, 이란 초교 ‘170명 집단희생’ 조사

미 민주당 “이 대통령 덕에 안정됐던 한미 동맹, 대미 투자 압박에 흔들려”
![‘공소취소 거래설’ 진실은? [그림판] ‘공소취소 거래설’ 진실은? [그림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311/20260311503585.jpg)
‘공소취소 거래설’ 진실은? [그림판]
![‘절윤’ 결의에도 국힘 지지율 여전히 17% [NBS] ‘절윤’ 결의에도 국힘 지지율 여전히 17% [NBS]](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2/53_17732834157654_20260312501458.jpg)
‘절윤’ 결의에도 국힘 지지율 여전히 17% [NBS]

이스라엘, 이란 정권 붕괴 기대했지만…“환호가 좌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