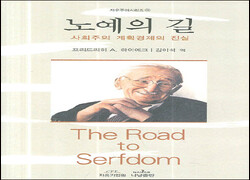1
몇 해 전 대학 동기 모임. 한 친구가 내게 질문을 했다. “삼성전자와 한류의 공통점이 뭔지 아냐?” 뜬금없는 질문에 당황하는데 그가 말했다. ‘노동시간’, 아니 정확히는 ‘노동윤리’가 그의 답. 요지는 이랬다. 삼성전자의 아침 7시 출근-오후 4시 퇴근(실제 노동시간은 훨씬 길다)이나, 하루 10시간 이상씩 춤과 노래를 연마하는 아이돌들의 연습생 시절이나 모두 엄청난 노동시간의 산물이라는 것. 세상에 그런 장시간의 노동을 묵묵히 수행하는 노동자도 드물뿐더러, 그 오랜 시간 고통을 인내하며 오직 스타가 되기 위해 몇 년을 연습생으로 지낼 수 있는 청소년도 한국 외에 없다는 것이다. 그의 말대로 우리의 노동시간은 세계 최장이고, 남이 시키지 않아도 그것을 스스로의 노동윤리로 만들어 순종해나가는 사람들이 한국인이다. 그러나, 그렇게 수행하는 노동이, 그 노동의 윤리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줄까.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노동은 신성한 것이 아니라 가급적 회피해야 하는 어떤 것이고, 노동자들 스스로가 노동의 윤리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열변을 토한 책이 있었다. 폴 라파르그의 .
그는 카를 마르크스의 사위다. 쿠바에서 태어나 유럽으로 건너와 의사의 삶을 꿈꾸다가 사회주의자의 길로 들어섰고, 마르크스의 딸 라우라와 결혼했다. 그런데 노동가치론과 잉여가치론으로 유명한 마르크스의 사위가 ‘노동은 가급적 집어치우고 하루에 3시간만 일해도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외쳤으니 참 재밌다. 그러나 이 책은 단순히 노동시간을 줄이자고 설교만 하는 책은 아니다. 흥청망청 타락한 삶을 살며 노동자에게 그 타락한 삶의 토대를 제공하라고 윽박지르는 자본가를 타도해야만 노동자가 고통스러운 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는 전형적인 불온 선동문이다. 지금이야 꼭 그렇게 볼 수만 있겠느냐마는 그 시대의 자본가들, 이른바 부르주아의 타락한 삶과 노동자들의 비천한 삶의 대비는 옆에서 바라보기에도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것 같다. 이 책 곳곳에는 이 비정한 노동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면 어떤 짓이든 해야 한다는 선동이 난무한다.
그의 시대와 달리 오늘날은 각종 노동법과 근로기준법 등이 제정됐고, 헌법에 노동3권도 보장돼 있다. 그러나 라파르그가 살았던 시대와 오늘날의 한국이 그렇게 크게 다르다 할 수 있을까. ‘고통스럽게 매일 15시간씩을 일하며 쌓여온 피로는 과로를 더욱 증폭시키고, 결국 이 노동자들은 피곤에 절어 집에 도착하면 다음날 충분히 쉬지도 못한 채 공장에 나가기 위해 다시 잠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그의 말에서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수많은 노동자의 삶은 멀지 않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때가 되었다. ‘내세에 행복하자고 현세에 고난을 걸어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했던 석가모니의 물음처럼 우리는 ‘함께 지금 여기에서’ 가혹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어깨를 결어야 한다. 이 불온한 선동문의 아름다운 가르침은 그것이다. 노동당 전 부대표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이재명 대선후보 자격 박탈’ 향해 초스피드 질주한 조희대 코트

국방부, 장군 아닌 첫 국방보좌관 임명 나흘만에 업무배제

‘체급’ 다른 이란…통제 불능 장기전도 부담, 미 지상군 투입 회의적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팔리나…홍익표 “사겠다는 사람 나와”
![가슴 치며 ‘검은 연기’ 보지 않으려면…어떻게 할 것인가 [아침햇발] 가슴 치며 ‘검은 연기’ 보지 않으려면…어떻게 할 것인가 [아침햇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3/53_17725196285494_20260303502471.jpg)
가슴 치며 ‘검은 연기’ 보지 않으려면…어떻게 할 것인가 [아침햇발]

SK하이닉스 15.5%↓ 삼성전자 14.1%↓…애프터마켓서 하락폭 커져
![[사설] 노태악 후임 대법관 제청 안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설] 노태악 후임 대법관 제청 안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2/53_17724442937947_20260302502331.jpg)
[사설] 노태악 후임 대법관 제청 안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노조 “조희대 사퇴하라…국민의 정치적 선택권 뺏으려해”

‘이란 공습’에 장동혁 “김정은의 미래” 박지원 “철렁해도 자신감”
![악마화하지 마라 [그림판] 악마화하지 마라 [그림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303/20260303503624.jpg)
악마화하지 마라 [그림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