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벨라스케스의 <시녀들>(1656)과 파블로 피카소의 <시녀들>(1957).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카소 미술관의 하얀 벽. 피카소가 주인인 이곳에 벨라스케스를 따라 그린 그림이 가득하다. 일흔여섯의 피카소는 17세기 스페인 화가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그림을 베껴 다시 그리는 작업을 했다. 그것도 오직 한 작품. ‘회화에 관한 회화’로 불리는 벨라스케스의 대작 (Las Meninas)에 대한 해석이었다. 총 58점의 연작을 만들고는 피카소의 ‘시녀들’이라 이름 붙였다. 8월17일부터 12월30일까지 고작 다섯 달간의, 습작이라고 하기엔 강도 높은 노 화가의 몰두였다. 선배 화가를 향한 존경? 적개심? 피카소는 서로의 밑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쥐어짜는 집착남이었을까.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인내력 테스트일지도 모르겠다.
1957년 피카소가 반복적으로 그려댄 은 크기도 색채도 스타일도 각양각색이다. 녹색·자두색·검은색 배경으로 화면을 꽉 채운 도 있고, 시녀 셋만 쏙 빼내어 그린 작업도 보인다. 자신이 그린 처럼 삼각형·사각형으로 꽉 찬 은 미술관 창문 반쪽만 한 아담한 크기다. 어떤 그림은 벨라스케스의 만큼은 아니지만 꽤나 웅장하다. 방 사이에는 피카소의 이런 글귀가 있다. “나는 벨라스케스의 이 아닌 매번 ‘나의 시녀들’(my Las Meninas)을 그리고 싶다.” 질문에 뚜껑을 덮는 듯한 단정적 어투다.
그런데 왜? 여러 개의 그림은 오히려 하나로 보인다. 파괴와 해체의 동작. 마르가리타 공주는 못난이가 됐고, 리얼리즘 화풍의 강아지는 심통 난 입체파 화가에 의해 도형으로 분절돼 혀를 내민다. 명화로 칭송받는 을 짓이기고 파헤쳐야 직성이 풀렸을까. 피카소의 행위는 자기 눈을 찌르고 아버지를 죽이면서까지 ‘내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싶던 오이디푸스의 복수심 같은 것이었을까. 영국의 평론가 존 버거는 이 그림에서 “벨라스케스로부터 무엇인가 강탈하고 동시에 존경을 표하며 다시금 아이처럼 보호를 요청하는” 피카소를 본다.
피카소의 벗이던 존 리처드슨은 이런 답을 내놓았다. “1957년 무렵 피카소는 고국인 스페인에서의 회고전을 절실히 원했다. 스페인 예술사의 상징인 벨라스케스를 통해 자신과 스페인을 어떻게든 연결하고 싶어 했다.” 공산주의자로 알려진 피카소는 프랑코 독재정권을 비판했지만 동시에 비밀리에 협상을 벌여 ‘고국’에서의 회고전을 꿈꿨다. 협상은 중단됐지만 고국을 의식하는 거장의 꿈은 계속됐다. 그림 속 화가의 얼굴에는 스페인 출신 달리의 트레이드마크인 콧수염도 보인다. 피카소가 이 그림을 그리며 궁금했던 것은 ‘자신의 위치’ 아니었을까. 그림 속에서도 그림 밖에서도 파리에서도 고국에서도 언제나 1인칭 주인공인 ‘나’ 말이다.
현시원 독립 큐레이터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동사무소 직원 ‘점 하나’ 실수로 남동생이 남이 되었다

스케이트 날이 휘면 다시 펴서…아픈 누나 곁 엄마에게 메달 안긴 아이

‘800만원 샤넬백’…받은 김건희는 무죄, 전달한 전성배는 왜 유죄일까

이 대통령 “산골짜기 밭도 20만~30만원”…부동산 타깃 확대

“누가 반대했나 밝혀라”…통합안 보류에, TK 의원-지도부 내부 충돌

대전·충남 통합 불발되면, 강훈식은 어디로…

트럼프 말리는 미 합참의장…“이란 공격하면 긴 전쟁 휘말린다”

‘계엄군 총구’ 안귀령 고발한 전한길·김현태…“탈취 시도” 억지 주장

이 대통령 “계곡 불법시설 못 본 척한 공무원 엄중 문책하라”
![법원장님 들어가십니다 [그림판] 법원장님 들어가십니다 [그림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224/20260224503791.jpg)
법원장님 들어가십니다 [그림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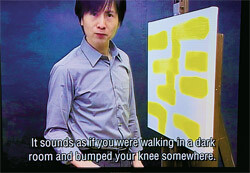










![[속보] ‘공천헌금 1억 수수’ 강선우 체포안 가결 [속보] ‘공천헌금 1억 수수’ 강선우 체포안 가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4/53_17719178646426_2026022450315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