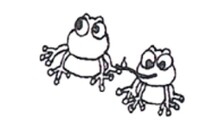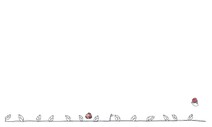일러스트레이션 제천간디학교 이담
이건 오늘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이야기다. 저녁을 함께 먹은 친구에게 나의 투병 일대기를 들려주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빈혈이 심해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부터 했다. 이렇게 길고 뿌리 깊은 이야기를 한 것은 오랜만이었다. 투병 후 만난 사람 중 이 친구가 꼭 열네 번째다. 선생님, 친구들 하나하나 손으로 꼽아보니 그렇다. ‘아직은’ 열네 번째를 기억하지만, 이제 몇 년이 더 흐르면 내가 이 이야기를 몇 번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컵에 있는 물을 몇 번 따라 얕은 웅덩이를 만들면 몇 번을 따라냈는지 알 수 있겠지만, 웅덩이가 흘러넘쳐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점점 커져 강물로 흐르면 세는 것이 무의미해지는 것처럼. 열네 번째 컵을 흘려보냈다. 내가 아팠던 이야기.
이곳에 쓰는 것으로 열다섯 번째 컵을 흘려보낸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두통에 시달리다 병원에 갔더니 빈혈이 심했다. 루푸스, 소아백혈병 등 여러 병이 의심되니 계속 검사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몸이 점점 나아지는 것 같았고 두통은 익숙해졌다. 병원에 그만 다녔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이 되어 본격적으로 몸이 안 좋다는 걸 느꼈다. 그해 5월과 10월에 각각 왼쪽과 오른쪽 무릎 뒤쪽에 대상포진이 발병했기 때문이다. 부위는 작았지만 마치 바늘 수천 개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다. 작은 포진이 빽빽이 잡힌 상처 부위는 징그러워서 다들 인상을 찌푸렸다. 다행히 겉은 교복 치마로 가려졌다. 하지만 걸을 때마다 온 다리를 상처 속에 욱여넣는 것 같은 통증은 가려지지 않았다. 아팠다.
중학교 2학년 때 점점 체력이 바닥을 쳤다. 아주 잠깐 아침에 학교 가기 전 할머니 할아버지와 수영하러 다녔는데, 수영장에서 나오면 한 걸음도 떼기 힘들었다. 수영장에서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로 가는 도중에 몇 번이고 주저앉았다. 간식을 챙겨 와서 한입 먹어야만 겨우 조금 걸을 수 있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이 돼서 두어 번, 걷다가 심장이 너무 아파서 가슴을 부여잡고 자리에 무너져 앉았다. 한참 후 통증이 가라앉으면 다시 걸었다.
중학교 3학년 초여름에는 코피가 두 시간 동안 났다. 자주 있는 일이었지만 그날은 학교에 있었고 조퇴해서 이비인후과에 갔다. 마침 2개월 후 아빠의 건강검진이 예약돼 있어서 엄마는 나를 딸려 보냈다. 건강검진 결과 소변검사 수치에 문제가 있었고, 심장이 비대해져 있었다. 대학병원 신장내과에서는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으레 하는 가슴 청진 중에 심장에서 소음이 들렸다. 그날 외래 진료가 없었던 심장내과 선생님이 호출됐다(아직도 그날 진료실로 걸어오던 선생님의 신경질적인 표정을 기억한다). 어머, 그러네. 심장에서 소음이 들리네. 속전속결로 심장초음파 검사를 하고 진단받았다.
친구는 내게 이 이야기를 담담하게 하기까지 얼마나 걸렸냐고 물었다. 나는 망설이다 대답했다. 처음부터, 라고. 내 일이 아닌 것 같지는 않았다. 내 일이었고 많은 것이 바뀌었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것이 아니었다. 없던 병이 병원에서 갑자기 이식된 것도 아니다. 변화는 차츰차츰 일어났고 마음도 차츰차츰 적응했다. 그래서 나는 담담하게 말할 수 있었다. 내가 말해온 것은 사실 병의 진행이 아니라, 병원에서 치료의 진행이었으므로. 몸은 언제나 변하고 있었다. 내가 스스로 더했거나 더해지는 현장을 목격한 것은 병원에서의 일뿐이었다. 담담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아니, 나는 내가 담담한지도 모르고 말했다. 나에게 일어난 일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감정은 섣부른 사치다.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병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신채윤 고2 학생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배현진 “참 어렵게 산다, 장동혁”…징계 중단하잔 말에 SNS 글

이란, 종전 조건 ‘불가침·배상금’ 제시…미국과 평행선
![뒤집힌 ‘보수의 심장’ TK, 민주 29% 국힘 25%…‘절윤’ 결의 무색했다 [NBS] 뒤집힌 ‘보수의 심장’ TK, 민주 29% 국힘 25%…‘절윤’ 결의 무색했다 [NBS]](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2/53_17732979610791_20260312500697.jpg)
뒤집힌 ‘보수의 심장’ TK, 민주 29% 국힘 25%…‘절윤’ 결의 무색했다 [NBS]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1/53_17732246670747_20260311503553.jpg)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

이하상 “특검 안 나온 재판은 불법” 트집…재판장, 17초 만에 “기각”

‘대출 사기’ 민주 양문석 의원직 상실…선거법은 파기환송

법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고발 당해…경찰 ‘1호 수사’

“10분 빨랐다면 100명 살아남았을 것”…이태원 생존자의 애끓는 증언

이 대통령 “제주항공 참사 유해 1년 방치된 경위 철저히 조사하라”

미군 사드가 중동 가면 방공망 뚫리나…‘큰일 나진 않아’

![길 뒤의 길, 글 뒤에 글 [노랑클로버-마지막회]](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3/0212/53_16762087769399_2023020350002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