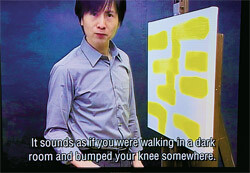초상의 계절이다. 바야흐로 선거철이다. 이제 곧 정치 포스터가 거리의 벽을 가득 채울 것이다. 정치 후보객들은 뿔테 안경을 사고 2:8 가르마를 타거나 1차 세계대전 직후의, 중성적인 코코샤넬풍 정장을 입고서 카메라 앞에 설 것이다. 어떤 표정으로, 얼마나 오래, 어떻게 앉아 있어야 할까. 게다가 무슨 생각을 하며!
폴 세잔은 사과 같은 정물이나 뒷산 풍경이 궁금했지 인물화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잘 알려졌다시피 화가는 식탁 위에 굴러다니는 동그란 사과나 생빅투아르산을 ‘반복’하여 보았다. 그 반복했던 응시만큼이나 수도 없이 대상을 그렸다. 그런 세잔에게도 아내가 있었다. 화가는 몇 점 안 되는 아내의 초상을 남겼다.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아내의 초상인지, 아니면 아내에 관한 한 세상에서 가장 못나게 담아낸 그림인지 모르겠다. 어느 쪽이든 아내는 화가가 그린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별반 보고 싶지 않았을 것 같다.
사랑하는 이의 모습을 꼭 환희에 찬 모습으로 그려야 할까. 그래야만 하는 법은 없다. 하지만 (1888~90)은 좀 심하다. 아무리 초상화에 모델의 개성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세잔 초상화의 특징이라지만 핏기 없는 인물은 둔탁하고 축 늘어졌다. 세잔 아내의 초상을 보면 이 화가가 얼마나 아무것도 궁금하지 않은 표정으로 아내를 마주 보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아내는 무표정하며 화가의 붓질 또한 그러하다. 기쁜지 슬픈지 감각이 없다. 몸매, 얼굴 윤곽은 떡칠을 한 듯 붓질로 뭉툭하게 가려져 있다. 시큰둥한 초상.
화가와 아내 사이에 어떤 이상 전선이 있었는지를 드러내는 수많은 일화가 있다. 아내는 세잔의 예술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세잔 또한 줄곧 떨어져 지낸 아내에게 관심이 없었단다. 속사정이야 둘만이 아는 법이지만, 실제로 아내는 화가가 풍경을 그리려 머문 프로방스 지역을 싫어했고 여름에만 찾아와 남편의 모델이 됐다. 아내 얼굴을 그린 세잔의 다른 그림도 분위기가 싸늘하고 색이 어둡다. 아내의 눈동자는 애매~하다. 화가와 눈을 마주치는 법도, 그림 밖의 관람객에게 눈빛 신호를 보내는 경우도 없다.
세잔이 선호한 것은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곁의 아내가 아니라 차라리 움직이지 않는 사과였다. 세잔은 자기 앞에 앉은 모델에게 이렇게 소리쳤다. “사과처럼 제발 가만히 좀 있어 보게나.” 미술사학자들은 아내의 초상에서 “인물들의 비인간적인 느낌”과 화가가 “인간을 사물과 같이 취급한 결과”(, 전영백)를 읽어낸다. 훗날 아내는 세잔의 버려질 뻔한 그림들을 휴지통에서 구해냈다고도 한다. 누군가의 아내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세잔의 아내 마리 피케는 알고 있었을까. 자신이 이런 표정으로 화면에 그려지고 있었다는 것을.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이재명 대선후보 자격 박탈’ 초스피드 질주한 ‘조희대 사법부’

한동훈 “윤, 계엄 안 했으면 코스피 6천”…민주 “안 놀았으면 만점 논리”
![조희대 대법원, ‘이재명 사건 배당 절차’ 조작 증거 나왔다 [논썰] 조희대 대법원, ‘이재명 사건 배당 절차’ 조작 증거 나왔다 [논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7/53_17728408840037_20260306502691.jpg)
조희대 대법원, ‘이재명 사건 배당 절차’ 조작 증거 나왔다 [논썰]

나경원 “‘오세훈 징계 정지’ 원칙 어긋나…안 좋은 평가, 본인 반성부터”

60살 이상, 집에서 6천보만 잘 걸어도 ‘생명 연장’…좋은 걷기 방법
![‘두번째 기회’는 안희정이 아닌 ‘김지은 동지’에게 [.txt] ‘두번째 기회’는 안희정이 아닌 ‘김지은 동지’에게 [.txt]](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7/53_17728477491692_20260305504002.jpg)
‘두번째 기회’는 안희정이 아닌 ‘김지은 동지’에게 [.txt]

트럼프, 이란 초등학교 175명 폭사에 “이란 소행”…증거는 제시 안해

두바이 재벌, 트럼프 직격 “전쟁에 우릴 끌어들일 권한, 누가 줬냐”

말 바꾼 트럼프 “쿠르드 ‘이란 들어갈 의지'…나는 거절”

인천 빌라촌 쓰레기 봉투서 ‘5만원권 5백장’…주인 오리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