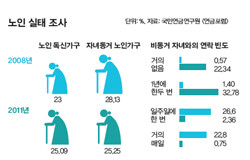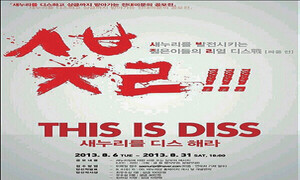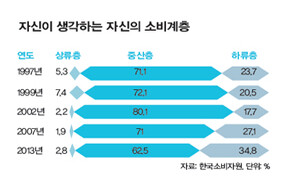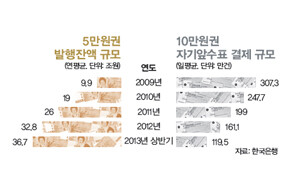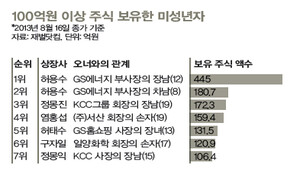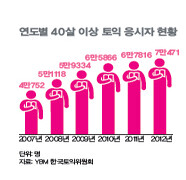트위터에 떠도는 이 신조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떤 곳에 딱 달라붙어 있다. 2. 분명한 힌트를 줘도 알지 못하다. 3. 말귀를 못 알아듣다. 4.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엉덩이가 의자에 끼다.
지난 2월10일 영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 심광진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에서 노조 간부로 활동해 온 일반계약직 공무원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것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 이라며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다. 한겨레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무바라크하는 인권.
지난 2월8일. 인권위가 인권위에 인권위의 인권을 인권위가 침해했다며 진정했다(사진). 인권위 역사상 처음이다. 말장난 같은 진정서 안에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넘쳐나지만, 인권위 안에서도 인권위의 인권을 찾기는 힘들어 보인다. 인권위는 인권위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노조 간부와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진정을 낸 인권위(노조)와는 대화할 수 없다며 침묵에 들어갔다. 노조와 교섭한 적도 없고, 노조 신고도 안 돼 있다는 것이다. 이 침묵의 시나리오는 어디서 많이 본 듯 익숙하다.
재계약을 거부당하고 거리에 나앉은 홍익대 청소노동자들, 산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삼성전자 백혈병 노동자들과 자살한 고 김주현씨, 회사는 이익을 남기는데 경영상의 이유로 거리로 내몰리게 된 한진중공업 노동자들. 시간이 흐르고 그들은 지쳐가지만 상대방은 침묵한다. 침묵의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야 그 실체가 조금 드러났다. 인권위까지 더해지니 침묵의 하모니가 마침표를 찍게 된 것이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홍익), 또 하나의 가족(삼성)으로, 상생협력 문화를 만들어(한진),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인권위). 같은 날 인권위 인권정책과 동료는 인권위의 인권위에 대한 반인권적 처우를 이유로 사표를 던졌다.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보호 업무를 맡아온 그는 사직 이유에 대해 “양심상 자리를 지키기 불편해서”라고 말했다.
무바라크한 예술인 복지법.
봉준호 감독의 와 은 단편영화 에서 왔고, 나홍진 감독의 와 앞에는 단편 가 출발점이다. 이정범 감독의 앞에는 단편 가 있었고, 이경미 감독 의 시작은 단편 이었다. 의 양익준 감독도 원래는 이라는 단편영화의 배우로 유명해졌고, 배우 정유미도 단편 에서 ‘제2의 심은하’로 이름을 알렸다. 김태희는 무명 시절 단편영화 으로 영화제에 얼굴을 알렸다.
“그동안 너무 도움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피하지만,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어서 남는 밥이랑 김치가 있으면 저희 집 문 좀 두들겨주세요.”(고 최고은 작가의 메모)
외상을 준 인근 상점 주인들이 있었고, 밀린 월세를 이해해주는 집주인도 있었다. 메모를 보고 밥과 김치를 싸들고 찾아간 같은 세입자 송씨도 있었다. 하지만 늦었다. “안양에는 사랑의 쌀나누기 운동본부도 있었는데…. 사회복지사가 도왔다면 쌀은 지급받을 수 있었을 텐데….”(아이디 tongtong) 이것도 늦었다. 예술인을 4대보험 가입 대상자로 하는 예술인 복지 법안이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2년 전에 발의됐던 법안, 늦어도 너무 늦었다. 게다가 최선도, 확실한 것도 아니다. 그래도 더 늦어서는 안 된다. 최 작가에게도 그가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한 단편 (2006)가 있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홍준표, 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맞장구…“부동산 돈 증시로 가면 코스피 올라”

일본, 이제 ‘세계 5대 수출국’ 아니다…한국·이탈리아에 밀려나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29억원에 내놔…“ETF 투자가 더 이득”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물로 내놔…부동산 정상화 의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직 사의…사법 3법 추진에 반발

이진숙 “한동훈씨, 대구에 당신 설 자리 없다” 직격

러시아 “돈바스 내놓고 나토 나가”…선 넘는 요구에 우크라전 종전협상 ‘난망’

민주 “응답하라 장동혁”…‘대통령 집 팔면 팔겠다’ 약속 이행 촉구
![왜 부자는 수돗물을 마시고 가난한 사람이 병생수 마실까 [.txt] 왜 부자는 수돗물을 마시고 가난한 사람이 병생수 마실까 [.txt]](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7/53_17721459993113_20260226504293.jpg)
왜 부자는 수돗물을 마시고 가난한 사람이 병생수 마실까 [.txt]

송언석, 천영식 8표차 부결에 “당 의원 일부 표결 참여 못해,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