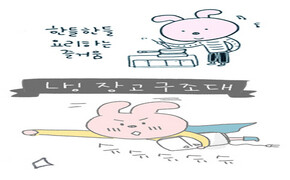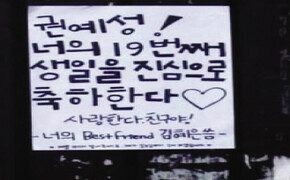식구는 고양이 열여덟 마리. 메이 제공
서울 성북동 메이님네 집엔 고양이 열여덟 마리가 산다. 원래 인간 하나, 고양이 아홉이던 집이었다. 얼마 전, 누군가의 부탁으로 자그마한 암고양이를 업둥이로 들였는데, 녀석이 며칠 만에 새끼 여덟 마리를 낳았다. 메이님이 자주 드나드는 디씨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엔 꼬물꼬물한 아기 고양이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올라왔다. “9:9 맞세이도 가능.”
말은 그래도 턱시도를 잘 차려입은 여덟 마리 아가들은 열두 살부터 한 살 다 되어가는 성묘들인 이 집의 아홉 터줏대감들과 ‘맞세이’ 할 수 있게 되기 전에 꼭 맞는 집사(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은 반려인을 이렇게 부른다)를 찾아 떠날 것이다. 메이님이 지금까지 입양 보낸 고양이는 200여 마리. “PC통신 시절 고양이 동호회 입양란 담당이었어요. 어디서 구조했으니 책임지라는 연락을 많이 받았죠.” 그렇게 데려온 고양이에게 임시로 이름을 붙이고, 씻기고 먹이며 데리고 있다가 적당한 반려자가 나타나면 보냈다.
도자기에 손수 고양이 그림을 그려 파는 메이님은 언젠지 모를 어린 시절부터 개보다 고양이를 좋아했던 ‘골수 고양잇과’ 인간이다. 어릴 땐 어머니의 반대로, 이후엔 여러 사정으로 고양이를 키워보지 못했다. 고양이 키우는 친구네 집에 고양이 동냥 다니는 걸로 갈증을 때우면서, 10년 동안 가족계획을 세웠다. 흰 털이 하나도 없는 깜장 고양이 한 놈, 완전 노란둥이 한 놈, 회색 줄이 죽죽 간 고등어 한 놈, 흰 고양이 한 놈. 좋아도 아닌 척, 자존심을 지키면서 애정표현이 은근한 암놈으로 네 마리. 그러다 녀석들 수명 다하기 전에 비슷한 고양이로 후계자를 들여야지. 일시적으로 최대 여덟 마리까지 같이 사는 거야.
그랬는데. 12년 전, 처음 인연을 맺은 고양이는 흰색에 검정 무늬가 얼룩덜룩 있는 녀석이었다. 언니가 친구네 고깃집에 기를 쓰고 기어들어온 새끼 고양이를 업어온 거였다. “계획대로 안 되면 못 참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틀어졌죠.” 이후 수소문도 하고 모란시장에서 사오기도 하면서 100%의 고양이를 찾았다. 그래도 가족계획은 번번이 틀어졌다. 한번은 출근길, 빌딩들 사이를 걷다가 순간적으로 고양이 소리를 들었다. 귀 밝은 그녀가 듣기에 구조가 필요해 보였다. 44사이즈의 몸을 모로 틀어도 겨우 들어갈 좁은 틈으로 들어가 담장을 뛰어올랐더니 다 큰 젖소 무늬 고양이가 있었다. “알고 보니 눈이 안 보이는 애였어요. 새끼 고양이도 입양이 힘든데, 다 큰데다 눈도 먼 애를 데려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같이 살았어요.” 그런 식으로 한 식구가 된 고양이가 죽거나 잃어버린 녀석 포함 열두 마리다.
“사람이나 고양이나 상성이 맞아야 같이 살 수 있어요. 고양이가 그 집에서 행복해하지 않는으면 다른 집으로 옮겨줘요. 가끔 사람 음식을 탐해서, 가구를 망쳐놔서, 온갖 이유로 같이 못 살고 저한테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 버릇을 다 고쳐서 딱 맞는 사람에게 보내요. 고양이가 제자리를 찾으면 표정도 달라지고 아주 행복해해요. 그 모습이 정말 예뻐요.”
고양이가 죽거나 사람이 죽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니면 같이 못 살, 피치 못할 사정은 없다는 메이님은 지난봄, 같이 사는 고양이들이 동시에 병에 걸려 병구완에 매달렸다. 고생한 보람이 있어 한 녀석만 무지개다리 건너 보내고, 나머지는 다 살려냈다. 그랬는데. 다섯 달 가까이 생업을 팽개쳤던 터라 사료값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메이님이 만든 생활도자기와 가방은 http://yahomay.tistory.com에서 살 수 있다.
김송은 송송책방 주인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이란 새 지도자 모즈타바 첫 연설…“호르무즈 봉쇄, 미군기지 공격 계속해라”

배현진 “참 어렵게 산다, 장동혁”…징계 중단하잔 말에 SNS 글
![관세와 미사일, 양손에 쥐고 과대망상에 빠진 독재자 [아침햇발] 관세와 미사일, 양손에 쥐고 과대망상에 빠진 독재자 [아침햇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2/53_17733006909357_20260312502955.jpg)
관세와 미사일, 양손에 쥐고 과대망상에 빠진 독재자 [아침햇발]

이하상 “특검 안 나온 재판은 불법” 트집…재판장, 17초 만에 “기각”

‘미국 vs 일본 4강전 용납 못 해’…또 대회 중 바뀐 WBC 대진표

오늘부터 휘발유 100원 더 싸게 산다…정유사 출고 최고액 ℓ당 1724원

오세훈, ‘장동혁 2선 후퇴’ 압박 초강수…서울시장 추가 모집 ‘버티기’

이스라엘, 이란 정권 붕괴 기대했지만…“환호가 좌절로”
![손녀와 초등학생 [그림판] 손녀와 초등학생 [그림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312/20260312503676.jpg)
손녀와 초등학생 [그림판]

이란, 종전 조건 ‘불가침·배상금’ 제시…미국과 평행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