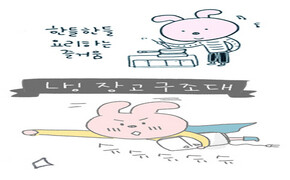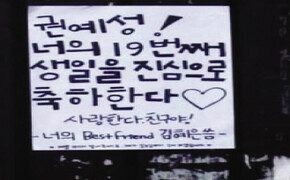‘라이더 웨이트’ 타로의 바보 카드.
서울 홍익대 인근의 살사바 ‘하바나’에는 어스름해질 무렵 ‘기따’씨가 출근한다. 신나게 춤추다 초보자에게 강습도 해주고 문 닫을 때 정리도 같이 하는 그가 직원인 줄 아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단골일 뿐이란다. 실은 사장이 아니냐 조심스레 추측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가끔 바에 앉아 타로 카드를 꺼내들기도 하는데, 그러면 사람이 하나둘 모여들어 “나도, 나도” 하며 각종 문제를 상담한다.
기따씨가 타로를 처음 만진 건 2000년. 섬유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이던 그는, 학교에서 미대생들이 직접 그려서 파는 타로 카드를 보고 그림이 마음에 들어 샀다. 그러다 만화나 영화에서 타로점을 보는 걸 보고 흥미를 느껴 책을 보고 공부하기 시작했다. 타로를 글로 배운 것치고는 적중률이 높아 주기적으로 보는 사람도 꽤 생겼다. 복채는 음료수나 먹을 걸로 받고, 그도 아닐 때는 1천원을 받는다.
기따씨에게 연애운을 물어봤다. “대상이 있나요? 그럼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카드를 10장 뽑으세요.” 뽑아놓은 카드를 ‘켈틱 크로스 배열법’대로 죽 늘어놓고는 한장 한장 읽어준다. 카드마다 고유의 의미가 있고, 또 배열에 따라 유기적으로 의미가 생성된다고. 결론은 상대와 나의 수레바퀴가 맞물릴 때가 되었으니, 곧 만나게 된단다. 아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아무래도 연애와 일이에요. 운명은 정해진 건 아니지만 운의 흐름은 있어요. 그걸 읽어주는 거죠. 시간의 축과 변화의 축이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자기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타로는 점이라기보단 일종의 조언이에요.”
눈치나 감으로 보는 건 아닐까?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 인상이나 분위기를 보고 여러 가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타로 카드를 배열하기 전에 이미 물어본 문제의 흐름이 보이기도 한다고. 그래도 카드 자체에 충실하려고 한다. “타로를 통해 모르는 사람과 쉽게 가까워질 수 있어 좋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 속내를 털어놓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별로 담아두지 않아요. 관계는 관리 안 하는 편이죠. 인연은 수레바퀴처럼 돌다가 맞물리는 때가 또 온다고 생각해요. 일도 마찬가지라, 아등바등하지 않으려고요.”
기따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옷가게를 차렸다. 가게세가 올라 그만두었다.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다 지난해 몇 달 동안 여행을 다녀왔다. 지금은 밥집 차릴 준비를 하고 있다. 어릴 때 목표는 멋진 디자이너가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냥 근심 없이 좋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다. 행복? 별거 아니다. 목마를 때 콜라 한 잔 마시는 거, 오늘은 이걸 해볼까 하는 설렘, 그걸 했을 때의 기쁨, 그런 소소한 것이 연결되는 게 행복이지 뭔가. 춤추는 것도 타로를 보는 것도,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모두 행복의 요건이다.
“예전에 제 타로를 봤는데, ‘바보’(the fool) 카드가 나왔어요. 확률이 반도 안 되고 결과를 몰라도 도전하는 바보요. 그런데 그림은 밝은 이미지예요. 그 다음부턴 제 건 안 봐요.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신나게 몸을 던지는 거죠.”
김송은 송송책방 주인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단독] 이태원 참사 다음날 용산구청장, 대통령 경호처 ‘8100’번과 통화했다 [단독] 이태원 참사 다음날 용산구청장, 대통령 경호처 ‘8100’번과 통화했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3/53_17733793058302_20260313501532.jpg)
[단독] 이태원 참사 다음날 용산구청장, 대통령 경호처 ‘8100’번과 통화했다

트럼프 “이란 완전히 파괴 중…오늘 무슨 일 벌어지는지 보라”

이정현 국힘 공천관리위원장 사퇴…“생각한 방향 추진 어려워”

배현진 “참 어렵게 산다, 장동혁”…징계 중단하잔 말에 SNS 글

다카이치 “독도는 일본 땅, 국제 사회 알려야”…민주 “즉각 중단” 촉구

“아빠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길”…60일된 딸 둔 가장 뇌사 장기기증

미 공중급유기, 이라크 상공서 추락…“적군 공격·오인사격 아냐”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1/53_17732246670747_20260311503553.jpg)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

이하상 “특검 안 나온 재판은 불법” 트집…재판장, 17초 만에 “기각”

“이정현 전화는 꺼져” 장동혁, 오세훈에 “공천은 공정이 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