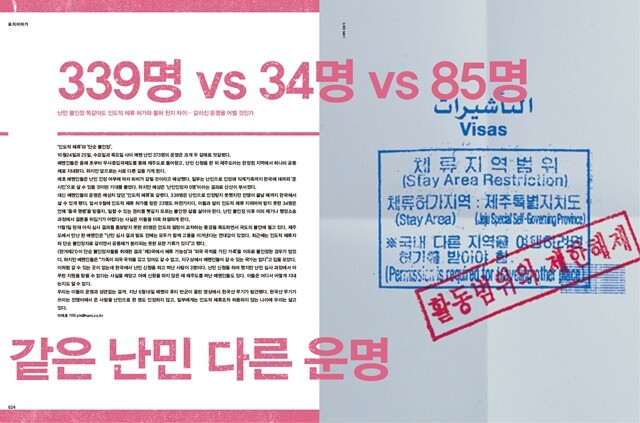
“어디요? 한겨레? 한겨레가 취재 붙고 그러면 일자리 소개 못해주지.”
‘아차!’ 싶었다. 10월29일 월요일 오전, 서울 구로구 대림역 4번 출구 근처 한 직업소개소 사무실. 지야드(27) 등 예멘인 7명이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을 동행 취재하러 따라갔다가 된서리를 맞았다. 사무실엔 20명 가까운 외국인이 있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니 누가 봐도 ‘기자’였다. 직업소개소 사무실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았다. 노트북이 든 백팩을 메고 있었고, 주머니에 꽂혀 삐죽 튀어나온 수첩이 더 도드라져 보였다.
“누구세요?”라고 물어보는데, 나는 천연덕스럽게 명함을 건넸다. 순진했다. 여러 대의 휴대전화로 능수능란하게 전화를 걸고 받던 빨간 입술 아주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기자라고? 빨리 나가. 나가지 않으면 다 쫓아낼 수밖에 없어.” 우리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예멘 난민들의 어리둥절한 표정을 뒤로하고 도망치듯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취재 때문에 예멘인들이 일자리를 못 구하면 안 될 일이었다.
‘왜 나가라고 하지?’ 뒤돌아나오면서도 궁금했다. “오지 마, 나가!”라는 말을 들으면 더욱더 궁금해지는 게 사람 심리다. 외국인들이라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종이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도 일자리는 못 구하고 소개수수료만 떼이는 건 아닐까?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고액의 숙식비를 임금에서 제하지는 않을까? 갖가지 의심이 들었다. 천안과 인천으로 갈라져 떠나는 예멘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지난봄 잠깐 취재했던 이주노동자들이 뇌리를 스쳤다.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를 떠난 게 현명한 선택이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든 건 그때였다. 제주도에선 출입국청 공무원들이 고용주를 불러다가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농·어업과 돼지고기 식당일이 맞지 않았던 예멘인들은 하루빨리 제주도를 떠나고 싶어 했다. 일자리가 너무 제한적이었다. 11월2일 기준으로 제주도를 떠나 체류지 변경 신고를 마친 사람만 69명이다. 미신고자를 포함하면 100명 넘는 예멘인이 인도적 체류 지위를 받고 제주도를 떠났을 것이다. 이들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사기 피해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위험에 놓일 가능성도 커졌다.
인도적 체류 지위를 받은 예멘인들은 제주도를 떠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환영받지 못했다. 경기도에서는 제주도를 떠난 난민들이 경기도로 오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은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인보다 최저임금을 적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나라다.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조건 차별을 금지한 국제협약과 국내법에 위배되지만 막무가내다.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전쟁의 공포를 피해 한국에 온 예멘인들이 열악한 노동환경과 인종차별에 다시 신음하지는 않을까 걱정됐다.

굿즈(goods), ‘뉴스박스’가 탄생했습니다. 유명 브랜드나 아이돌 등 팬덤을 거느린 영역에서 이미지를 활용해 만드는 상품을 굿즈라 한다는데, 팬덤이라면 뒤지지 않는 독자를 위한 ‘저널리즘 굿즈’ 또는 ‘뉴스 굿즈’라고나 할까요. 처음 하는 일이라 우여곡절(원래는 ‘뉴스박스’라는 이름에 걸맞은 포장용 까만 상자를 주문했는데, 까만 상자가 너무 커서 포장재를 바꾸는 일이 ㅠㅠ)도 많았고,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실험적으로 시도했던 뉴스박스는 쪼금 제작했고, 지난 7월 모집했던 독편(독자편집위원회)3.0에 신청하신 200여 분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모든 독자께 전해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동사무소 직원 ‘점 하나’ 실수로 남동생이 남이 되었다

이 대통령 “산골짜기 밭도 20만~30만원”…부동산 타깃 확대

스케이트 날이 휘면 다시 펴서…아픈 누나 곁 엄마에게 메달 안긴 아이

‘800만원 샤넬백’…받은 김건희는 무죄, 전달한 전성배는 왜 유죄일까

“누가 반대했나 밝혀라”…통합안 보류에, TK 의원-지도부 내부 충돌

트럼프 말리는 미 합참의장…“이란 공격하면 긴 전쟁 휘말린다”

‘계엄군 총구’ 안귀령 고발한 전한길·김현태…“탈취 시도” 억지 주장

멀쩡한 치킨 쌓아놓고…‘배민온리’에 처갓집 속타는 사연

이 대통령 “계곡 불법시설 못 본 척한 공무원 엄중 문책하라”
![조용히 다가오는 고지혈증…방치하면 심근경색·뇌졸중 [건강한겨레] 조용히 다가오는 고지혈증…방치하면 심근경색·뇌졸중 [건강한겨레]](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3/53_17718338580049_20260223503016.jpg)
조용히 다가오는 고지혈증…방치하면 심근경색·뇌졸중 [건강한겨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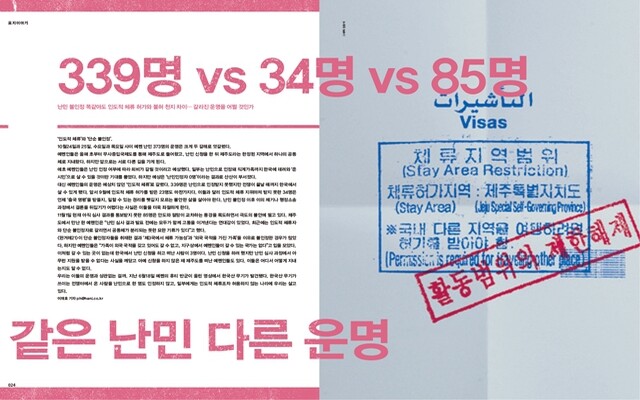















![[속보] ‘공천헌금 1억 수수’ 강선우 체포안 가결 [속보] ‘공천헌금 1억 수수’ 강선우 체포안 가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4/53_17719178646426_2026022450315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