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9년부터 시작된 대공황은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 대륙에 파급된 ‘최초의 진정한 세계사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대공황의 효과는 지역마다 불균등하게 나타났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더 큰 고통을 받았다. 경제학자 조안 로빈슨의 ‘근린궁핍화론’이 바로 그것이다. 그는 대공황을 겪으면서 대부분의 나라가 무역에서 자국은 이익을 얻고 다른 나라에는 손해를 끼치는 보호주의, 경쟁적인 통화 평가절하 등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공황을 둘러싼 경제학적 논쟁은 항상 중심부 국가의 공업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근린궁핍화론은 예외에 속할 뿐이다. 대공황이 세계경제의 주변부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기껏해야 주변부 국가가 대공황기 동안 수입대체를 추구해 이익을 얻었다는 연구가 몇 차례 주목받았을 뿐이다.

이 책은 세계시장의 변방 국가들(인도·라틴아메리카·아프리카·동남아시아)이, 특히 주변부 국가의 농민들이 대공황의 충격에 어떻게 노출됐으며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를 세계사적 시각에서 묘사한다. 당시 저개발국 농민층은 대부업자, 무역상인, 세금징수업자와 연계돼 있었다.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농민은 어쩔 수 없이 (자급생산이 아니라) 시장을 위한 생산(수출)을 해야 했고, 수출 목적으로 재배된 농작물에는 수출세가 징수되었다. 세금징수업자가 오면 농민은 대부업자한테서 돈을 빌려야 했는데 자연히 농민 부채는 끝이 없었다. 이렇게 식민지 농민들이 내는 ‘고통의 황금’(대부업자한테 빌린 부채)은 중심부 국가로 흘러들어가 제국주의 국가의 팽창을 도왔다. 지은이에 따르면, 1930년대 미국 시장에 크게 의존한 일본은 대공황의 충격이 중국보다 훨씬 더 깊고 컸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이 대공황의 도전에 나름의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반면, 식민지 한국은 속수무책으로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초가삼간 태울 건가”…대통령 ‘자제령’에도 강경파는 ‘반발’

이 대통령, 미군 무기 이란전 반출에 “반대의견 내지만 관철 어려워”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50억’ 처분 길 열렸다…법원, 계좌 동결 해제

“김정은 ‘두 국가’ 선언은 생존전략…전쟁 위험 극적으로 줄었다”

트럼프 “전쟁, 며칠 안에 끝날 수도…그들이 가진 모든 것 사라져”

윤석열 “출마하시라 나가서 싸우라”…선고 다음날 ‘내란 재판 변호인’ 독려

‘국힘 당원’ 전한길 “황교안 보선 나왔으니 국힘은 후보 내지 마”

지지율 ‘바닥’·오세훈 ‘반기’…버티던 장동혁 결국 ‘절윤’ 공식화

국제유가 89달러대로 급락…트럼프 ‘종전 발언’과 G7 비축유 영향

‘폐 이식’ 유열 “제 몸 속에 숨쉬는 기증자 폐로 아름다운 노래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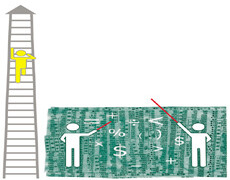
![[이코노북] 역사속 ‘인생역전’을 찾아](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original/2004/0128/021095000120040128494_71_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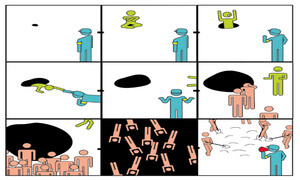
![[이코노북] 반자본주의의 역동적 물결](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original/2004/0109/021095000120040109492_67_3.jpg)
![[이코노북] 내년 경제의 지도](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original/2003/1210/021095000120031210488_79_2.jpg)


![[이코노북] 동아시아의 저력을 믿느냐](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original/2003/1120/021095000120031120485_73_2.jpg)


![[이코노북] ‘취업 전문 교수’의 충고](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original/2003/1009/021095000120031009479_91_2.jpg)
![[이코노북] 금융의 예술, 금융의 하수구](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original/2003/0917/021095000120030917476_69_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