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1월11일 황유원 시인이 한겨레 스튜디오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김진수 선임기자 jsk@hani.co.kr
시인은 “난파당한 기분”으로 인터뷰 장소에 도착했다. 지하철에서 내린 뒤 시인이 탄 400번 버스는 대학가를 지나 나무는 무성하고 인적은 드문 효창공원길을 둘러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 뒤편에 섰다. 버스 안에서 시인은 빛바랜 노란색 ‘난파 음악실’ 간판을 지나쳤고, 새 시집을 냈지만 여전히 해야 할 번역을 육중하게 쌓아두고 길을 나선 때문인지 “난파당한 기분”을 느꼈다고 했다. 그 말을 하는 시인의 목소리가 조금은 경쾌해 예술적이었다. 버스를 내려 직접 맞은 햇볕은 찬란했고, 스마트폰 지도가 알려주는 길은 영화감독들이 종종 상징적으로 쓰는 가파른 내리막이어서 놀랐고, ‘나는 지금 하강하는 건가’ 하며 내려오는 길 한쪽 벽에 ‘하면 된다’라고 휘갈겨 쓰인 글귀에 웃음이 났다고 했다. 다섯 번째 시집 ‘일요일의 예술가’(난다 펴냄)를 펴낸 황유원 시인은 기자에겐 평범한 출근길에서 한 편의 시를 쓰며 2025년 11월11일 한겨레신문사에 도착했다.
‘일요일의 예술가’는 평일에는 세관원으로 일하고 일요일에만 그림을 그리던 프랑스 화가 앙리 루소의 별칭 ‘일요일의 화가’를 시인이 ‘일요일의 예술가’로 (잘못) 기억해서 만들어진 표현이다. “이 표현을 (잘못) 들었을 때부터 언젠가는 이것을 제목으로 시를 써야겠다” 생각했다. 시인은 ‘일요일의 예술가’를 “하나로 규정하고 싶지 않아서” 시집 맨 뒤 작가의 ‘편지’에 여러 유형을 적었다. “월화수목금토를 다 보내고 마침내 한가로이 일요일에 당도한 예술가 같기도 하고 (…) 일주일이라는 굴레에 빠져 앞으로 읽으나 뒤로 읽으나 피차일반인 똑같은 일상에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벗어나려 애쓰”는 예술가일 수도 있고, “그냥 모든 요일과 모든 순간을 일요일처럼 살아버리는 예술가 같기도 하다.”
시인에게 일요일이란? “저는 시를 쓰는 순간이 일요일 같다고 느껴요. 일요일을 별로 누려본 적이 없어서인지, 일요일이라는 말 자체가 좋아요.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똑같은 단어이기도 하고, 제가 반복을 좋아해요. 그리고 (영어로) ‘선데이’잖아요. 태양, 햇볕은 참 좋아요.”
황유원 시인은 요즘 출판계에서 좋은 번역을 하는, 믿고 맡기는 번역가로 바쁘다. 황유원 번역의 ‘모비딕’(문학동네 펴냄)과 ‘어둠의 심장’(휴머니스트 펴냄, 이전에는 ‘암흑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흔히 번역됐다)을 좋아하는 독자가 많다. 사람 사회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글자 사회’인 사전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그에게 번역은 노동이다. “번역은 월화수목금요일에 하는 순수한 노동이죠. 번역을 건축하는 일에 주로 비유하는데 모든 단어를 다 해체해서 다시 다 순서를 맞춰서 붙이고 녹이는…. 건축이라는 말은 너무 우아할까요? 노가다죠.”
그러나 시는 노동이 아니다. 시를 쓰는 시간을 따로 내지 않는다. 산책하다 돌아와 밤비를 만나면 “창이란 창 다/ 열어놓아도 창의 열림이 부족하고/ 열린 창으로 들어오는 빗소리의 볼륨이 부족해” 머리를 창밖으로 내고 시를 쓴다.(밤비) ‘고속도로’를 잘못 쳐 ‘고독도로’가 되면 “한순간에 고독도로 위에 선 한 대의 고독한 차량이 되어” 시를 쓴다.(고독도로에서) 동네 산책하다 만난 장수풍뎅이에게, 성충이 된 뒤 기껏 한두 달밖에 못 산다는 그에게 올해 처음 산 “수박을 꼭 한 번 먹여주고 싶”어 수박을 먹이고 놓아주고 시를 쓴다.(풍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써온 시가 ‘일’이 되는 것이 싫어 시를 전공으로 삼거나, 시로 강의하는 돈벌이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게 써온 30년이 “시가 갑자기 들어온다”는 ‘시내림’ 받은 시인을 만들었다. 일 년째 비어 있는 동네 카페 창에 붙은 네 글자를 보고 “카페는 오늘도 삶 숨쉼, 삶 숨쉼,/ 연중무휴로 입김을 내뿜고 있었다”(연중무휴)고 시를 써낸다.
이번 시집 역시 갑자기 내려왔다. “계속 번역만 하니까, 나한테 선물 같은 걸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난다 출판사에서 시집을 내자 해서, 그동안 썼던 시들을 선별하고 어떻게 구성해서 어떤 시를 넣을지를 짜는 데 20일 정도 걸렸어요.”
2016년 한 달간 머물렀던 남인도 ‘느리티아그람’에서 쓴 시부터 주로 최근 2~3년 동안 쓴 시를 묶었다. 총 3부 57편의 시들은 생의 한가운데서(1부 생은 다른 곳에), 가장 좋아하는 것들로 견디며(2부 My Favorite Things), 어떻게든 연중무휴의 삶을 이어가는(3부 연중무휴) 이들의 마음을 두드린다.
“글 써서 먹고살고 싶었고, 번역은 원래 생각은 안 했던 거지만 비슷한 성격의 일이고, 근데 막상 하니까 프리랜서분들이 다 똑같이 하는 말인데 과다 업무에 시달리고 페이는 상대적으로 적고 가끔 안 좋은 생각 하고…. 그래도 살면서 좋은 게 있긴 하니까 중간중간 빛나는 순간들이 있으니까, 함께 힘냅시다. 그런 의미로 쓴 시예요.” 시인은 이런 마음으로 “대체 왜 사는지도 모르겠을 만큼 바쁘고 어려운 나날 속에서도 무언가를 죽어라 제작하는, 모든 평일을 일요일로 만들고 모든 일상을 예술로 연금해 탄생과 죽음에 저항하는 (…) 이 땅의 모든 ‘일요일의 예술가’들에게” 시집을 바쳤다. 176쪽, 1만3천원.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
■ 21이 찜한 새 책

지구법 강좌
박태현 외 6명 지음, 문학과지성사 펴냄, 2만1천원
2003년 ‘천성산 도롱뇽 소송’은 각하됐다. 비인간 생명체에게도 법인격을 부여하는 ‘지구법’이 있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현실은 이미 이 가정법을 넘어섰다. 이 책은 세계 각국의 지구법 판례와 법리를 살펴보며 법정뿐 아니라 정책 수립과 기업 경영에서 지구법의 실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탐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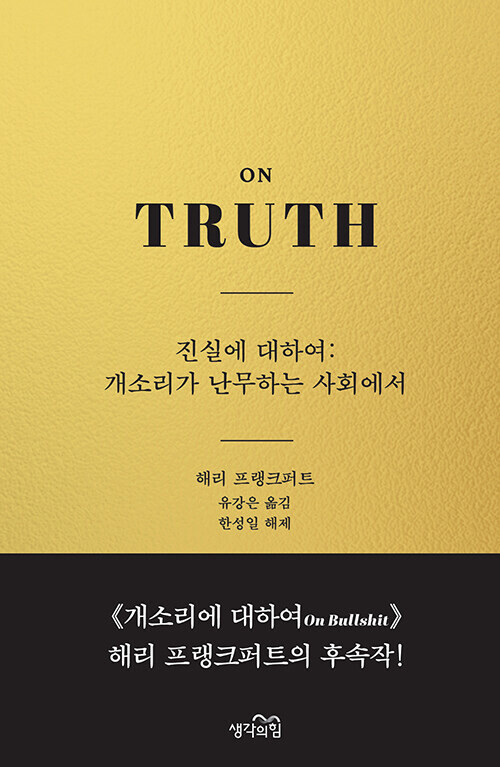
진실에 대하여: 개소리가 난무하는 사회에서
해리 프랭크퍼트 지음, 유강은 옮김, 생각의힘 펴냄, 1만5천원
‘개소리에 대하여’로 세계적인 화제를 모았던 지은이의 후속작이다. 그는 전작에서 개소리의 특징을 ‘진실에 대한 무관심’으로 규정했으나, 이것이 왜 그토록 나쁜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이번 책에선 진실 없이는 인간도 사회도 살아남을 수 없음을 철학적·윤리적·실용적 차원에서 증명해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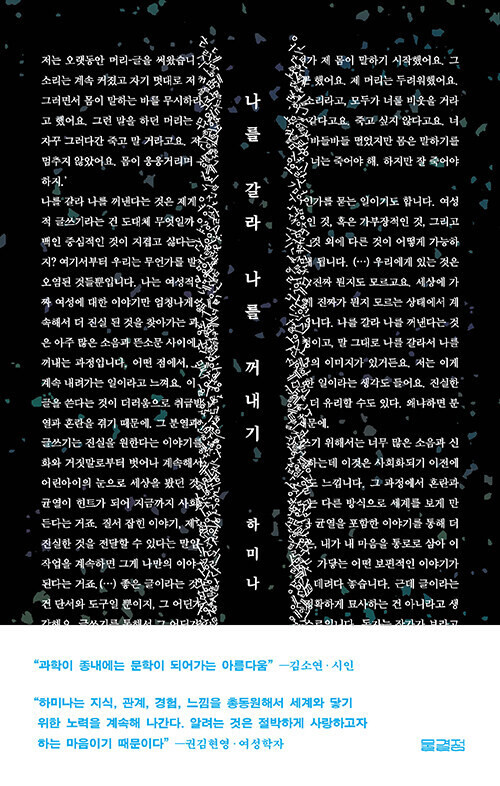
나를 갈라 나를 꺼내기
하미나 지음, 물결점 펴냄, 2만원
하미나는 ‘두 개의 언어’로 과학과 비과학의 경계를 넘는다. 과학철학 연구자로서 익숙했던 ‘이성-과학-머리’의 틀을 깨고 ‘감정-자연-몸’의 말을 함께 써서 차별과 배제가 없는 ‘진실’을 찾아나간다. 1970년대 ‘외계인에게 지구를 소개하는 프로젝트’에서 ‘전쟁, 질병, 가난’을 빼기로 한 결정이 상징하는 ‘어떤 권위’가 지워버린 세계가 아름답고 빼곡하게 담겨 있다.

읽는 여행, 스위스
안인희 지음, 휴머니스트 펴냄, 1만8천원
융프라우와 마터호른 말고 니체, 실러, 바그너, 헤세로 그득한 여행서. 철학자와 예술가들의 ‘결정적 순간’이 담긴 루체른, 루가노 등은 ‘론리 플래닛’이 전하는 그것과 너무나 다르고 충만해 비행기표를 검색하게 한다. 40년 동안 유럽 정신과 문화사를 옮기고 써온 지은이의 다정한 스위스 안내서.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홍준표, 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맞장구…“부동산 돈 증시로 가면 코스피 올라”

일본, 이제 ‘세계 5대 수출국’ 아니다…한국·이탈리아에 밀려나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29억원에 내놔…“ETF 투자가 더 이득”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물로 내놔…부동산 정상화 의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직 사의…사법 3법 추진에 반발

이진숙 “한동훈씨, 대구에 당신 설 자리 없다” 직격

러시아 “돈바스 내놓고 나토 나가”…선 넘는 요구에 우크라전 종전협상 ‘난망’

민주 “응답하라 장동혁”…‘대통령 집 팔면 팔겠다’ 약속 이행 촉구
![왜 부자는 수돗물을 마시고 가난한 사람이 병생수 마실까 [.txt] 왜 부자는 수돗물을 마시고 가난한 사람이 병생수 마실까 [.txt]](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7/53_17721459993113_20260226504293.jpg)
왜 부자는 수돗물을 마시고 가난한 사람이 병생수 마실까 [.txt]

송언석, 천영식 8표차 부결에 “당 의원 일부 표결 참여 못해, 사과”







![마침내 극우에 표 던진, 공장노동자 내 어머니 [21이 추천하는 새 책]](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original/2026/0102/20260102502102.jpg)
![‘인류 죽음의 전문가’가 되짚는 남편의 죽음[21이 추천하는 새 책]](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original/2025/1225/2025122550255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