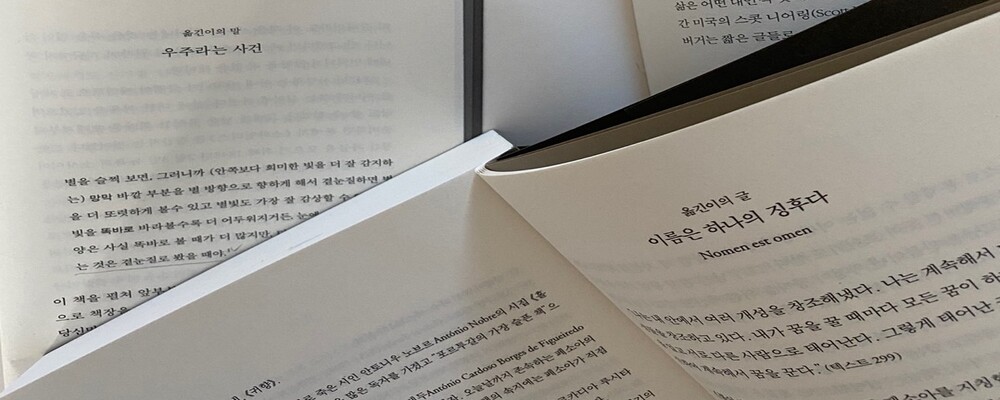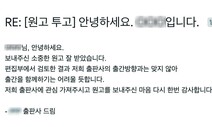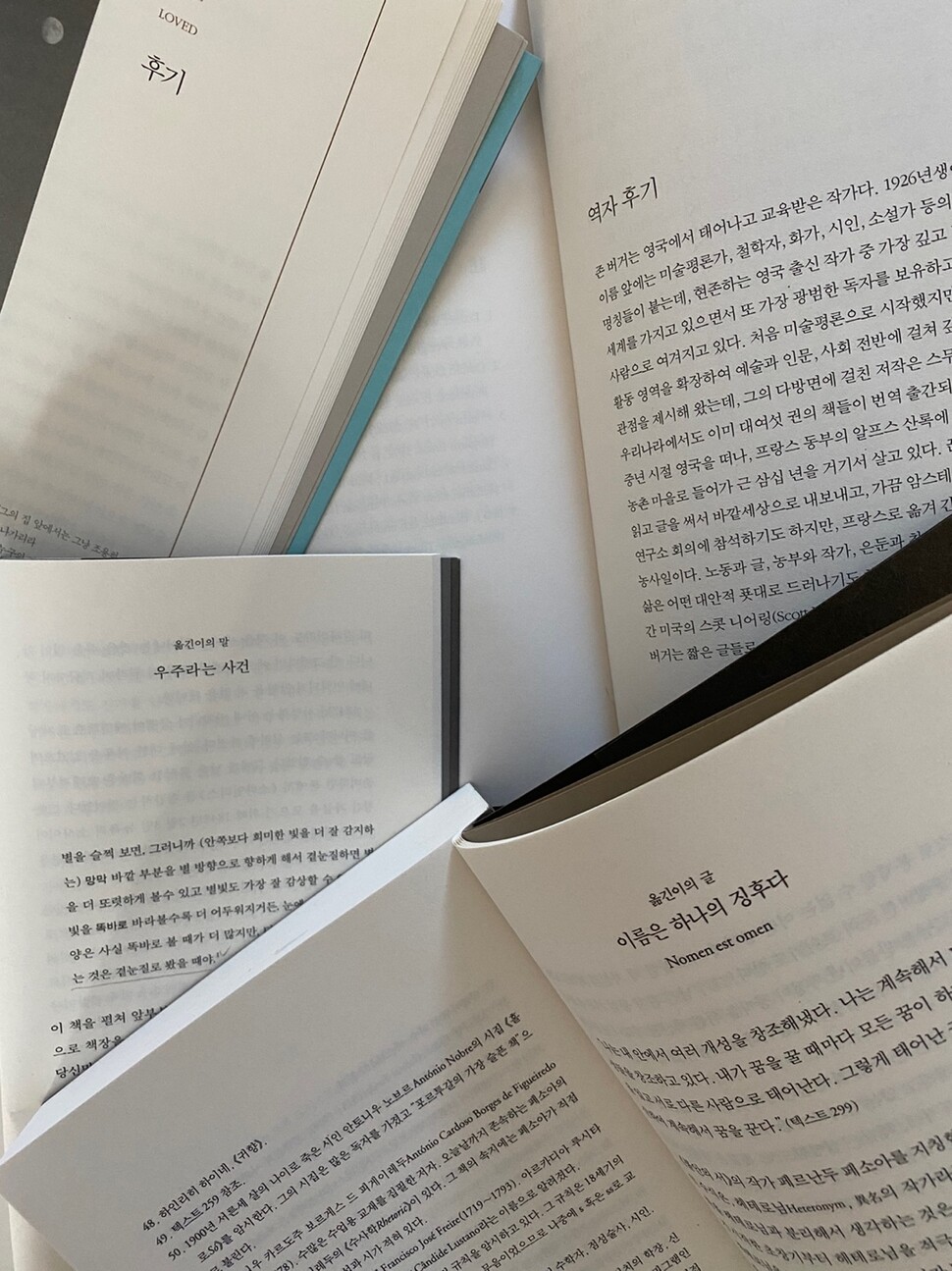
옮긴이의 말은 번역 작품을 최초로 만나고 독자한테 떠나보내는 여행의 기록이다.
대학 시절에 좋은 글을 쓰는 법에 대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 비결은 한마디로 “단문, 단문, 단문”. 그날 강사가 강조했던 그 세 단어는 내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 나는 군더더기 없는 짧은 문장이 좋은 글을 만든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절대적이던 그 ‘미적 기준’이 유학 시절에 완전히 흔들리고 말았다. 한번은 담당 교수님이 내가 제출한 글을 보고 나를 조용히 불러 말씀하셨다. “네 글은 언어의 아름다움을 무시하는 글이야. 음악으로 치면 악보를 죄다 스타카토로 연주하는 꼴이라고.” 박한 평가를 듣고 집에 돌아와 프랑스 문학책을 죄다 꺼내 펼쳐봤다. “장문, 장문, 장문.” 말 그대로 장문의 향연이었다.
단문과 장문 중 무엇이 더 좋은 문장인지를 논하기 위해서 쓰는 글은 아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토록 다른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번역서를 마주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곤란함과 어려움, 바로 그 ‘낯섦’에 대한 이야기다.
프랑스 17~18세기에 귀족들은 궁에 모여 누가 얼마나 더 길고 아름다운 문장을 구사할 수 있는지 대결하는 놀이를 즐겼다고 한다. 음악처럼 흐르는 문장 속에서 헤매며 진짜 의미를 찾는 일, 그것은 말의 여행이나 다름없는 그들만의 유희였을 것이다. 반면 우리 문학은 어떠한가. 간결하고 절제된 글이 남기는 침묵, 우리는 그 고요 안에서 상상을 즐기는 기쁨을 누려왔다. 아름다운 언어의 길을 헤매는 여행, 고요 속에서 자라는 상상. 무엇이 옳고 그르다고 할 수 있겠는가? 다름은 그저 다름으로 아름답다. 낯선 여행이든 자라나는 상상이든, 독서는 우리의 좁은 세계를 조금씩 넓히는 가장 평화로운 방법이다.
그러나 아름답다고 하여 불편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아름다운 길도 자꾸 헤매다보면, 서둘러 빠져나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고 싶은 법. 이국 문학의 낯섦이 발목을 잡는다면, 나는 약간의 편법을 써보길 권하고 싶다. 책의 첫 장에서 과감하게 마지막 장, ‘옮긴이의 말’로 직행하는 것이다. 옮긴이의 말에는 번역된 작품을 최초로 만난(한국어로) 사람의 사연과 작가를 향한 애정, 역자만의 시선이 담겨 있다. 작품과 함께 지낸 시간에 마침표를 찍으며 독자에게 떠나보내는 그 글은 말하자면 배웅의 글이다. 배웅이란 무엇인가, 내가 가진 작은 불빛으로 떠나는 이의 걸음을 비춰주는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정말 필요한 것은 헤매지 않게 도와주는 지도가 아니라, 주위를 밝혀줄 작은 등불이 아닐까 싶다. 나는 아끼는 역자들의 말을 등불 삼아 낯선 세계를 헤맸고, 출구를 찾는 데 실패한 적도 많았지만, 그들의 작은 불빛으로 본 문장의 풍경만큼은 생생히 간직하고 있다.
지금 어려운 책, 아니 어려운 삶을 펼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지도가 아니라 작은 등불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아무도 보지 않는 책의 맨 뒷장, 삶의 제일 끝줄로 달려가보자. 거기, 작은 불빛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글·사진 신유진 번역가
*책의 일: 출판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소개합니다. 직업군별로 4회분 원고를 보냅니다. 3주 간격 연재.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동사무소 직원 ‘점 하나’ 실수로 남동생이 남이 되었다
룰라 ‘새끼손가락 없는 맞춤장갑’ 받고 미소…뭉클한 디테일 의전

트럼프 “관세 수입이 소득세 대체할 것…더 강력한 수단 쓰겠다”

스케이트 날이 휘면 다시 펴서…아픈 누나 곁 엄마에게 메달 안긴 아이

주한미군 사령관, ‘한국에 미-중 전투기 대치 사과’ 전면 부인

“누가 반대했나 밝혀라”…통합안 보류에 국힘 TK 의원-지도부 충돌

이 대통령 “농지매각 명령이 공산당? ‘경자유전’ 이승만도 빨갱이냐”

피해자들은 왜 내 통장에 입금했을까

전한길, 반말로 “오세훈 니 좌파냐?”…윤어게인 콘서트 장소 제공 압박

이 대통령 울컥…고문단 오찬서 “이해찬 대표 여기 계셨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