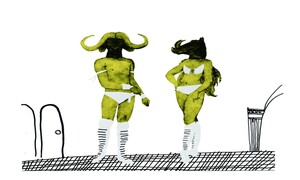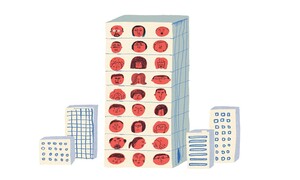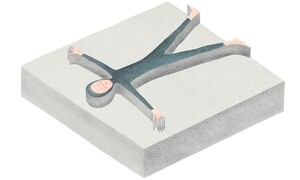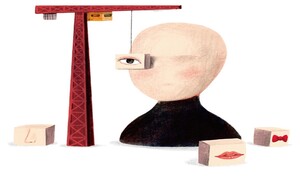일러스트레이션 조승연
‘걸레와 개’가 붙으면 왜 욕이 될까? 온전히 자신을 내놓는 것들엔 왜 비하의 뜻이 들러붙을까?
영화 의 첫 장면은 바닥이다. 물청소 중이다. 격자 타일 위로 거품 이는 구정물이 파도처럼 쓸려온다. 표면에 하늘이 비친다. 그 위로 비행기가 날아간다.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에선 그렇게 바닥이 하늘이다. 이 집 하녀인 클로에가 개똥을 치운다. 빨래하고 밥하고 주인집 아이들을 학교에서 데려온다. “잘 자라 우리 아가, 천사들과 함께 푹 자렴. 사랑해.” 주인집 백인 아이들을 재울 때, 인디오인 그는 미스텍어로 노래한다. “야옹아, 야옹아, 잠 깨.” 아이들 등 위로 손가락 걸음을 걸으며 읊조린다. 말없이, 종종걸음치는 그가 등장하면 새소리를 들을 수 있다.
멕시코의 한 동네 이름인 ‘Roma’는 순서대로 읽으면 제국의 이름과 같고, 거꾸로 읽으면 사랑이다. 제국과 사랑의 대립쌍은 남자/여자, 폭력/생명, 위계/연대로 이어진다. 이 집의 ‘가장’ 안토니오의 얼굴을 잘 알 수 없다. 경적을 울려대며 등장한다. 위압적인 차가 화면을 가득 채운다. 번득이는 헤드라이트 사이엔 ‘왕관’ 마크가 있다. 그가 화를 내면, 화는 위계 사다리를 타고 내려간다. “집안 꼴이 엉망이야. 개똥이 여기저기.” 남편이 짜증 내자 부인 소피아는 클로에에게 버럭 한다. “개똥 치우라고 했잖아!” 이 집 개가 똥을 많이 싸기는 한다. 이 ‘가장’ 안토니오는 바람나 가출한다. 아이가 넷인데 생활비를 안 보내고 다이빙 장비를 사댄다.
클로에의 남자친구 페리오는 계급으로 치면 안토니오와 반대 지점에 서 있다. 이 남자는 빈민가에서 태어났다. 안토니오는 얼굴도 잘 나오지 않지만, 페리오는 알몸으로 등장한다. 발가벗고 봉을 휘두른다. 안토니오는 의사이고, 가진 건 몸뿐인 페리오는 무술 수련 중이다. 그런데 이 둘은 닮았다. 페리오는 영화관에서 클로에가 임신했다고 하자 영화가 끝나기도 전에 줄행랑을 친다. 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이 한참 총을 쏴대는 장면이 나올 무렵이다. 그가 쌓은 ‘무술 수련’ 결과를 두 번 볼 수 있다. 임신한 클로에가 찾아가자 봉을 휘두르며 “미친 하녀”라고 쫓아버릴 때, 독재정권에 맞선 시위 학생들을 쫓을 때다. 그 손에는 총이 들렸고, 클로에의 손은 만삭인 배를 감싸고 있다.
총은 백인 여성도 들었다. 대지주인 그들은 취미로 총을 쏜다. 백인 가족들이 지상에서 연말 파티를 벌일 때 클로에는 지하로 내려간다. 그곳에 그들의 음악이 있다. ‘가장’ 안토니오가 집을 나가기 전 어느 저녁, 가족들이 둘러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사이 클로에가 빈 간식 접시를 치운다. 아이들 곁에 잠시 앉자 주인집 여자 소피아는 클로에에게 시선 한 번 보내지 않고 남편에게 줄 차를 끓여오라고 한다. 소피아는 클로에를 돌봐주지만, 그가 클로에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은 한참 후, 홀로 남겨졌을 때다. 같은 상처를 통과한 뒤에 둘은 수평선에 선다.
바다로, 수영을 못하는 클로에가 한 걸음씩 들어간다. 주인집 아이들을 구하러 그는 더 멀리 나아간다. 파도가 머리까지 삼켰다 뱉는다. 클로에와 아이들이 모래사장에 털썩 주저앉아 서로 껴안자 성화가 완성된다. “클로에가 우리를 구했어요.” 하녀 클로에는 하녀가 아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을 정의했다. 마지막 장면에서 클로에는 옥상으로 향하는 층계를 오른다. 승천한다. 빨랫감을 들고.
중심과 주변, 주체와 타자로 세상을 가르고 그 사이에 위계를 세우는 ‘질서’는 안정적인 폭력인지도 모른다.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묘사한 치졸한 곳은 배제가 없으면 성립할 수 없는 남성중심적인 세계 ‘로마’다. ‘로마’를 뒤집는 클로에가 아이들을 구해 나와 주저앉았을 때는 해 질 녘, 서로 기대 모여 앉은 그 모습이 성스러워 보이는 건 황혼 때문이기도 하다.
“끝은 새로운 시작이듯이 낮과 밤은 순환하고 연결되며 상호 의존하는 것인데도, 가부장제 사유체계는 그것을 대립으로 받아들인다. 낮과 밤의 구분이 모호한 해 질 녘 황혼과 동트는 여명이 아름다운 것은 경계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경계에 선다는 것은 혼란이 아니라 기존의 대립된 시각에서는 만날 수 없는 다른 세계로 이동하는 상상력과 가능성을 뜻한다. 대립은 서로를 소멸시킬 뿐이다.”(정희진, )
얼마나 많이 증오하며 닮아가나. 상대의 우월한 힘을 인정하지 않는 증오는 없다. 약한 상대는 혐오하지, 증오하지 않는다. 그래서 페리오가 안토니오를 닮듯, 강한 적을 이기려고 적의 방식을 ‘복사, 붙이기’한다. 그 밖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뛰쳐나갈 수는 없을까? 은 2016년 서울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을 계기로 뭉친 10개 그룹 페미니스트들의 목소리를 담은 인터뷰집이다. 이들은 목표뿐 아니라 방식도 다르다. “해일이 오는데 조개껍데기나 줍고 있다”는 비아냥을 뒤집어, ‘해일’과 ‘조개껍데기’ 사이 위계가 없는 세계를, 위계가 없는 방식으로 꿈꾼다. 겨드랑이털을 맘껏 자랑해보자고 ‘겨털대회’를 연 ‘불꽃페미액션’의 집행부는 ‘우즈’ 땔감이라고 불린다. 10개 그룹엔 대표도 조직도 없다. 일단 모여 각자 아이디어를 내고 의견을 모은 뒤, 하고 싶은 사람이 한다. 갈등은 수시로 튀어오른다. 굴러갈까 걱정이다. 그런데도 비효율적인 소통의 수고를 효율적인 힘의 질서로 대체하지 않는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정투쟁이 시작되면 막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관계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인정투쟁의 장이 만들어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기로 했어요.”(서랑,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어슐러 르귄의 판타지소설 는 맹숭맹숭하다. ‘알드’ 점령에 맞서는 ‘안술’ 사람들 이야기인데 한바탕 후련한 전투가 없다. 소녀 메메르의 목소리를 빌려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언제나 왜 시인들이 이야기 속에 가사와 요리를 넣지 않는지 의아했다. 모든 위대한 전쟁과 전투는 결국 그걸 위한 게 아닌가? 영웅들은 산에서 도시로 돌아갔을 때 잔치로 환영받았다. 나는 도대체 그 잔치 음식이 무엇이었으며 여자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었는지 알고 싶었다.” 영화 와 소설 는 쓰이지 않은 이야기를 쓴다. 클로에를 보면, 신은 가장 낮은 곳, 걸레와 개똥 속에 있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이 대통령 “다주택 팔라 강요한 적 없어…말 바꿨단 비난 납득 안 돼”

‘포기 대신 도전’ 최가온 “아직도 꿈같아…할머니 밥 먹고 싶어요”
![하루 5분 ‘한 발 서기’로 건강수명이 달라진다 [건강한겨레] 하루 5분 ‘한 발 서기’로 건강수명이 달라진다 [건강한겨레]](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14/53_17710435306389_20260211504219.jpg)
하루 5분 ‘한 발 서기’로 건강수명이 달라진다 [건강한겨레]

내부 결속도 안되는데…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 “다른 세력 손잡아야”

1950년 9월 중앙청에 태극기 게양했던 그 병사, 잠들다

이 대통령 “공직자는 24시간 일하는 것…퇴근이 어디 있나”

“좌파 칼부림 정점…윤 탄핵 뒤 ‘통일교 게이트’ 우려” 내부 문자 드러나

전임자도 “반대”…이성윤 ‘조작기소 대응 특위 위원장’ 임명에 민주당 발칵

놀아야 산다, 나이가 들수록 진심으로

기상 악화에도 “치킨은 간 모양이네요”…이 대통령, 연평도 해병대 격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