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스트레이션 조승연
퇴사 1년째, 괴로운 건 고립감이다. 어디 가도 내 자리가 없는 듯한 느낌이 덮치면, 컴퓨터를 켠다. 드라마는 항상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조선시대 좀비물 6부작을 내리 보며 혼자 중얼거렸다. “좀비들은 낮에 자잖아. 근데 왜 해 질 녘에 나대냐고! 낮에 공격하라고.” 미드(미국 드라마) 시즌 8개를 섭렵하니 좀비가 따로 없다. 그렇게 미드를 몰아보는데 왜 영어는 한 땀도 들리지 않는지 모르겠다.
고립감은 낯설지 않다. 항상 왕따가 될까 두려웠다. 학교 다닐 때, 그 결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학년 첫날 자리 배치가 했다. 주변에 말 걸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1년은 그나마 안전하다. 다른 아이들이 ‘서태지와 아이들’ 춤을 출 때, 혼자 ‘사이먼 앤드 가펑클’의 (I am a rock)을 들으며 “섬은 고통을 느끼지 않지”라고 청승을 떨었다. 대학 때는 술자리만 가면, 나를 중심으로 기가 막히게 두 패로 갈렸다. 남들이 술잔을 돌릴 때, 나는 심판처럼 이쪽저쪽 고개를 돌리다 가방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내밀 손이 없는 것처럼 가만히 있었다.
리베카 솔닛의 수필집 에 나오는 이야기다. 덴마크인 탐험가 페테르 프로이켄은 스무 살에 북극에서 홀로 겨울을 보낸다. 1906년에서 다음해로 넘어가는 겨울, 그린란드 북동쪽 푸스터리비크 빙상 끝에서 그는 혼자였다. 가로 2.7m, 세로 4.5m 크기의 거처는 그대로 감옥이 됐다. 그의 입김이 벽과 천장에 얼어붙었다. 숨을 쉴수록 집은 작아졌다. 자기 숨에 갇혀버린 꼴이 됐다.
내가 만든 내 이야기에 갇혀버리기도 한다. 그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알 수 없다. 아버지의 아버지, 어머니의 어머니에서 시작됐을지도 모를 일이다.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에 살을 붙이며 붙들고 있는 사람은 나라는 거다. 타인에게 손을 내밀 수 없는 ‘외톨이’는 내가 붙든 내 이야기다. ‘운명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만, 그 이야기를 버리지 않는 건 내 선택이다. 분명히 거기서 나도 모르게 취하는 정서적 이득이 있다. 손을 내밀 필요가 없을 만큼 나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는 자아도취이거나, 거절당하는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려는 비겁함일 테다. 이야기엔 감정이 들러붙고, 감정은 이야기를 다진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그것이 자신의 비극일지라도, 그 이야기 때문에 본인이 불행할지라도 계속 이야기한다. 혹은 그 이야기를 멈추는 방법을 모른다. 어쩌면 그것은 편안함보다는 일관성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다.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어느 부분은 죽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것보다 죽음이 먼저 오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의 죽음은 스스로 익숙한 자기 모습의 죽음이기 때문에.”
체 게바라가 젊은 시절 돌봤던 나병 환자들에 대해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 리베카 솔닛은 깨달았다. “자아를 규정하는 것은 고통의 감각이다.” 친구는 환자들의 손과 발이 상하는 까닭은 병 때문이 아니라고 했다. 신경이 짓눌려 아무런 감각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위를 돌보지 않아 잃게 된다는 거다.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부위가 늘어날수록, 자아는 넓어진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동굴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은 감정이입이 연다. “어떤 감정이입은 배워야만 하고, 그다음에 상상해야만 한다. 감정이입은 다른 이의 고통을 감지하고 그것을 본인이 겪었던 고통과 비교해 해석함으로써 조금이나 그들과 함께 아파하는 일이다. 당사자를 당신 안으로 불러들여, 그들의 고통을 당신의 몸이나 가슴, 혹은 머리에 새기고, 마침내 그 고통이 자신의 것인 양 반응한다. 동일시라는 말은 나를 확장해 당신과 연대한다는 의미이며 당신이 누구와 혹은 무엇과 스스로를 동일시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정체성이 구축된다.” 들린다고 다 말인가. 공짜가 없다. 자기 목소리를 죽여야 남의 말이 들린다. 소리가 말이 되려면 타인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리베카 솔닛은 독재정권에 맞선 버마 승려들과 연대하며 수천㎞ 떨어져서도, 그 붉은 승복이 붉은 실로, 자기에게 연결된 느낌을 받는다.
같은 책에 블루스 음악가 찰리 머슬화이트의 금주 사연이 나온다. 알코올중독자였던 그는 1987년 한 라디오 방송을 듣다 술을 끊었다. 막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우물에 빠진 날이다. 그 구조 작전이 실시간으로 전파를 탔다. 머슬화이트는 “왜 나는 이 아이 반만큼도 용기가 없는 걸까. 아이가 구출될 때까지는 술을 한 방울도 먹지 않겠어”라고 다짐했다. “말하자면 내가 그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기도 같은 것이었다.” 그날 아이뿐만 아니라 머슬화이트도 구조됐다.
허5파6의 웹툰 속 주인공 미래는 16살 왕따다. 아버지가 집에 오는 날이면 옷장에 숨는다. 어쩌다 걸리면 맞는다. 학교 소풍 전날엔 비 오기를 빈다. 이 웹툰은 미래가 자신의 고통을 재료 삼아,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나 같은 건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라는 네버엔딩 스토리를 깨고 나오는 이야기다. “나 지금 엄청 어려운 스테이지를 깨고 온 느낌이야.” 미래는 어느 날, 반 친구 유진에게 한 이벤트에 낼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한다. 손톱을 물어뜯으며, 덜덜 떨며 말했다. 그렇게 친구가 돼 유진의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댄다. “보잘것없는 경계심으로 운명을 짚어보려 했던 것이, 오히려 인간 능력 밖의 오만한 가늠이었는지 모른다. 자기가 아픈 것만 생각하지. 처음부터 진실하게 다가갔다면 우리 사이가 어땠을까. 오히려 애들한테 선을 긋고 계급을 나눈 건 나였던 거야.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해준 사람들.” 마흔이 넘은 나는 16살 미래만큼 용감한 적이 없었다.
“안녕”이라고 말하는 게 왜 이리 어려울까. 노력해보지 않은 건 아니다. 내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실패더미들로 ‘나는 왕따잖아’라는 이야기에 물을 대주거나, ‘나는 나가려고 하잖아’라고 부추기거나. 리베카 솔닛은 이렇게 썼다. “가끔은 나쁜 소식이 우리를 진실한 삶의 길로 이끌어주기도 한다. 난폭하게만 보였던 손님에게 나중에 감사하게 되는 경우라고나 할까. 사람들은 대부분 꼭 변해야 할 때가 아니면 변하지 않게 마련이고, 위기가 변화를 강요하기도 한다.” 아직도 배가 덜 고픈 걸까? 좀비로 제 살을 뜯어먹으며 살래? 컴퓨터를 켜는 거 보니, 더 불행해야 바뀔 모양이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공천헌금 1억’ 혐의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스케이트 날이 휘면 다시 펴서…아픈 누나 곁 엄마에게 메달 안긴 아이

이 대통령 “다주택 자유지만 위험 못 피해…정부에 맞서지 마라”

쌓여가는 닭고기, 못 받는 쿠팡 주문...‘배민온리’에 갇힌 처갓집 점주들

트럼프, ‘공유사무실 쓰는 5인 원전 기업’에 일본 투자금 36조원 퍼주나

“집주인들 잔뜩 겁 먹었다”…서울 곳곳서 호가 낮춘 매물 쏟아져

‘어디서 3·1절을 팔아?’…전한길 콘서트, 허위 신청으로 대관 취소

‘계엄군 총구’ 안귀령 고발한 전한길·김현태…“탈취 시도” 억지 주장

몸에 피 한방울 없는 주검이 되어 돌아온 새 신랑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6년…김건희에 통일교 금품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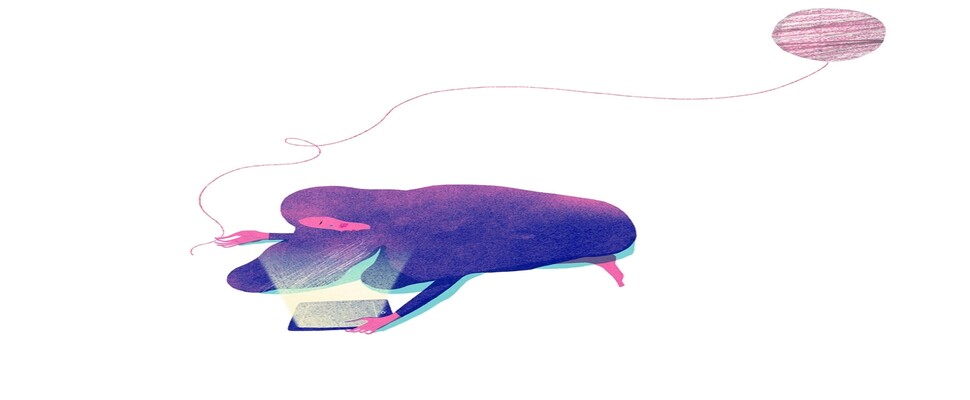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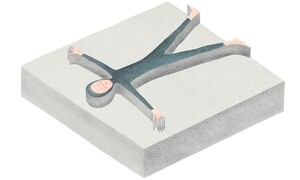









![[속보] ‘공천헌금 1억 수수’ 강선우 체포안 가결 [속보] ‘공천헌금 1억 수수’ 강선우 체포안 가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4/53_17719178646426_2026022450315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