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최대 일렉트로닉댄스뮤직 축제 ‘울트라 코리아 2018’ 현장. 울트라 코리아 제공
클럽 문화에 익숙지 않다. 모두가 디제이 쪽을 보며 같은 방향으로 서서 춤추는 것도 어색하고, 의자가 없는 것도 불편하다. 모름지기 춤출 땐 일행끼리 서로 마주 봐야 하고, 블루스 타임 땐 폭신한 소파로 돌아와 쉬어줘야 하는 ‘나이트클럽’ 세대에게 요새 클럽은 영 편치 않다. 오히려 1990년대 초·중반 유행했던 록카페처럼 술집 테이블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 춤추고 노는 곳이 더 편하고 즐겁다. 90년대 가요를 틀어주는 ‘밤과 음악 사이’나 흑인음악을 틀어주는 서울 이태원 ‘솔트레인’ 같은 곳이 나는 좋다.
국내 최대 일렉트로닉댄스뮤직(EDM) 축제 ‘울트라 코리아 2018’ 취재 신청을 할 때 이전과 다른 기분이 든 건 그래서였을 것이다. 록 페스티벌이나 재즈 페스티벌 같은 다른 음악 축제 취재를 신청할 때와는 마음가짐부터 달랐다. 음악 기자로서가 아니라 극한체험에 나서는 기자의 심경이랄까. ‘서정민의 뮤직박스’가 아니라, 얼마 전 연재를 시작한 ‘이재호의 끝까지 간다’ 꼭지의 대타로 뛰는 것만 같았다. 다행히 지원군이 나타났다. 이태원 클럽에서 ‘불금’ 보내기를 밥 먹듯 하는 큐(Q)와 에이(A)가 동행하기로 했다.
페스티벌 둘쨋날인 6월9일 오후,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 앞에서 큐와 에이를 만나기로 했다. 종합운동장 일대는 야구장을 찾은 사람들과 울트라 코리아에 온 사람들로 북적댔다. 옷차림으로 목적지를 가늠할 수 있었다. 야구 유니폼이나 헐렁하고 편안한 차림의 사람들은 야구장으로, 화려하고 때론 과감한 노출을 한 사람들은 울트라 코리아 입구로 향하는 듯 보였다. 큐와 에이를 만났다. 전날도 이태원에서 밤을 불태웠다는 그들은 동남아 휴양지의 어느 클럽에 온 듯한 차림을 하고 있었다. 얼굴에는 별이나 하트 같은 야광 스티커를 붙였다. 큐는 내 왼쪽 눈 밑에도 스티커를 붙여주었다. 작은 별 3개를 달았을 뿐인데 괜히 자신감이 +1 상승했다.
안으로 들어가니 별천지였다. 환한 대낮인데도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은 한밤의 클럽 같았다. 여기저기 마련된 작은 무대에서 디제이가 틀어대는 음악에 사람들은 자유롭게 몸을 흔들었다. 주경기장 바깥에 늘어선 부스에선 맥주며 치킨이며 먹을거리를 팔고 있었다. 페스티벌에선 역시 알코올 기운을 빌려야 한다. 목부터 축이기로 했다. 시원한 생맥주를 두 잔 연속 들이켜니 기분이 살짝 떠올랐다. 인증사진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니 나도 최신 트렌드에 올라탄 ‘파티 피플’이 된 것 같았다.
아는 동생이 보드카 홍보 라운지 운영을 맡았다. 그를 만나러 그곳으로 갔다. 라운지는 가장 높은 곳에 있었다. 메인 무대가 있는 주경기장 잔디밭이 한눈에 내려다보였다. 드넓은 광장에서 높이는 권력이다. 입장료를 많이 낸 사람들은 VVIP 라운지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술을 마신다. 우리들은 기업체가 돈을 지불하고 입점한 홍보 라운지에서 그 기분을 누린다. 호사는 잠깐으로 충분했다. 사람들을 보고 있으니 그 안으로 섞여 들어가고 싶어졌다.
보드카 라운지에서 내려오니 빗방울이 흩뿌리기 시작했다. 록 페스티벌에서 비를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비를 맞다보면 모든 걸 내려놓고 축제에 완전히 빠져드는 순간이 온다. EDM 페스티벌도 다르지 않았다. 비를 맞으니 분위기에 더 취했다. 맥주와 보드카가 혈관을 타고 돌았다. 갑자기 눈앞에 헛것이 보였다. 이건 영화 속 장면이잖아! 의 두 주인공 범블비와 옵티머스 프라임이 눈앞에 있었다. 헛것이 아니었다. 누군지는 몰라도 파티 의상으로 입고 온 것이었다. 우리는 웃으며 다가가서 사진 찍기를 청했다. 그들은 기분 좋게 응해줬다. 그러려고 이 옷을 입고 왔을지도 모른다. 문득 그 둘이 자동차로 변신해 질주하는 상상을 했다.
큐와 에이는 자꾸만 디제이가 있는 무대를 향해 돌진했다. 사람들의 숲을 헤치며 앞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나도 덩달아 따라갔다. 이번엔 영화 가 떠올랐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 오마하 해변을 향해 돌진하는 병사가 된 기분이었다. 빗발치는 총탄 대신 빗방울이 떨어졌다. 빗방울은 위험하기는커녕 보석처럼 아름다웠다. 어느 순간 큐와 에이는 전진을 멈추고 춤을 추기 시작했다. 나도 덩달아 몸을 흐느적거렸다. 에이는 보드카 라운지에서 얻어온 머리띠를 내 머리에 묶어주었다. 머리띠에선 형형색색 불빛이 반짝였다. 이번엔 영화 속 머리에 꽃을 꽂은 여일(강혜정)이 된 기분이다. 여일처럼 헤헤거리며 팔다리를 흔들어댔다.
이런! 맥주를 너무 많이 마셨다. 방광이 차올랐다. 그건 큐와 에이도 마찬가지였다. 빽빽한 인파를 헤치며 빠져나왔다. 작전이 재개됐다. 시원하게 비워내고 나니 라이언 일병이라도 구한 것처럼 기뻤다. 이제 다시 돌아가볼까? 어라! 근데 이건? 익숙한 선율이 화장실로 흘러들었다. 체인스모커스의 . 미국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 12주 연속 정상을 지킨 곡, 한국에서도 길거리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던 바로 그 곡이다. 미친 듯이 달려나갔다. 무대는 멀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휴대전화를 꺼내들어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눌렀다. 보통은 렌즈가 무대를 향해야 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꽃을 쓴 내 얼굴을 셀카로 찍었다. 얼굴 뒤로 멀리 무대가 보이고 의 바로 그 선율이 흘렀다. 내 얼굴과 카메라는 리듬을 타고 흔들댔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짓이었다.
체인스모커스 무대를 마지막으로 이날 축제는 막을 내렸다. 그냥 갈 수 없었다. ‘애프터 파티’의 시작이다. 남들은 근처 핫한 클럽으로 가서 남은 밤을 불태운다지만, 우린 방이동 ‘재즈 잇 업’으로 향했다. 재즈를 비롯해 다양한 신청곡을 틀어주는 단골 음악바다. 코코넛 향이 나는 테킬라를 들이켜는데,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는 노래가 흘러나왔다. “언제나 꿈꿔온 순간이 여기 지금 내게 시작되고 있어~.” 듀스의 .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는 벌떡 일어서서 몸을 흔들었다. 90년대 록카페로 순간이동한 것 같았다. 역시 나는 이게 체질인가?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래도 내년에 또 울트라 코리아에 갈 것 같다. 내년에는 또 어떤 별세상이 펼쳐질까? 벌써부터 두근댄다. 아니, 당장 다른 EDM 페스티벌이라도 찾아볼까? 메르세데스벤츠 스타디움 2018(7월7~8일), 월드클럽돔 코리아 2018(9월14~16일), 월드디제이 페스티벌(내년 상반기)…. 세상은 넓고 즐길 축제는 많구나.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이 대통령,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에 박홍근·해수부 황종우 지명

‘윤석열 훈장 거부’ 전직 교사, 이 대통령 훈장 받고 “고맙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 6주 만에 내린 57.1%…“서울과 영남권서 하락” [리얼미터] 이 대통령 지지율 6주 만에 내린 57.1%…“서울과 영남권서 하락” [리얼미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2/53_17724082363583_20260302500278.jpg)
이 대통령 지지율 6주 만에 내린 57.1%…“서울과 영남권서 하락” [리얼미터]

유럽도 ‘이란 겨냥’ 항모 등 전진 배치…중동 기지 공격 받자 대응

미군 사령부 ‘명중’ 시킨 이란…미 방공미사일 고갈 가능성 촉각

‘이란 공습’에 장동혁 “김정은의 미래” 박지원 “철렁해도 자신감”

‘차관급’ 황해도지사에 배우 명계남 임명

나이 들어도 잘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이란 호르무즈 봉쇄 ‘유가 빨간불’…OPEC+ 증산효과 ‘글쎄’

민주, ‘6·3 지선’ 서울·경기·울산 경선 확정…부산은 추가 공모

![<span>[뮤직박스] 다시 불러보는 “그대 고운 내 사랑~”</span>](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612/53_15919406315765_4215919406200643.jpg)
![<span>[뮤직박스] 지금이 어쩌면 ‘화양연화’</span>](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508/53_15889189060769_211588918890229.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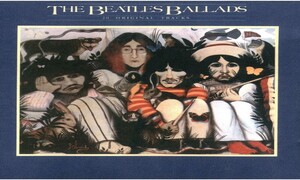




![[단독]장동혁은 어떻게 단톡방에 포획되었나…1020명 참여 7개월 단톡방 메시지 24만건 분석해보니 [단독]장동혁은 어떻게 단톡방에 포획되었나…1020명 참여 7개월 단톡방 메시지 24만건 분석해보니](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7/53_17722031912989_202602275014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