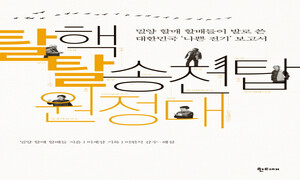1
익숙한 일상, 세계에 대한 친밀감, 내일도 오늘처럼 흘러가리라는 기대는 환상이다. 서로를 알면 알수록 거리가 생기고 “우리는 모든 타인과 나란한 보편”이라는 메를로 퐁티의 말처럼 때론 자기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진다. 이방인의 삶에 대한 묘사는 더 이상 여행자, 국외자 등 이방인에 대한 것만은 아니다. 주로 근대를 둘러싼 현상학의 논의에 기댄 책은 우리는 모두 이방인이라는 지위를 획득했으며 자신이 몸담고 있는 세계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숙려하는 상태에 돌입했다고 정리한다.
게오르크 지멜의 말대로라면 이방인은 “방랑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오늘 왔다가 내일도 머물겠지만 오가는 자유의 유혹을 여전히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잠재적 방랑자”다. 태어나서 가족 울타리에서 자라오던 개인들은 생의 어느 시기에 문득 이방인의 시기를 경험할지도 모른다. 일시적이거나 성장이라고 믿으면서. 그러나 사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추상화된 사회에 진입해야 하는 현대인들은, 언제나 누구나 잠재적인 디아스포라다. 책에서는 가족을 외국으로 떠나보낸 ‘기러기 아빠’의 예를 든다. 가족의 대면적 상호작용이 붕괴된 자리에서 가족을 지키는 그는, 여기 이 나라에 있지만 가족으로부터 이방인이 돼버렸다. 아무 곳으로도 떠나지 않아도 가족이 낯설고 자신이 낯설어지는 경험을 하도록 떠밀린다. 이방인이 되는 경험을 하면 다른 눈으로 또 다른 세계를 보게 되며 결국 세계와 자기 자신이 어떤 외양을 하고 있든 보잘것없을 뿐이라는 자각을 안게 된다.
중세인들은 이방인을 ‘괴물’로 취급하며 두려워했다. 근대에 속한 우리 대부분은 주변인으로서의 소외와 자유를 지닌 이방인이 되고 싶기도 하고 될까봐 두려워하기도 한다. 익숙한 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자연적 태도, 일상적 사고, 전형적이고 익명적인 태도, 습관적인 행위들은 우리에게 확신과 안정감을 부여하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싼 무의식적 관습에 대해 판단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살아간다. 책은 영화 에 나오는 주민들이 이방인을 능멸하고 괴롭힌 것은 공동체를 지금처럼 일상적이고 관습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사의 노력이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너는 우리 사회에서 불리는 그 무엇이다. 더 이상 고민할 것 없다’는 사회적 정체성(버거)”에 기대어 사는 것은 마냥 가능하지 않다. 언젠가 주민들도 마을을 떠나야 할 운명이다.
이방인의 위기를 논한 알프레드 슈츠와 지멜의 논의로부터 출발하는 책은 사회학이긴 하지만 철학 에세이처럼 읽힌다. “이방인들은 자연적 태도에 대해 괄호를 치면서 끊임없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때문이다. (…) 그 뒤엔 신경이 곤두서고 모든 것이 혼란에 휩싸이며 종내는 수수께끼가 되어버린다. 이런 상태는 피곤과 직결된다. (…) 바로 이것이 낯선 곳을 여행하는 나그네가 밤이면 단박에 곯아떨어지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이다.” 책은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겪는 공통적인 의식 상태에 대한 묘사이기도 하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조희대, 사법개혁 3법 또 ‘반대’…“개헌 해당될 중대한 내용”

‘남국불패’...김남국, 인사청탁 사퇴 두 달 만에 민주당 대변인 임명

“서울마저” “부산만은”…민주 우세 속, 격전지 탈환이냐 사수냐

‘헌법 불합치’ 국민투표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개헌 투표 가능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220/20260220502864.jpg)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
![[사설] 중국 도발한 주한미군 훈련, ‘단순 항의’로 끝낼 일 아니다 [사설] 중국 도발한 주한미군 훈련, ‘단순 항의’로 끝낼 일 아니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2/53_17717529577243_20260222502024.jpg)
[사설] 중국 도발한 주한미군 훈련, ‘단순 항의’로 끝낼 일 아니다

노시환, 한화와 최대 ‘11년 307억원’ 계약
![이러다 정말 다 죽어요! [그림판] 이러다 정말 다 죽어요! [그림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2/53_17717564410097_20260222502174.jpg)
이러다 정말 다 죽어요! [그림판]
![[사설] ‘무기징역’ 빼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윤석열 1심 판결 [사설] ‘무기징역’ 빼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윤석열 1심 판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2/53_17717557735175_20260222502090.jpg)
[사설] ‘무기징역’ 빼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윤석열 1심 판결

태진아 이어 이재용 ‘윤어게인 콘서트’ 퇴짜…전한길 “이재명 눈치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