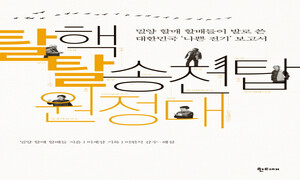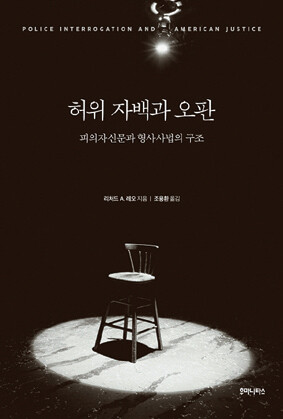
“내가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도 돌이킬 수 없는 말이다. 과학수사대(CSI)의 나라인 줄 알았던 미국조차 자백은 DNA 수사 같은 방법을 압도한다. 2000년부터 2007년 5월까지 미국에서 잘못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나중에 DNA 증거로 혐의를 벗어난 사람은 200명. 그중 31명이 허위 자백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았다.
허위 자백은 형사사건에서 가장 쉽고 또 설득력이 높은 증거다. 책 (조용환 옮김·후마니타스 펴냄)은 수사 과정에서 일단 허위 자백을 하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확률이 78~85%라고 한다. 미국 판례에서 오판으로 밝혀진 사례 중 허위 자백 때문에 유죄를 선고한 비율은 60%에 이른다는 연구도 있다.
짓지도 않은 죄를 왜 지었다고 할까. 책은 피의자 신문 과정에 그 비밀이 감춰져 있다고 본다. 수사관들에게 일단 의심을 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탈출구가 없다고 느낀다. 고문과 폭력이 용인되던 시절은 말할 것 없고, 지금도 피의자는 구금 상태에서 심리적 압박과 협박을 받으며 처벌당하는 듯한 경험을 견뎌야 한다. 1993년 미국 일리노이주에 사는 게리 고저라는 마흔 살 남성은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고저는 피의자 신문 10시간을 넘기자 기진맥진해졌고 급기야 자신이 기억상실 상태에서 부모를 죽인 것이 틀림없다고 믿게 되었다. 자신의 어리숙한 변명보다는 수사관들의 빈틈없는 상황 논리가 훨씬 그럴듯했기 때문이다.
“경찰이 유도하고 경찰이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허위 자백이 시작되는 과정도 알고 보면 엉성하기 짝이 없다. 한 연구에선 수사관을 비롯해 거짓말을 탐지하는 직업 종사자들은 45~60%의 정확도를 보인다고 하는데, 훈련받은 수사관들 대부분은 피의자의 몸짓이나 인상, 일관되지 못한 답변만으로도 범인을 가려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자신이 ‘인간 거짓말탐지기’라고 믿는 사람들 앞에서 시선을 피하거나 코를 만지거나 자꾸 뒤통수를 긁다가는 피의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거짓말과 참말을 알려주는 신호 따윈 존재하지 않고, 흔한 편견과 예단만이 있을 뿐이다. 책은 “자백은 인간의 증언과 지각, 오류 가능성에 근거해 유죄를 추정한 상태에서 압력, 조종, 기만 그리고 때때로 강제력까지도 행사해서 나오는 산물이기 때문에 가장 믿을 수 없는 형태의 증거”라는 형사법의 원칙을 다시 일깨운다.
한국어판 서문에서 지은이는 “한국 경찰은 10일 동안 피의자를 구금·신문할 수 있으며 여기에 검사가 그를 다시 20일 동안 구금·신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최근 미국에선 모든 신문 과정을 의무적으로 전자 녹화하는 법을 제정한 주가 크게 늘었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이정현 “조용히 살겠다…내 사퇴로 갈등 바라지 않아”

오세훈 미등록, 이정현 사퇴…난맥상 국힘, 장동혁 대표 선택은

다카이치 “독도는 일본 땅, 국제 사회 알려야”…민주 “즉각 중단” 촉구

홍익표 정무수석 “여당이면 여당답게 일 처리 했으면”

“이정현 전화는 꺼져” 장동혁, 오세훈에 “공천은 공정이 생명”

배현진 “참 어렵게 산다, 장동혁”…징계 중단하잔 말에 SNS 글

미 “모즈타바 외모 훼손됐을 것…다음주 이란 매우 강하게 타격”

한동훈 “날 발탁한 건 윤석열 아닌 대한민국”…‘배신자론’ 일축

이란전 안 풀리자…백악관 “가짜 뉴스 CNN” “망해가는 NYT” 비난

말기 암 치료 중단 이후…내 ‘마지막 주치의’는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