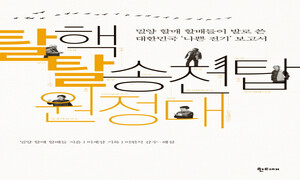대중 혹은 군중은 ‘복잡계’에 산다. 그곳은 완벽한 질서와 극한의 혼돈 사이에 있다. 대중이란 존재는, 사는 곳의 특성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부르는 이름이 숱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들은 국민이자 시민, 납세자이자 유권자다. 인민이자 민중이며, 주권의 담지자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존재, 곧 ‘다중’이기도 하다.
‘대중’은 언제 태어났을까? 고대 그리스의 대중은 힘을 가진 우매한 존재, ‘철인정치’의 대상물인 ‘폭민’에 불과했다. 유대 민족의 ‘구세주’로 여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단 것도 유대의 대중이었다. 태초에도, 대중이 있었다.
격동의 18세기, 유럽을 뒤흔든 것은 ‘혁명적 대중’이었다. 그들은 귀족과 고위 성직자, 군주와 철학자 따위 ‘지엄한 존재’에 길들여지는 ‘떼거리’이기를 거부했다. 수동적인 ‘타자’가 아닌, 자기 삶의 주인임을 깨달은 게다. ‘근대’는 그들이 만들어낸 시대다. 군중심리학의 원조 격인 프랑스 사회학자 귀스타브 르봉은, 이 무렵 조금은 겁에 질린 채 이렇게 썼다.
“조직된 군중은 인민의 삶에서 늘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 역할이 지금처럼 중요한 적은 없었다. …우리의 모든 고대의 믿음이 휘청거리며 사라지고 사회의 오랜 기둥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는 동안, 군중의 힘은 무엇으로부터도 위협받지 않고 그 위세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유일한 힘이다.”
파시즘의 광기가 만들어낸 자양분은 ‘맹목적 대중’이었지만, 그 광기를 끝장낸 것도 ‘각성된 대중’이었다. 둘은 같으면서 다른 존재다. 무차별적 증오심으로 똘똘 뭉친 ‘일베’, 그리고 공유와 소통에 기반한 ‘집단지성’이 사이버 세계에 공존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시대와 개인의 상호작용이, 대중의 ‘자성’을 바꾼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인문학연구소가 엮은 (그린비 펴냄)은 시대라는 씨줄과 문화라는 날줄로 엮어낸 ‘대중의 사회문화사’로 부를 만하다. 연구소가 2000년 시작한 ‘대중 프로젝트’를 묶어낸 이 책은 “18세기의 위대한 혁명들과 현재 사이에 존재한 근대적 대중, 특히 정치적 대중의 부상과 몰락의 문화적·사회적 측면의 역사를 추적하는 임무”를, 모두 16개의 장으로 나눠 비교적 성실히 수행해냈다. 책은 우리 시대의 ‘대중’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다.
“새 천년의 결정적인 집단성은 오직 광섬유에 의해 연결된, 그리고 수집할 만한 것, 험담, 대규모 통신망의 멀티플레이어 게임에 대한 공유된 열정에 의해 연결된 대화방의 온라인 대중인 것으로 보인다. 또는 각각 자동차 컨테이너 안에 밀봉된 채로, 이동해 다니면서 꼬리를 무는 집회 때문에 교통정체 상태에 빠진 운전자들, 또는 각각 스스로 고안한 유아론적인 오락의 보호막에 싸여 떼 지어 돌아다니는 보행자들이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이정현 국힘 공천관리위원장 사퇴…“생각한 방향 추진 어려워”

배현진 “참 어렵게 산다, 장동혁”…징계 중단하잔 말에 SNS 글

미 공중급유기, 이라크 상공서 추락…“적군 공격·오인사격 아냐”

한준호 “김어준, 사과·재발방지해야”…김어준 “고소·고발, 무고로 맞설 것”

이란 모즈타바 “복수는 최우선 사안”…첫 연설, 항전 다짐

이하상 “특검 안 나온 재판은 불법” 트집…재판장, 17초 만에 “기각”

오세훈, ‘장동혁 2선 후퇴’ 압박 초강수…서울시장 추가 모집 ‘버티기’
![이 대통령 지지율 66% 최고 기록…민주 47% 국힘 20%, 격차 커져 [갤럽] 이 대통령 지지율 66% 최고 기록…민주 47% 국힘 20%, 격차 커져 [갤럽]](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3/53_17733660011987_20260313500923.jpg)
이 대통령 지지율 66% 최고 기록…민주 47% 국힘 20%, 격차 커져 [갤럽]

영세자영업자, 체납액 5천만원 이하 납부의무 없애준다…2028년까지
![관세와 미사일, 양손에 쥐고 과대망상에 빠진 독재자 [아침햇발] 관세와 미사일, 양손에 쥐고 과대망상에 빠진 독재자 [아침햇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2/53_17733006909357_20260312502955.jpg)
관세와 미사일, 양손에 쥐고 과대망상에 빠진 독재자 [아침햇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