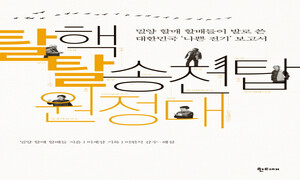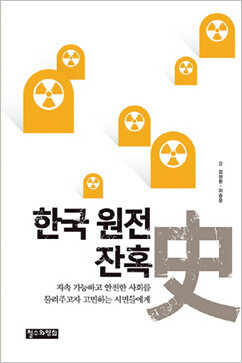
2011년 동일본 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많은 것을 뒤집어놓았다. 무엇보다 동아시아 사람들이 원자력 에너지의 실체에 대해 이전보다 진지하게 보기 시작했다. 여기에 더해, 국내에서는 원전 고장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고 2013년에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중심으로 한 ‘원전 비리’까지 터져나왔다. ‘안전한 에너지’를 내세웠던 원전 신화가 총체적으로 무너져내린 것이다. 이런 배경 때문에 원전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이전과 비교할 수도 없이 깊어지게 됐다. 대중의 우려와 관심이 이전까지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봉인돼 있던 영역을 ‘봉인 해제’하게 만든 셈이다.
이같은 탐사는 대개 기록노동자들이 선봉에 선다. 김성환·이승준 기자는 비슷한 시기에 각각 과 에서 원전 문제를 각자 취재한 선봉장이다. 이들은 이 책에서 원전 안전 신화에 균열이 나는 과정과 원전업계의 구조적 분석, 원전산업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놓는다. 원전을 비판적으로 다룬 목소리는 꽤 있지만, ‘현장의 기록’에서 출발한 책은 흔치 않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2년 2월, 국내에서는 가장 오래된 원전인 고리 원전 1호기에서 정전 사고가 벌어졌다. 정전으로 냉각수 온도가 급속하게 올라 노심이 녹을 수도 있었던 사고 상황도 아찔했지만, 원전 직원들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 뒤 한수원 직원, 부품업체와 검증기관, 승인기관 등이 조직적으로 연루된 비리로 원전 부품이 기준에 미달하는 ‘짝퉁’으로 공급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각종 ‘원전 비리’가 터져나왔다.
지은이들이 살펴본 그 내부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의문이 들 정도로 엉망이었다. 국내 원자력산업계는 한수원과 하청업체를 중심으로 진입장벽이 높고 폐쇄적인 산업구조를 만들었고, 신규 원전 건설을 확대하며 자신들만의 생태계를 키워왔다. 외부의 감시와 통제 시도에 대해 ‘전문성’과 ‘특수성’은 최적의 방어 수단이었다. 한켠에 ‘원전 마피아’가 있다면, 다른 한켠에는 원전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있다. 노동자들은 방사선 피폭 위협에 노출돼 있을 뿐 아니라, 중층화된 하청 구조에 불안정한 고용으로 신음하고 있다. 원전 주변 주민들은 타지보다 암 발병 확률이 높은 것이 아닌지 불안에 떨고 있으며, 원전에 의존하는 전력산업 구조는 밀양과 같이 송전탑 건설 갈등까지 불러일으킨다.
촘촘한 취재를 근거로 지은이들이 내놓는 주장은 어찌 보면 ‘최소치’에 가깝다. “원자력에 대해 더 많은 사회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소한 지은이들의 눈길이 머물렀던 곳들에 대해서만이라도 감시와 통제를 강화한다면, ‘그들만의 리그’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 동아시아 ‘안전 공동체’를 꾸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의미심장하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다카이치 “독도는 일본 땅, 국제 사회 알려야”…민주 “즉각 중단” 촉구

트럼프 “이란 완전히 파괴 중…오늘 무슨 일 벌어지는지 보라”

이란전 안 풀리자…트럼프·백악관, NYT·CNN에 화풀이

이정현 국힘 공천관리위원장 사퇴…“생각한 방향 추진 어려워”
![[단독] 이태원 참사 다음날 용산구청장, 대통령 경호처 ‘8100’번과 통화했다 [단독] 이태원 참사 다음날 용산구청장, 대통령 경호처 ‘8100’번과 통화했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3/53_17733793058302_20260313501532.jpg)
[단독] 이태원 참사 다음날 용산구청장, 대통령 경호처 ‘8100’번과 통화했다

배현진 “참 어렵게 산다, 장동혁”…징계 중단하잔 말에 SNS 글

“아빠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길”…60일된 딸 둔 가장 뇌사 장기기증

미 공중급유기, 이라크 상공서 추락…“적군 공격·오인사격 아냐”

“이정현 전화는 꺼져” 장동혁, 오세훈에 “공천은 공정이 생명”

이 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신고하세요”…“여기요! 1976원” 댓글 봇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