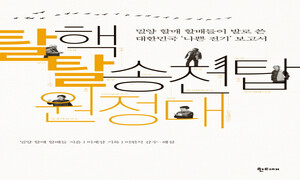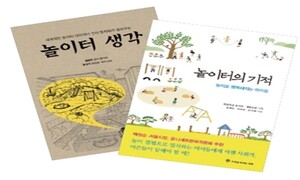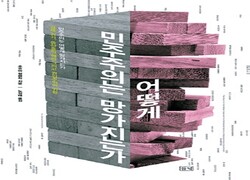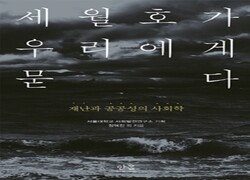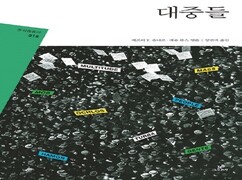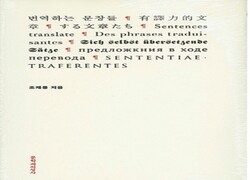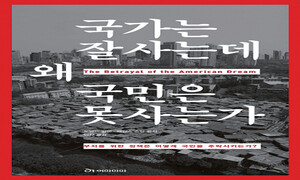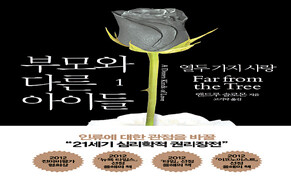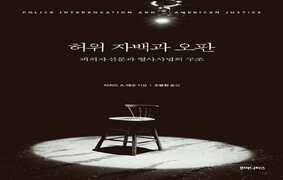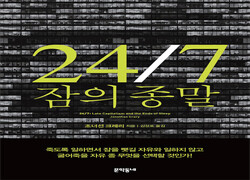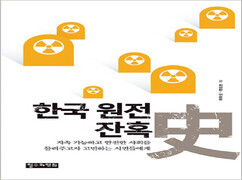마르크스주의 문학이론가인 프레드릭 제임슨은 라는 책에서 “마르크스의 은 실업에 관한 책으로 읽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이 권력을 획득할수록 실업이 늘어난다. 그렇지만 실업은 자본이 만들어낼 수는 있어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자본이 자신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구사하는 전략이 필수적으로 자신을 파괴하는 상태에 이르게 한다는 통찰이다. 책 (꾸리에 펴냄)의 전략은 얼핏 고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순항은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이다.
실업을 단순히 사회현상이 아니라 자본과 긴장관계를 형성하는 반대항으로 읽는다면 노동의 정치는 실업이라는 쟁점으로 새롭게 읽힌다. 실업은 노동 바깥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본의 위기라는 측면에서, 책은 “실업을 포함하지 않는 노동은 영원히 온전히 노동일 수 없다”고 한다.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종합할 수 없는” 정치와 경제 사이의 역동성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똑같이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중에서 누구는 현 정권이 가진 자들의 권력을 거침없이 휘두른다고 개탄하고, 누구는 또 자신을 편들어주는 믿음직한 정권이라고 믿는다. 정치를 경제로 환원하는 과거 프레임으론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다. 그러나 실은 ‘두 인민’ 사이의 이 터무니없는 낙차야말로 본래 정치가 작동해온 방식일지 모른다. 책은 “경제적인 것이야말로 사회적 변증법 자체”라는 들뢰즈의 정의와 “정치는 경제적 대립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불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가 계속 작동하기 위해 정치를 발생한다”는 지제크의 주장에 기댄다. 경제는 직접 정치로 내달리는 것이 아니며 경제적 이해 대립은 결코 정치적 입장 대립으로 번역될 수 없다. “경제는 정치를 두제곱한다. 경제는 정치의 실체도 내용도 아니다. 경제는 정치가 스스로를 만들어낸다”는 이유로 둘의 변증법은 여전히 난해하지만 바로 이 대목에서 운동으로서의 정치가 생겨난다.
변증법의 통찰에 좀더 귀기울여보자. 지제크는 “대답을 가진 것은 인민”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아직 인민 속에서 대답을 찾지 못한 것일까? 촛불시위 때 거리를 점거했지만 박근혜를 당선시킨 인민은 또 누구인가. 책은 “우리는 99%다”라는 외침이 아무런 정치적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99%는 100%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정치적인 주체’로 가정됐을 뿐 실제로 그 정치를 실현하는 1%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방법은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정치적 주체화하는 것밖에 없지만 자본주의는 그런 시도 자체를 막는 막다른 골목 아니던가. 어쩔 수 없다. 그 좌절 어느 지점에선가 새로운 희망의 정치가 작동하기를 기대한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220/20260220502864.jpg)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

“당 망치지 말고 떠나라”…‘절윤 거부’ 장동혁에 쏟아지는 사퇴 요구
![[단독] ‘양재웅 정신병원’ 주치의 구속 4개월 만에 보석…유족 반발 [단독] ‘양재웅 정신병원’ 주치의 구속 4개월 만에 보석…유족 반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1/53_17716543877486_20241013501475.jpg)
[단독] ‘양재웅 정신병원’ 주치의 구속 4개월 만에 보석…유족 반발

몸에 피 한방울 없는 주검이 되어 돌아온 새 신랑

이 대통령 “윤석열 선고 의견을 외국 정부에 왜 묻나”…언론 행태 비판

397억, 국힘 명줄 쥔 ‘윤석열 선거법 재판’…“신속히 진행하라”

미 국무부 “한국 사법 존중”…백악관 논란 메시지 하루 만에 ‘수습’

지방선거 임박한데, 장동혁은 왜 ‘윤 어게인’ 껴안나?

장항준 해냈다…‘왕과 사는 남자’ 500만, 하루 관객 2배나 뛰어

“대통령의 계엄 결정 존중돼야”…지귀연의 내란 판단, 어떻게 다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