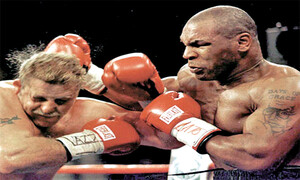영화 ‘러브 인 비즈니스클래스’.씨즈온 제공
6년 전 유학을 준비할 때, 학교 선택 기준은 훌륭한 프로그램과 지도교수, 그리고 3시간 안에 차량으로 도달할 수 있는 ‘허브 공항’이 있느냐였다. 그 공항에 한국행 직항 항공편이 있다면 금상첨화. 우스운 이야기겠지만 ‘항공 덕후’(마니아를 일컫는 일본말 ‘오타쿠’를 한국어로 빗댄 말)라 불리는 사람들에게는 낯선 이야기만은 아니다. 항공업계 관계자도 아닌데 직장 선택 기준이 일반 공항 아닌 전세계로 이어지는 허브 공항에 위치한 도시일 것, 혹은 프러포즈할 때 돈을 많이 벌진 못해도 “비즈니스 좌석 태워줄게”라고 했다는 등의 사람을 많이 만났다. 물론 이들 대부분은 공항이나 기내 옆좌석에서 만났다.
취미가 어느 순간 ‘덕질’이라는 이름으로 변모했는지 뚜렷한 계기나 기억은 없다. 요즘에는 태교여행이란 이름으로 뱃속에서부터 비행기 타는 아이가 많다지만 내 첫 비행은 중학생이던 1996년 어느 날 떠난 속초발 김포행이었다. 대한항공이 운행하고 네덜란드에서 만든 포커100(F100)이라는 기종이었고, 그 뒤 제주도 수학여행과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자매학교 방문 등으로 청소년 시절의 ‘비행’을 경험했다, 대학 가서는 틈만 나면 배낭여행 다니고자, 항공료를 줄이기 위해 시작한 ‘공부’와 ‘취미’가 어느 순간 다양한 항공사 마일리지 프로그램으로, 그 뒤에는 노선과 비행기 기종으로 확대돼 지금에 이르렀다. 비행 청소년이 항공 덕후로 변태하는 시발이 된 F100은 10년 전인 2004년 한국의 하늘에서 사라졌고, 속초공항도 2002년 양양공항이 개장하면서 추억 속으로 사라졌다. 언젠가 미국의 한 공항에서 F100을 우연하게 마주했을 때 나는 미친 사람처럼 비행기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지금 이 글을 베트남 공항의 한구석에서 쓰고 있다. 나무에서 떨어진 원숭이처럼, 몇 가지의 우연과 악재, 실수가 겹쳐 싱가포르행 비행기를 어이없게 놓쳐버린 탓이다. ‘덕후’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온갖 잔재주를 동원해 가장 싸게 오늘 안으로 싱가포르에 도착하도록 어찌어찌 다시 발권을 마쳤다. 아마 이 순간에도 전세계 곳곳에 포진한 항덕들은 단지 비행기를 타기 위해, 자기가 좋아하거나 타보지 못한 항공사나 기종을 타기 위해, 아니면 그냥 마일리지를 모으기 위해, 믿을 수 없이 싼 금액의 항공권이 나왔기에 각지의 공항에서 어슬렁대고 있을 것이다. 비록 겉으로는 여행자나 출장 가는 사람처럼 보일 테지만 말이다. 하노이공항 구석의 카페에서 물 한 병을 주문했더니 잔돈 150원이 없다며 박하사탕 두 알을 준다. 한 알을 입에 물고 찬물 한 모금을 들이켜니 알싸한 맛에 잠시 7월의 찌는 듯한 하노이를 잊어본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이재명 대선후보 자격 박탈’ 초스피드 질주한 ‘조희대 사법부’

이란 새 지도자 모지타바, 하메네이보다 초강경…미국에 항전 메시지

윤석열 “출마하시라 나가서 싸우라”…선고 다음날 ‘내란 재판 변호인’ 독려
![[단독] ‘한국인 노벨평화상’ 추천 학자들 “빛의 혁명, 민주적 회복력 본보기” [단독] ‘한국인 노벨평화상’ 추천 학자들 “빛의 혁명, 민주적 회복력 본보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9/53_17730229672236_20250113500160.jpg)
[단독] ‘한국인 노벨평화상’ 추천 학자들 “빛의 혁명, 민주적 회복력 본보기”

이정현, 오세훈에 “후보 없이 선거 치르는 한 있어도 공천 기강 세울 것”

60살 이상, 집에서 6천보만 잘 걸어도 ‘생명 연장’…좋은 걷기 방법

이 대통령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중동 상황 최악까지 염두”

주호영 “대구서도 국힘 꼴 보기 싫다고”…윤상현 “TK 자민련 될라”

정원오, 서울시장 출마 선언…“세금 안 아까운 서울 만들겠다”

제주항공 참사 유족 “유해를 쓰레기 속에 방치…국가 수습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