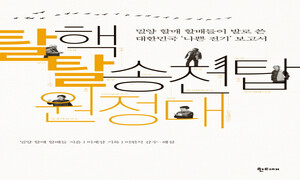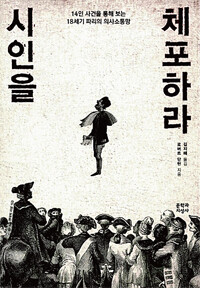
1
먼 훗날 2013년 한국의 겨울을 이야기할 때, 너도나도 종이에 손글씨를 써가며 ‘안녕들 하십니까’를 물었던 일들은 과연 어떻게 기억될까. 수많은 대자보를 대하는 우리의 감정은 지금은 너무도 생생하지만, 언젠가 감정은 휘발되고 건조한 사실들만 남는 시기가 올 것이다. 물론 신문기사를 비롯해 지금의 이 감정이 스며든 수많은 기록이 남을 것이고, 그것은 이 시기를 읽기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주저로 꼽히는 (1984)로 역사학계에 파란을 일으켰던 미국의 역사학자 로버트 단턴이라면 그런 공을 들일지도 모르겠다. 그는 뒷골목 인쇄소의 기록 등 기존 역사학계가 ‘사료’로서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했던 신선한 단서들로부터 ‘혁명 전야’ 18세기 프랑스의 공기를 생생하게 불러들인 바 있다. 그가 불러들인 역사는 거대한 구조 속의 필연적인 한 요소가 아니라 마치 케이크 조각처럼 잘라낸 듯 그대로 드러난 한 시대의 단면들이었다. 그 단면들을 파고드는 단턴의 머릿속에는 아마 그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의 집단적인 마음 상태, 곧 ‘망탈리티’(Mentality)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알고 싶다는 미칠 듯한 궁금함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단턴이 여론, 또는 의사소통 체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는 프랑스혁명 이전 구체제에서 어떤 책이 베스트셀러로 읽혔는지 살핀 (1996)을 낸 바 있다. 2010년에 낸 (김지혜 옮김, 문학과지성사 펴냄)에서는 아예 문자가 아닌 구어, 곧 노래와 시가 중심이 됐던 의사소통 체계를 파고든다. 역시 시대적 배경은 ‘혁명 전야’ 18세기 프랑스 파리다.
1749년 봄, 파리의 치안총감에게 “검은 분노의 괴물”이란 구절로 시작하는 시의 지은이를 체포하라는 명령이 떨어진다. 시의 유통 과정을 좇는 일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결국 사건은 왕(루이 15세)을 조롱하는 등의 ‘부적절한’(물론 경찰이 보기에) 내용을 담은 여섯 편의 시를 유포한 14명을 잡아들이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소동에 가까운 ‘14인 사건’이 일어난 것은 일차적으로 베르사유 안에서의 치열한 권력 투쟁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은이가 볼 때 14인 사건은 당시 파리의 거대한 의사소통 체계 가운데 극히 작은 일부만을 형성했을 뿐이다. 경찰의 보고서로 시작된 지은이의 연구는 점차 편지, 당대의 회고록, 급기야 ‘샹송집’으로 알려진 당대의 노래집에 대한 연구로 이어진다. 문맹률이 절반을 넘는 당시 사회에서 구어로 된 노래와 시는 폭넓은 의사소통 체계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당시 불렸던 노래들이 ‘혁명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40년 뒤 ‘바스티유 습격’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면, 혁명에 대한 열기가 무엇을 타고 널리 퍼졌을지 쉽게 짐작해볼 수 있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1/53_17732246670747_20260311503553.jpg)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

침묵하던 장동혁 “절윤 진심”…오세훈, 오늘 공천 신청 안 할 수도

미 민주당 “이 대통령 덕에 안정됐던 한미 동맹, 대미 투자 압박에 흔들려”

농어촌기본소득법, 농해수위 통과

이상민 “윤석열, 계엄 국무회의 열 생각 없었던 듯”…한덕수 재판서 증언

장동혁에 발끈한 전한길, 야밤 탈당 대소동 “윤석열 변호인단이 말려”

법원, 윤석열 ‘바이든 날리면’ MBC 보도 3천만원 과징금 취소

“최후의 카드 쥔 이란…전쟁 최소 2주 이상, 트럼프 맘대로 종전 힘들 것”

청담르엘 14억↓·잠실파크리오 6억↓…강남권 매물 쏟아지나

‘친윤’ 김민수 “장동혁 ‘절윤 결의문’ 논의 사실 아냐…시간 달라 읍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