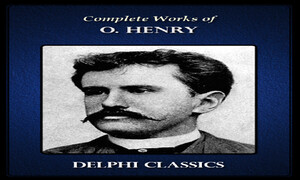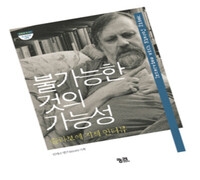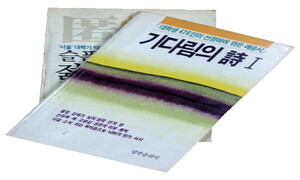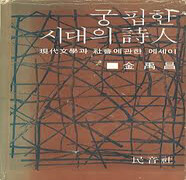958호 김보경의 좌충우돌 에디팅
본부장님: 그래, 선생님은 책 제목을 뭐로 하자시나? 나: 별 말씀이 없으십니다(일부러 안 여쭤봤다). 본부장님: 음, 그럼 제목 후보는 뭐가 있나? 나: 생각하시는 게 있으십니까?(후보들을 안 뽑았다는 이야기다) 본부장님: 글쎄, 보경은 뭐로 했으면 좋겠나? 나: 청춘의 독서, 어떠신지요?
내 편집자 생활 중 가장 짧은 제목회의였다. ‘제목’은 편집자의 운명에 얹은 미치도록 무거운 짐이다. “제목이 잘 빠져야 베스트셀러가 되지.” 이 말이면 그 편집자는 그날 잠은 다 잤다. “제목 별론데.” 이 말이면 바로 그 편집자와 원수 될 수 있다. 그런 게 책 제목인데, 더하여 저자가 10만 독자를 기본으로 시작하는 유시민 선생님이었다.
게다가 때는 2009년 가을이었다. 촛불이 뒤덮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 영구차가 지나간, 그 상처가 분명하던 때였으니, 그 와중에 유시민이 고른 14권의 고전 읽기가 그냥 ‘추천도서 목록’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러나 나는 몇 달 동안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심지어 제목도 없는데 예약판매일이 정해졌다. 급기야 이수미 본부장님이 직접 부르셨다. 그리고 단 5분 만에 끝났다. 돌아나가는 나에게 본부장님이 물으셨다. “그 제목 좋은데 왜 말을 안 하고 있었어?” 왜냐고요? 이제야 고백하지만, 사실 그 제목은 오래전에 ‘훔친’ 것이거든요.
2008년 재일 정치학자 강상중 선생님의 책이 일본 아마존에 떴다. 제목은 . 지금은 ‘청춘’이란 말이 트렌디하지만, 원래 그 단어에는 다소 ‘복고적’인 뉘앙스가 있었다. 교과서에 실린 민태원의 수필 ‘청춘예찬’ 때문일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그 제목을 보는 순간 마치 100살 된 노파가 회춘한 것처럼 설레었다. ‘아, 나도 저 제목 갖고 싶다.’ ‘아, 나도 저 제목을 올렸을 때 정말 잘 어울리는 저자를 갖고 싶다.’ 왜 그 제목을 ‘청춘의 독서’라고 줄여 마음에 심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 제목을 ‘훔쳐’버린 것이다.
그랬으니 몇 달 뒤 유시민 선생님 책의 담당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는가. 그렇게 본부장님 오케이, 저자 오케이를 지나 무사 천리로 진행되는가 싶더니, 오 마이 갓! 강상중 선생님의 그 책이 번역돼 나온다니! 그것도 같은 달 같은 주에! 게다가 당시 돌베개에 있던 친구 김희진이 담당이라니! 정말 기도가 간절한 순간이었다.
희진, 이제야 말이지만 “우리는 제목을 ‘청춘을 읽는다’로 지었어”라는 너의 전화가 얼마나 구원이었는지 몰라. 이 미안함은 두고두고 갚으마. 그리고 이제 자유인 글쟁이로 돌아오신 유시민 선생님, 그때 미리 말씀 못 드려 죄송합니다. 그래도 는 꼭 내셔야 해요. 지금도 후속편이 언제 나오냐는 독자들의 전화가 온단 말입니다. 몇 년째 못 들으신 척하지 마시고요. 네, 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나 [박용현 칼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나 [박용현 칼럼]](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4/53_17726118413306_20260304503108.jpg)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나 [박용현 칼럼]

‘순교자’ 하메네이에 ‘허 찔린’ 트럼프…확전·장기전 압박 커져

김성태 “검찰 더러운 XX들…이재명, 말도 안 되는 것들에 엮여”

“유심 교체하고 200만원씩 이체하세요”

국방부, 장군 아닌 첫 국방보좌관 임명 나흘 만에 업무배제

호르무즈 봉쇄 직전 한국행 유조선만 ‘유유히 통과’…사진 화제
![[단독] ‘왕사남’ 엄흥도 실제 직계후손 출연했다…누구지? [단독] ‘왕사남’ 엄흥도 실제 직계후손 출연했다…누구지?](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4/53_17726139703969_20260304503247.jpg)
[단독] ‘왕사남’ 엄흥도 실제 직계후손 출연했다…누구지?

“조희대, 법복 입고 법률 뒤에 숨으면 썩은 내 사라지나” 박수현 비판

‘이재명 대선후보 자격 박탈’ 향해 초스피드 질주한 조희대 코트

강혜경 “나경원과 오세훈 차이 좁히게 여론조사 조작” 재판 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