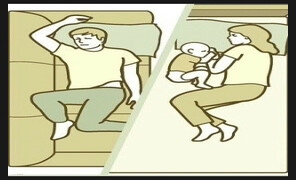어린 시절을 떠올릴 때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다. 나는 하얀 옷을 입고 의자에 앉아 앙앙 울고 있다. 주변에는 모두 하얀 옷을 입은 남자아이들이 기합에 맞춰 주먹을 내지른다. 태권도복이다. 대여섯 살밖에 안 된 여자아이 손을 잡고 태권도장을 찾은 이는 할아버지였다. 맏아들이 딸만 셋을 줄줄이 낳자 상심하셨던 할아버지는 그중 둘째, 나를 아들답게 키워보려 애쓰셨다.
“생긴 것도 행동하는 것도 아들인데 고추만 안 달고 태어난” 나는, 그러나 태권도장에 들어서자마자 울음을 터뜨려 할아버지를 실망시켰다. 난처해진 관장님은 작은 의자 하나를 꺼내와 나를 앉혔다. 태권도장을 다닌 한 달 내내 나는 그 의자에 앉아만 있었다. 나의 태권도 인생은 그렇게 흰띠에서 끝이 났다.

어린 시절 필자(맨 왼쪽)와 자매들.
태권도는 어찌 피해갔지만 딸내미로 살며 울음으로도 회피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았다. 가난한 집에 시집와 밑으로 줄줄이 시동생·시누이들을 돌보고 병든 시아버지 수발까지 해야 했던 엄마는, 그러나 그 모든 고생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댁 식구들 눈치를 봐야 했다. 그런 엄마가 안쓰러워 우리 세 자매는 명절이나 제사 때면 누구보다 열심히 집안일을 도왔다. 그런 우리를 보며 친척들은 “이 집은 딸이 많아 일손이 넉넉하다”고 좋아하면서도 돌아서며 “그러게 아들 하나만 더 있으면 얼마나 좋아…”라는 말로 깊은 상처를 주었다. 명절이 다가오면 스트레스로 가슴이 답답해지는 명절증후군은 어린 시절부터 내게 친숙했다.
스무 살 즈음이 되자 난 모든 ‘딸내미의 숙명’과 그만 안녕을 고하고 싶어졌다. 더 이상 가부장제 사회가 바라는 대로 살아주기 싫어졌다. 결혼과 출산도 그중 하나였다.
“아기가 아빠를 닮았네요.” 임신 후반기, 산부인과 의사가 넌지시 내게 이 말을 건넨 순간 만감이 교차했다. 아들, 아들이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우리 부모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아들이다. 그 아들을, “아이를 낳지 않겠다”던 내가 덜컥 가졌다. 옆에서 “나는 딸이 좋다”며 아쉬워하는 남편에게 말했다. “나는 아들이 좋아. 아들을… 한번 낳아보고 싶었어.”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했다. “엄마, 나 아들이래.” “그래? 아이고, 잘됐네. 축하한다!” 축하한다는 말을 듣는데 목이 메었다. 시부모님께도 전화를 했다. 시아버님은 아들이라는 말에 딱 한마디를 하셨다. “고맙다.” 시댁은 워낙 아들 부잣집이라 오히려 딸이 귀하다. 그런데도 시어머님은 말씀하셨다. “맏이인 너희가 낳는 아들은 다르다”고.
가부장제 사회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지 않겠다던 스무 살 여자아이는 이제 서른이 넘어 결혼을 했고 맏며느리가 됐고 아이까지 가졌다. 그것도 아들을 가져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고 말았다. 이제는 오히려 딸이 대세라는 시대, 나는 아들을 키우며 무엇을 느끼고 배울 수 있을까. 어쨌든 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 마침내는 세상에 이렇게 외치고 싶다. 아들이나 딸이나! 흥!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러, 이란에 미국 군함·항공기 위치정보 제공”…전쟁 ‘간접 참여’ 정황

60살 이상, 집에서 6천보만 잘 걸어도 ‘생명 연장’…좋은 걷기 방법
![[단독] 윤석열,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냈다…위헌심판 기각에 불복 [단독] 윤석열,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냈다…위헌심판 기각에 불복](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6/53_17727819701798_20260306502051.jpg)
[단독] 윤석열,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냈다…위헌심판 기각에 불복
![장래 지도자 선호도…조국 9%, 김민석·장동혁·한동훈 4% [갤럽] 장래 지도자 선호도…조국 9%, 김민석·장동혁·한동훈 4% [갤럽]](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6/53_17727619029891_20260306500988.jpg)
장래 지도자 선호도…조국 9%, 김민석·장동혁·한동훈 4% [갤럽]

‘항명’ 박정훈 준장 진급…이 대통령 “특별히 축하드린다”

백악관 “이란 군사작전, 4~6주 안에 끝낼 것…‘무조건 항복’ 외엔 없어”

인천 빌라촌 쓰레기 봉투서 ‘5만원권 5백장’…주인 오리무중
![[단독] ‘쿠팡 가만 안 둬’ 스코틀랜드 3위 연기금, 총대 메고 소송 전면전 [단독] ‘쿠팡 가만 안 둬’ 스코틀랜드 3위 연기금, 총대 메고 소송 전면전](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1217/53_17659590361938_241707891273117.jpg)
[단독] ‘쿠팡 가만 안 둬’ 스코틀랜드 3위 연기금, 총대 메고 소송 전면전
![아직 한국은 ‘박정희 없는 박정희 체제’ [.txt] 아직 한국은 ‘박정희 없는 박정희 체제’ [.txt]](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6/53_17727493087612_20260305503922.jpg)
아직 한국은 ‘박정희 없는 박정희 체제’ [.txt]
![[단독] ‘왕사남’ 엄흥도 실제 직계후손 출연했다…누구지? [단독] ‘왕사남’ 엄흥도 실제 직계후손 출연했다…누구지?](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4/53_17726139703969_20260304503247.jpg)
[단독] ‘왕사남’ 엄흥도 실제 직계후손 출연했다…누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