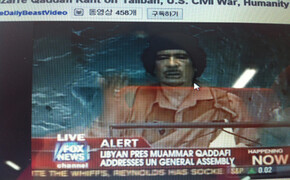너의 의미
마법이 아닌 걸 알고 있으면서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법처럼 느끼게 하는 사물들이 있다. 그것은 신비한 사실을 밝혀내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친숙하게 생활 곳곳을 채우고 있는 것들이어서 더 놀랍다. 거울이 그렇고 색색의 장난감 블록들도 그렇다. 사람 손을 타며 돌아가는 재봉틀은 어떨까. 코페르니쿠스의 예측을 증명한 특수 망원경이나 빛의 속도에 대해 알려준 푸코의 장치처럼 전문가를 위해 고안된 것은 아니지만, 재봉틀이 만들어내는 옷은 할머니가 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마법이 된다. 재봉틀은 실과 바늘을 다루는 여성의 노동력을 급격하게 대중화시킨 놀라운 장치였다. 최근엔 고된 노동이 아닌 취미 생활을 돕는 애교 있는 장난감이 되기도 했지만, 최초의 재봉틀은 작은 방의 하인이나 공장의 여공들이 ‘일어서서’ 사용하는 제품이었다.
1850년대 미국에서 처음 생산된 재봉틀은 거대하고 무거웠다. 어두컴컴한 공장에 가야 재봉틀이 쌕쌕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었다. 재봉틀이 가정용 사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반 재봉틀 제작업체의 디자인 때문이었다. 대표적인 재봉틀 제작업체 ‘싱어’사는 공장 냄새 나는 기존의 재봉틀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재봉틀이 놓인 가정의 그림을 홍보 책자에 담아 여성들을 끌어당겼다. “여성에게 휴식과 교양을 위한 풍부한 여가 시간을 주고, 여성 취업의 기회를 무한대로 확장해줍니다.” 여가와 취업의 이중 생활이 가능하다는 유혹은 강렬했다. 재봉틀은 마치 어른이 된 여성이 딸에게 빼앗긴 인형 대신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처럼 아기자기하고 작아졌다.
공장에서 쓰던 삑삑 소리 나는 재봉들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는 1858년 싱어사가 내놓은 신제품에서도 느낄 수 있다. 집 안의 아름다움을 내세워 여성의 퍽퍽한 노동이 취미와 여가로 포장되기 시작했다. 싱어사는 신제품 재봉틀을 기계 덩어리가 아니라 실내의 그럴싸한 장식품으로 만들기 위해 꽃과 식물 문양을 작은 재봉틀 위에 새겨넣었다. 19세기 말에는 저렴한 가격 책정으로 바느질하는 하인이 없는 평범한 가정에서도 재봉틀 하나쯤은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싱어사의 재봉틀(사진)은 가볍고 날렵한 몸통에 곳곳에 금박 문양을 뽐낸다. 공장에 있었더라면 짙은 먼지가 묻었겠지만 깔끔한 집에 놓인 재봉틀의 검은 바탕에서는 빛이 난다. 1960~70년대 국내에서도 싱어 재봉틀은 많은 주부들이 탐내는 아이템이었고 엄마를 떠올리게 하는 향수 어린 사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비상식적인 공장의 어린 소녀들이 타이밍(각성제)을 먹으며 밤낮 일을 하게 만드는 비인간적인 노동의 도구였다. 손과 거의 하나가 된 재봉틀을 반복적으로 움직여 고되게 쌓은 노동의 흔적은 매끈한 새 옷의 외관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 작은 사물은 지금도 밤낮 여기저기에서 끊임없이 돌아간다. 지금 봉제공장에는 10대 여공들이 사라졌지만 주택가 지하에서는 여전히 누군가 드르륵 재봉틀을 돌리는 소리가 들린다.
공장에서 가정으로, 또 어두운 지하에서 안락한 집 안의 탁자 위로 수없이 위치를 바꿔온 재봉틀은 또 얼마나 많이 버려졌을까. 시인 김혜순은 시 ‘김포 쓰레기 매립지로 가는 길’에서 버려진 재봉틀의 형태를 이렇게 기억한다. “검은 비닐봉지들은 참새떼보다 높이 날아오르고 버려진 재봉틀 대가리는 말 대가리 같았어. 엄마의 재봉틀 소리는 몸에 난 구멍을 하나씩 하나씩 메워주었어.”
현시원 독립 큐레이터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동사무소 직원 ‘점 하나’ 실수로 남동생이 남이 되었다
룰라 ‘새끼손가락 없는 맞춤장갑’ 받고 미소…뭉클한 디테일 의전

트럼프 “관세 수입이 소득세 대체할 것…더 강력한 수단 쓰겠다”

스케이트 날이 휘면 다시 펴서…아픈 누나 곁 엄마에게 메달 안긴 아이

주한미군 사령관, ‘한국에 미-중 전투기 대치 사과’ 전면 부인

“누가 반대했나 밝혀라”…통합안 보류에 국힘 TK 의원-지도부 충돌

이 대통령 “농지매각 명령이 공산당? ‘경자유전’ 이승만도 빨갱이냐”

피해자들은 왜 내 통장에 입금했을까

전한길, 반말로 “오세훈 니 좌파냐?”…윤어게인 콘서트 장소 제공 압박

이 대통령 울컥…고문단 오찬서 “이해찬 대표 여기 계셨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