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째 벗긴 표범가죽에 매료되기도 하고 빈티지풍 옷을 뒤적이기도 하고…. 개미시장은 유쾌하게 즐기는 곳이다. 한혜경
그 핸드백은 허접스러운 짝퉁 가방들 틈에 낀 채 좌판 위에서 누군가를 의젓하게 기다리고 있다. 나는 덥석 그를 끄집어내서 신혼집을 구하러 온 예비 새댁만큼이나 신중하게 구석구석 살펴본다. 약간의 흠집이 있지만 그리 눈에 띄지 않는다. 조잡한 장식 없이 깔끔한 디자인에 상큼한 색감, 소재도 진짜 소가죽이다. 생전 처음 보는 브랜드명이 아주 작게 음각 처리됐다. ‘값을 꽤 부르겠지.’ 약간 긴장된다. 비싸면 안 사면 그만이지만 이것만은 갖은 생떼와 애교와 구걸을 동원해 단돈 1천원이라도 깎아서 사고 싶다. 최대한 ‘나 이거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이라는 어투로 묻는다. “이거 얼마예요?” 좌판 주인은 ‘너 그거 사든지, 말든지’라는 듯 무뚝뚝하게 대답한다. “3천원.” 나는 ‘300만원’이라는 말을 들은 것만큼 화들짝 놀라 ‘어떻게 이럴 수가?’ 하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본다. ‘그럴 수도 있지, 뭐’라는 듯 태연한 얼굴의 아버지는 이미 지갑을 꺼내 1천원짜리 세 장을 헤아리고 있다. 이런 식의 ‘득템’이 이상하지 않은 곳, 보물찾기를 할 수 있는 정글, 이곳은 서울의 ‘개미시장’이다.
다들 개미시장이라 하지만 정확히 언제부터, 누가, 왜 개미시장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건지는 아무도 모른다. 청계천 복원공사가 시작된 뒤 터전을 잃은 벼룩시장 상인들이 새로이 판을 깐 곳이 여기라고 한다. 매주 토·일요일 낮이면 서울 지하철 1호선·6호선 동묘역 4번 출구 일대에 거대한 벼룩시장이 서고, 누가 먹다 흘린 아이스크림 주위에 새카맣게 모여든 개미떼처럼 많은 사람이 중고 물품을 사고판다.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남성이 가장 많은 탓에 젊은이들은 처음엔 좀… 종로3가 탑골공원에 온 것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도 있다. 청년층은 아주 가끔 보인다. 동성 친구끼리거나 커플인 사람이 대부분이다. 개미시장에 온 젊은이들은 하나같이 독특하고 범상치 않은 고수의 분위기를 풍긴다. 한창 구경 중인데 아버지가 내 옆구리를 쿡 찌르며 말한다. “저기서 미니스커트 입은 예쁜 아가씨가 1천원짜리 옷 좌판에 쭈그리고 앉아서 열심히 뒤지고 있더라.” 나는 ‘빈티지의 멋을 아는 친구로군’ 하고 생각한다. 남자 아이돌처럼 검은 아이라인을 그리고 피어싱을 한 꽃미남 두 명이 신발 좌판의 워커를 가지고 흥정하고 있다. 나란히 검은 캔버스화를 맞춰 신은 한 커플은 촌스럽고 이상한 옷을 서로 권해주며 낄낄 웃는다. 배우 류승범을 어설프게 닮은 긴 머리 청년은 북적이는 길 한구석에 서서 이 광경을 디지털일안반사식카메라(DSLR)로 찍고 있다. 개미시장에는 내 또래가 희귀하기 때문에 일단 마주치기만 하면 신기한 생명체를 발견한 것처럼 관찰하게 된다(걔네들도 내가 신기할까?). 그들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이곳을 유쾌하게 즐기는 듯 보인다.
예전에 유럽 배낭여행을 갔을 때 로마의 ‘캄피오 델 피오리’ 주말 벼룩시장을 다녀왔는데, 그곳과도 비슷하다. 평범한 물건뿐 아니라 ‘아니, 어떻게 이런 물건을 팔 생각을 하지?’ 싶은 것, ‘뭐 이런 물건이 다 있어?’ 싶은 것, ‘이런 거 사는 사람이 있어?’ 싶은 것까지 다 판다는 점에서 개미시장도 세계 각국 벼룩시장 정신과 일맥상통한다. 어느 좌판에서 섬세한 세공이 돋보이는 묵직한 크리스털 트로피를 발견한 아버지는 “저걸 내 방에 장식해두고 싶다”며 흥정을 시도한다. 나는 “도대체 남의 이름 떡하니 새긴 트로피 따윌 왜 사요?”라고 말리려다 관둔다. 제 트로피를 내버리는 사람이나, 그걸 주워 갖다 파는 사람이나, 생판 모르는 남의 트로피를 사려는 사람이나 다 내겐 마냥 신기할 따름이다. 그렇지만 이러던 나도, 통째 벗긴 표범가죽에 매료돼 그 앞에 멍하니 서서 “우와~ 갖고 싶다” 중얼거린다. 아무리 생각해도 비쌀 것 같고 사서 어디다 쓸지도 막막하니 가격은 묻지 않는다.
차마 가질 수 없는 표범가죽 대신에 평소 보고 싶던 영화 DVD 정품 두 장(5천원), 뽀빠이와 올리브가 그려진 1980년대풍 빈티지 유리컵 3개(3천원), 누가 한두 번 신었는지 거의 새것 같은 여름용 샌들 한 켤레(5천원)를 더 산다. 365일 쾌적한 습도와 온도가 유지되고 무엇이든지 가격표가 붙어 있으며 유니폼 입은 친절한 직원이 따라다니는 백화점 쇼핑도 좋지만, 가끔은 이렇게 작열하는 태양빛을 내리쬐면서 각양각색의 사람과 물건을 구경하고 “차비만 빼주세요~옹”이라는 되지도 않는 애교를 부려가며 흥정하는 것도 나름대로 풍류라면 풍류 아닐까.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신나게 보물찾기를 해보는 거다. 당신의 상상 속 ‘잇 아이템’(It Item)을 ‘득템’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한혜경 ‘손바닥 문학상’ 수상자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윤석열 무기징역…법원 “내란 우두머리죄 인정”

몸에 피 한방울 없는 주검이 되어 돌아온 새 신랑

10개월간 환자 묶은 부천 이룸병원…인권위 “신체 자유 보장” 권고

국민 75% “윤석열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선고받을 것”

“미, 이르면 주말 이란 공습…이라크전 이후 최대 규모 공군 중동 집결”

지귀연, 전두환 아닌 찰스 1세 거론에…“벌거벗은 세계사냐” 비판

자동차 수리·페인트칠로 모은 5억…“누나, 아픈 사람들 위해 써줘”

노벨상 추천서에 ‘응원봉’ 등장…“무기 아닌 용기로 보장되는 평화 입증”

‘이상민 딸’ 보고 눈물 났다던 김계리 “지귀연, 윤석열 무죄 선고해야”

‘19 대 1’ 수컷들 성적 괴롭힘에 추락사…암컷 거북의 비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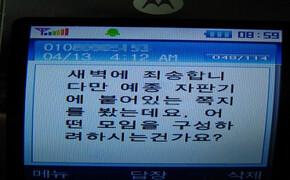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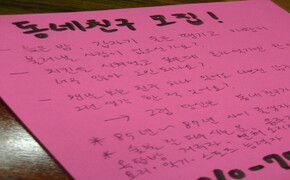




![[속보] 법원, 내란 수괴 윤석열에 무기징역 선고…김용현에 징역 30년 [속보] 법원, 내란 수괴 윤석열에 무기징역 선고…김용현에 징역 30년](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19/53_17714858210992_96177148580773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