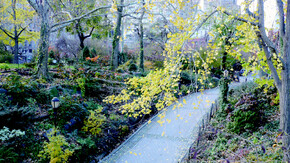<카르노사우르>
지난 4개월간 하루하루가 모험이었다. 은행 계좌를 열고,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집세를 내고, 빨래방에 가는 것까지 낯설고 남들보다 곱절의 시간이 필요했다. 일상적인 파티 초대에도 오만 가지 질문이 꼬리를 문다. 몇 시까지 어떤 차림(!)으로 도착해야 하는지, 준비물(!!)은 무엇인지 등등. 그냥 몸만 오면 된다는 말에는 ‘그럼 회비가 있는 걸까’ 고민하고, 조금씩 음식을 지참해달라는 말에는 뭔가 ‘유니버설하면서도 이그조틱’하고 그러면서도 크게 힘들인 것 같지 않은 한국 음식 하나 만들 줄 모르는 자신을 원망한다.
그래서 결론은? ‘지난 30여 년간 터득한 상식을 적용하면 크게 틀릴 수 없다’, 혹은 ‘사람 사는 건 어디나 비슷하다’는 것. (하우스) 파티란 ‘적당히 술을 홀짝거리면서 늘어지는 시간’과 동의어였고(여기에 영화나 게임이 종종 곁들여진다), 음식은 외부에서 공수한 피자와 맥주일 수도 있고, 집주인과 그 룸메이트들이 간단하게 준비한 무엇인가일 수도 있다. 적당히 돈을 보탤 수도 있고, 각종 요리 재료를 다듬는 등 몸으로 때워도 좋다. ‘파티’라는 외래어가 주는 정체불명의 기대감을 제외하니, 모든 것이 한국에서 겪었던 ‘누군가의 집에 몰려가서 시시덕거리기’와 너무나 흡사했다. 물론 유유상종 역시 만고의 진리여서 이곳에서 알게 된 이들 대부분이 알고 보니 나와 비슷한 취향을 공유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런 규정이 절대적 보편성을 획득하는 건 다소 무리다.
희망찬 2010년이 밝은 것을 기념해 ‘배드무비 나이트파티’(Bad Movie Night Party)가 열렸다. 짧은 방학 동안 갈고닦았(다고 자랑했)던 떡볶이 제조 실력을 발휘하라는 ‘오더’와 함께. 아닌 척했지만 떨렸다. 대화가 주가 되어야 할 때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나만의 스트레스가 (영화 덕분에) 적을 거라는 것은 기대되는 지점. 그러나 어떤 것을 만들어도 다시 동일한 맛이 날 거라 기대할 수 없는 내가 떡볶이라니. 몇 차례 연습을 해보는 등 남몰래 맹훈련 기간을 가졌다. 무엇보다도 어머니께서 특별히 제조해놓고 떠나신 볶음고기라는, 믿는 구석이 있었다.
아메리칸 특유의 긍정적 마인드 덕분에 떡볶이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오리무중으로 빠졌다. 파티에선 여느 때처럼 ‘아메리칸 컬처’에 대한 사적인 관찰기 작성으로 혼자 바빴다. 첫째, ‘맥&치즈’ 혹은 ‘마카로니 앤드 치즈’에 대한 편견이 깨졌다. 맥&치즈를 만든다는 친구를 보며 ‘라면을 요리하겠다는 격이잖아!’라고 생각했던 거만함이 부끄러웠다. 그건 가미하는 치즈의 선택·조합에 따라 무한 실험·변형이 가능하고, 빵가루가 동원되고 오븐에 굽기도 하는 등 엄연한 정식 요리였다. 둘째, 등을, 어릴 때부터 반복 관람한 원주민과 함께, 때론 낄낄대며 대사를 따라 하고 때론 되도 않는 진지한 토론을 이어가며 감상하는 건 정말 근사했다. 나쁜 영화를 과다 복용한 탓에 ‘슈가 러시’가 밀려들 땐 규칙을 어기고 같은 고전을 통해 쉬어갈 수 있다.
영화와 맥주와 잠에 취해 노곤해지던 차에 누군가 중얼거렸다. “이봐, 눈 오는 주말 밤, 뉴욕에서 이러고 있으니 우리 왠지 되게 늙은 거 같아.” 나는 생각했다. ‘아, 저런 대사까지 곁들여지니 한국과 모든 것이 똑같아.’
오정연 자유기고가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이 대통령 “개 눈에는 뭐만”…‘분당 아파트 시세차익 25억’ 기사 직격

이준석-전한길 ‘끝장토론’…“25년간 극비로 부정선거 구축” 황당 주장

민주 “응답하라 장동혁”…‘대통령 집 팔면 팔겠다’ 약속 이행 촉구
![왜 부자는 수돗물을 마시고 가난한 사람이 병생수 마실까 [.txt] 왜 부자는 수돗물을 마시고 가난한 사람이 병생수 마실까 [.txt]](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7/53_17721459993113_20260226504293.jpg)
왜 부자는 수돗물을 마시고 가난한 사람이 병생수 마실까 [.txt]

일본, 이제 ‘세계 5대 수출국’ 아니다…한국·이탈리아에 밀려나

“초상권 침해라며 얼굴 가격”…혁신, 국힘 서명옥 윤리특위 제소 방침

이진숙 “한동훈씨, 대구에 당신 설 자리 없다” 직격

홍준표, 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맞장구…“부동산 돈 증시로 가면 코스피 올라”

동사무소 직원 ‘점 하나’ 실수로 남동생이 남이 되었다

‘이란 공습’ 전운 감도는 중동…미국,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철수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