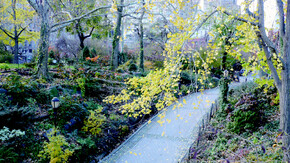1일 4시간 3분 전. 사진 오정연
그래, 우리만이 아는 곳에 대해 얘기해보자, 마지막으로. 단, 개인적인 취향의 한계 탓에 ‘혀’로 한정해서. 서울에서 단 한 그릇의 팥빙수만 허락된다면, ××백화점 밀탑으로 향할 것. 커피절임 떡과 직접 삶은 팥은 1회 리필이 가능하다. 불친절하기로 소문난 집 앞의 ‘조폭’ 떡볶이집은 오후 4시께 마수걸이 때를 노려보자. 유례없이 친절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대니까.
서울 구석구석의 기억을 떠올리며 문득 궁금해진다. 단 한 번도 견고한 일상을 가져본 적 없으면서, 그러니 지칠 것도, 뭔가 시작해야 한다는 절박함도 없는 주제에, 평생 3주 이상 엄마 품을 떠나본 적도 없는 사회적 지체아의 몸으로, 기약도 없는 2년간의 출타를 초래한 나의 속셈은 대체 뭘까. 석 달 전 컴퓨터에 D-데이 카운터를 맞췄다. 지금은 그 카운터가 1일 4시간 11분 42초를 지나고 있다. 이 시간을 가리키도록 대답은 요원하다. 침대 위엔 1년치 생리대와 10만원어치 상비약과 경제적인 다리 길이에 맞춰 줄인 열두 벌의 바지, 그 밖에 그곳에도 있겠지만 돈 주고 사려면 짠순이 깜냥에 배 아파질 것이 분명한 시시콜콜한 것들이 빼곡하다. 오지탐험 가냐고 할 법한 행장이지만, 1일 4시간 3분 뒤엔 ‘무려’ 뉴욕행 비행기에 있을 예정이다.
그러니까 뉴욕. 우디 앨런이 구시렁대며 줄을 서던 예술영화관, 로버트 드니로가 무표정하게 거울을 응시하던 방, 캐리 일당이 대답 없는 질문들을 주고받던 브런치 카페, 해리와 샐리가 끝없는 수다를 이어가던 센트럴파크가 있(다)는 그곳. 1990년부터 자칭 영화애호가로, 2004년부터 영화전문지 의 취재기자로, 2008년부터 타칭 자유기고가로 살아온 덕분에, 뉴욕은 이미 마음의 고향이지만 실은 아무것도 (아직) 모른다.
사회적 지체아의 이 몸께서 ‘초인급 어리버리라도, 전문가 레벨의 짠순이라도 가능한, 뉴욕 (진짜) 내 맘대로 즐기기’라는 콘셉트의 칼럼까지 시작하니 너무 무책임하지 않냐고? 그 대답도 무책임함이다. 석 달 전엔 귀국 이후에 대한 고민으로 잠을 설쳤고, 한 달 전부턴 외국어로 학문할 생각에 막막했으며, 일주일 전에는 거기서 집만 무사히 구해도 황송할 지경이더니, 이틀 전부터는 제대로 짐 싸서 비행기에 오르기만 해도 다행이라고 되뇌었고, 지금 같아선 저놈의 카운터가 0에 도달하기 전까지 이 글을 마감만 하면 여한이 없겠다는, 그런 무책임함이다. 시야는 짧을수록 생산성이 높고, 한 치 앞만 내다볼 때 마음은 가장 편하더라. 그러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과 지면에 걸쳐 나름의 속도로 뉴욕과 나를 더듬어보려고 한다. 독자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가장 솔직한 포부를 ‘내 멋대로 개사’로 대신한다.
오정연 자유기고가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농지 전수조사’ 준비 착수…매각명령, 매해 1000명서 대폭 늘 듯

박정훈, ‘항명’ 기소 군검사 재판서 “권력의 사냥개들” 비판
![[단독] “새벽 2시 출근” 강동구 26살 청소노동자, 일자리 잃고 거리로 [단독] “새벽 2시 출근” 강동구 26살 청소노동자, 일자리 잃고 거리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5/53_17720019159043_20260225502317.jpg)
[단독] “새벽 2시 출근” 강동구 26살 청소노동자, 일자리 잃고 거리로

동사무소 직원 ‘점 하나’ 실수로 남동생이 남이 되었다

3차 상법개정안 통과…‘자사주 소각 의무화’ 증시 더 달굴 듯

국힘, 지방선거 1·2호 인재 영입…손정화 회계사·정진우 원전엔지니어

피해자들은 왜 내 통장에 입금했을까

스케이트 날이 휘면 다시 펴서…아픈 누나 곁 엄마에게 메달 안긴 아이

쉬지 말고 노세요…은퇴 뒤 ‘돈 없이’ 노는 법

“이 대통령, 어떻게 1400만 개미 영웅 됐나”…외신이 본 K-불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