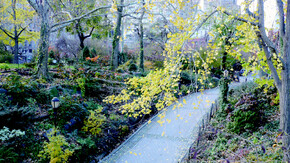박물관을 좋아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거기서 어슬렁거리는 걸 즐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낯선 도시에서 ‘이 박물관을 마스터하겠어’라는 기세 없이 어슬렁거리는 게 뿌듯하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언제 갔는지 기억도 가물한데, 베니스 구겐하임의 정원,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의 복도, 런던 내셔널갤러리의 터널을 생생하게 그릴 수 있는 건 그 때문이다. 직원이 아닌 이상 모든 사람은 박물관에서 동등하게 이방인. 여행객 티 내기는 싫은 주제에 집 근처에서도 어리바리한 나에겐 최적의 공간이다.

루빈 뮤지엄 오브 아트. 오정연
그러니 뉴욕의 박물관 목록을 뽑아보며 기대에 부풀었던 건 당연지사. 근데 리스트가 너무 길었다. 휘트니·모마·구겐하임 등 이름만으로 양과 질을 보장하는 곳이 기라성인데, 키친(KITCHEN)·웨이브힐(Wave Hill) 등 호기심 만발하는 이름에, 박물관인지 공원인지 문화센터인지 정체성 모호한 곳들도 만만찮다. 그러나 박물관 말고도 놀고, 먹고, 기웃거릴 거리들로 빼곡한 곳에서, 무엇보다 일상에 쫓기는 유학생 처지가 아니던가. 여느 때처럼, 이곳을 마스터하겠어, 라는 기세는 일찌감치 접어버리고(이곳에서 절박하게 익힌 교훈 하나, 불가능한 거 이루려고 무리해봤자 머리만 센다), 석 달 남짓 메트로폴리탄에서 열리는 로버트 프랭크 특별전을 3차에 걸쳐 관람하는 여유만만 모드로 돌아가버린 상태다.
‘무심한 듯 시크한’ 동네, 첼시 한구석에 위치한 ‘루빈 뮤지엄 오브 아트’(Rubin Museum of Art)는 여유만만 일상 속에 자리한 박물관이다. 의료보험 회사를 거느렸던 뉴욕 토박이 사업가가 1500점에 달하는 개인 소장품으로 시작한 이곳은 표면상으로는 ‘히말라야 박물관’이다. 그러나 히말라야는 여섯 개 정도의 국가에 걸쳐 있고, 불교와 힌두교를 포함해 수많은 토착 종교들이 공존하기에 하나의 문화로 소개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 이곳에는 티베트 여행길에서 ‘득템’한 듯한 공예품, 각종 탱화와 다양한 힌두교 신들의 조각상이 공존한다. 1층 카페는 여기 사람들이 환장하는 오리엔탈 웰빙 음식 냄새가 물씬 풍기는 저녁이 되면 분위기 좋은 바로 변신한다. 압권은 금요일 밤의 카바레 시네마(Cabaret Cinema). 아벨 강스의 1920년대 무성영화 등을 대형 스크린으로, 알코올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히말라야 예술과 이 영화들이 무슨 관계냐고 묻는다면, 몇 개의 고리에 걸친 설명이 가능한데 지면 관계상 생략한다).
뉴요커를 위한 맞춤 박물관 같은 이곳이, ‘뭔가 있어 보이는 것들’을 모아놓은 듯 사이비의 분위기가 풍긴다고 말한다면, 맞는 말이다. 중요한 건 그런 것들에 끌리는 사람들이 있고, 이를 매력적으로 포장하는 기술을 이곳의 많은 박물관들은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화관광부’가 따로 없는 미국에서 모든 박물관은 경쟁을 통해 주어지는 각종 보조금으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충당한다. 이 무한 경쟁에서 이용객 수는 무엇보다 중요한데, 가능한 모든 방식이 창의적으로 동원된다. 카페의 샌드위치 때문에, 술 마시면서 영화를 보기 위해, 혹은 기념품 가게 때문에 특정 박물관을 찾기도 한다는 걸 잊지 않는다는 얘기다. 누구나 ‘그들 각자의 박물관’을 각자의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도시, 뉴욕의 비결이다.
오정연 자유기고가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농지 전수조사’ 준비 착수…매각명령, 매해 1000명서 대폭 늘 듯

박정훈, ‘항명’ 기소 군검사 재판서 “권력의 사냥개들” 비판
![[단독] “새벽 2시 출근” 강동구 26살 청소노동자, 일자리 잃고 거리로 [단독] “새벽 2시 출근” 강동구 26살 청소노동자, 일자리 잃고 거리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5/53_17720019159043_20260225502317.jpg)
[단독] “새벽 2시 출근” 강동구 26살 청소노동자, 일자리 잃고 거리로

동사무소 직원 ‘점 하나’ 실수로 남동생이 남이 되었다

3차 상법개정안 통과…‘자사주 소각 의무화’ 증시 더 달굴 듯

국힘, 지방선거 1·2호 인재 영입…손정화 회계사·정진우 원전엔지니어

피해자들은 왜 내 통장에 입금했을까

스케이트 날이 휘면 다시 펴서…아픈 누나 곁 엄마에게 메달 안긴 아이

쉬지 말고 노세요…은퇴 뒤 ‘돈 없이’ 노는 법

“이 대통령, 어떻게 1400만 개미 영웅 됐나”…외신이 본 K-불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