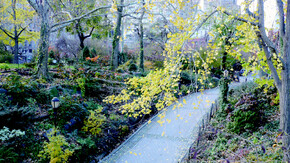〈뉴욕, 아이 러브 유〉
“내가 뉴욕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모두가 어딘가에서 떠나온 사람들이라는 거.” -이자벨, 중에서
뉴욕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한 나의 대답은 이자벨과 명백히 다르지만, 이 도시 거주민의 상당수가 외지인이라는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어디에서 왔는지,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여기에 살게 되었는지, 현재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대한 질문은 가장 일반적인 뉴욕식 통성명이다. 그리고 최소 2년 이상, 공부가 아닌 이유로 뉴요커가 되었다는 이들의 대답에 섞인, 미묘하게 득의양양한 뉘앙스 역시 일반적이다. 여기에 첼시를 비롯해 웨스트빌리지, 이스트빌리지 등 뒤에 빌리지가 붙은 ‘힙’한 동네에 살고 있다는 팩트까지 덧붙여지면 금상첨화. 이곳 사람들만큼 특정 도시 ‘거주민’이라는 자의식으로 무장한 이들도 흔치 않다.
엄연한 뉴욕 거주민으로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영화가 개봉했다. . 그저 직접 경험한 현실과는 전혀 거리가 먼 샤방샤방한 뉴욕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감상하면서 마음껏 자학하겠다는 애초의 목표와 달리, 왠지 할 말만 많아지고 말았다. 고작 두 달 전, 공부라는 촌스럽고 막중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JFK공항에 도착했으며, ‘힙’ 또는 ‘쿨’ 등 한 음절짜리 세련된 형용사와는 저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몸이지만 말이다.
양쪽에서 차문을 열고 먼저 도착했다고 우기는 이들의 실랑이가 일반적인 뉴욕 택시의 특징을 나름 포착한 첫 장면은 귀여웠다. 안 막히는 길로 가야 한다면서 이들이 언급하는 너무나 익숙한 거리의 이름들도 왠지 반가웠다. 그러나 거기까지.
한국 뮤직비디오 화면을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도시를 스케치하는 지루한 몽타주 컷에서부터 불길함은 시작됐다. 할렘까지는 올라가지도 않고 센트럴파크 남쪽 맨해튼을 벗어날 줄 모르는 로케이션은 진부했다. ‘다양한 인간 군상을 만날 수 있는 도시’에 대한 찬사를 말로만 늘어놓을 땐 살의마저 느껴졌다. 모든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백인, 엄밀히 말하면 히스패닉계를 제외한 코카시안들이고, 가뭄에 콩 나듯 등장한 아시안은 매춘부 아니면 차이나타운 약재상에서 식물처럼 일하는 소녀다. ‘러시아 혹은 인도계는 택시 운전, 한국인은 델리 혹은 세탁소, 중국인은 식당, 모든 도어맨과 마트의 계산원은 흑인 혹은 히스패닉 혹은 동유럽계’라는 공식을 벗어날 줄 모르는 노골적인 뉴욕식 계급사회를 반영한 게으르고 악의적인 무의식이라고 볼 수밖에.
서울에서 이 영화를 봤더라도 분노는 마찬가지였을까. 결과는 비슷해도, 이유는 달랐으리라. 외지에서의 삶을 꿈꾸게 하는 것은 도시의 ‘낯선’ 매혹이지만, 막상 그곳에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건 적당히 ‘익숙한’ 일상이다. 여기서 일상이란, 반드시 거주해야지만 생기는 무언가를 말하는 건 아니다. 한 도시의 은밀한 장단점에 대해 각각 10가지 이상의 디테일하고 남다른 리스트를 만들 수 있으면 된다. 혹은 그 정도면 한 도시를 향해 ‘아이 러브 유’를 외칠 자격이 생긴다. 도시를 알아가는 것과 사람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사랑하게 되는 것은 놀랄 만큼 비슷하다. 제아무리 매력적인 사람이라도 피상적인 찬사만 늘어놓으면서 ‘베프’가 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오정연 자유기고가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임은정, ‘한명숙 사건’ 소환해 백해룡 저격…“세관마약 수사, 검찰과 다를 바 없어”
![[단독] 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집행 못 했다…남은 5일은? [단독] 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집행 못 했다…남은 5일은?](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6/53_17720869463045_20260226502791.jpg)
[단독] 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집행 못 했다…남은 5일은?

국힘 지지율 17% “바닥도 아닌 지하”…재선들 “절윤 거부에 민심 경고”

‘재판소원 육탄방어’ 조희대 대법원…양승태 사법농단 문건 ‘계획’ 따랐나

조희대, ‘노태악 후임’ 선거관리위원에 천대엽 내정

박정훈, ‘항명’ 기소 군검사 재판서 “권력의 사냥개들” 비판

이 대통령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하게 할 것”

동사무소 직원 ‘점 하나’ 실수로 남동생이 남이 되었다

러시아 “돈바스 내놓고 나토 나가”…선 넘는 요구에 우크라전 종전협상 ‘난망’

기초연금 개편, 차등 지급·수급자 감축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