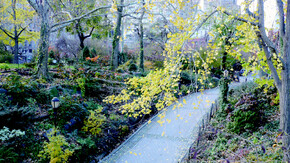뉴욕 마라톤대회
11월의 첫날, 달리기 좋은 날이었다. 아이들은 “트릭 오어 트리트”를 외치며 사탕을 ‘삥 뜯고’ 어른들은 일탈 의상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핼러윈이 도시를 훑고 지나간 다음날, 혹은 ‘데이라이트 세이빙’ 기간이 끝나 얼결에 1시간을 얻은 듯 기분이 좋았던 밤이 지난 직후. 뉴욕 마라톤대회가 열렸다. 마라톤 풀코스 도전은 물론 풀코스 경기 관람조차 해본 적이 없었고, 주변에 마라톤은 물론 조깅조차 도전하는 자가 없었지만, 달리는 이들을 응원하기엔 완벽한 날이었다. 스테이튼 아일랜드에서 출발해 브루클린을 지나 맨해튼을 거슬러 올라 브롱크스까지 이른 뒤 센트럴파크를 따라 내려와 공원 남쪽에서 마무리되는 코스가 바로 집 앞을 지나고 있었다. 무엇보다, 친구의 친구인 조너선이 생애 처음으로 마라톤 풀코스에 도전하는 날이었다.
조너선의 친구, 조너선의 친구의 친구들이 모여 응원전을 펼치려던 곳은 코스의 3분의 2를 약간 지나 물이 제공되는 18마일 지점, 1번 애비뉴와 96번 스트리트가 만나는 곳이었다. 작은 라디오 방송사에서 프로모션을 담당하는 그는 이날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착실하게 훈련에 임했다(고 한다). 훈련 기록에 따르면, 대략 낮 12시께 그곳을 통과할 예정이었다. 오전 10시45분께 모인 우리는 미리 출발한 핸드사이클 선수들과 여자 선수들을 응원하며 몸을 풀었다.
11시20분을 지나자 선두그룹이 지나갔고 40분을 지나자 인파가 몰려들기 시작했다. 사진 블로그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느라 연방 디지털카메라(DSLR) 셔터를 눌러대던 댄이 뷰파인더에서 눈을 뗐고, 의 포토에디터로 일하며 저널리즘 석사 과정에 다니느라 수업 전 읽을거리를 손에서 놓지 않던 에밀리도 교재를 가방에 넣었다. “우리 정말 이 사람들 사이에서 조너선을 알아볼 수 있는 거야?” “무조건 키 크고 마른 남자애를 찾으면 돼.” 그런데 96번가를 달리는 이들 중 절반이 키 크고 마른 남자였다! 그렇게 우리는 그를 놓쳤다. 대신 웃통을 벗어젖힌 채 자신의 이름을 가슴 근육 한복판에 써넣고 달리던 제임스와 미니마우스 분장을 한 채 18마일을 내달린 중년의 일본 남자, 달리는 것만으로도 숨차 보이는 와중에 디카를 꺼내 마라톤 행렬을 찍어대던 백발의 러너를 응원한 뒤, 후반 코스인 5번 애비뉴로 자리를 옮겨 조너선을 기다리기로 했다.
‘대체, 어째서, 왜!’ 고생을 사서 하느냐는 식상한 질문에 대해 그는 “어쩌다 보니 달리는 게 좋아졌고, 하프코스 도전을 마치고 나니 풀코스가 궁금해졌다. 쉽지 않겠지만, 열심히 훈련했으니 완주는 문제없다”고 답하며 배시시 웃었더랬다.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실업자로 1년을 지낸 뒤 다시 일을 시작한 그의 지난 2년은 그 나이 또래 미국 젊은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새로 시작하기를 두려워 않고, 그것을 위해 착실히 단계를 밟아나가되, 모든 도전과 훈련을 즐기는 못 말리는(?) 낙천주의는 여기서는 일반적이지만, 나에게는 왠지 낯설었던 미덕 중 하나. 뉴욕의 구석구석을 달리며 막바지 가을을 만끽하기 위해 1년 넘게 준비해왔을 수많은 러너들을 내가 응원한 게 아니라, 그들로부터 내가 힘을 얻은 셈이었다.
P.S. 조너선의 첫 번째 마라톤 풀코스 기록은 3시간30분. 중간에 쥐가 나는 바람에 걸어야 했기에 애초의 예상 기록보다 길어졌음을 감안해(줘)야 한다.
오정연 자유기고가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이재명 대선후보 자격 박탈’ 향해 초스피드 질주한 조희대 코트

국방부, 장군 아닌 첫 국방보좌관 임명 나흘만에 업무배제

‘체급’ 다른 이란…통제 불능 장기전도 부담, 미 지상군 투입 회의적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팔리나…홍익표 “사겠다는 사람 나와”
![가슴 치며 ‘검은 연기’ 보지 않으려면…어떻게 할 것인가 [아침햇발] 가슴 치며 ‘검은 연기’ 보지 않으려면…어떻게 할 것인가 [아침햇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3/53_17725196285494_20260303502471.jpg)
가슴 치며 ‘검은 연기’ 보지 않으려면…어떻게 할 것인가 [아침햇발]

SK하이닉스 15.5%↓ 삼성전자 14.1%↓…애프터마켓서 하락폭 커져
![[사설] 노태악 후임 대법관 제청 안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설] 노태악 후임 대법관 제청 안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2/53_17724442937947_20260302502331.jpg)
[사설] 노태악 후임 대법관 제청 안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노조 “조희대 사퇴하라…국민의 정치적 선택권 뺏으려해”

‘이란 공습’에 장동혁 “김정은의 미래” 박지원 “철렁해도 자신감”
![악마화하지 마라 [그림판] 악마화하지 마라 [그림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303/20260303503624.jpg)
악마화하지 마라 [그림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