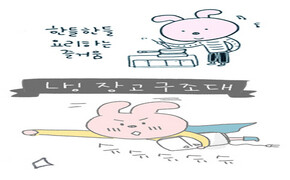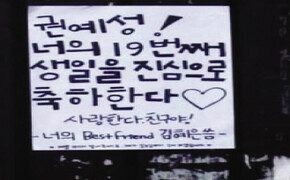“돌 쌓는 사람 찾았어!” 얼마 전, 친정에 가신 어머니가 제보 전화를 해왔다.
나의 외가는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다수리. 어머니 말씀에, 전쟁의 포화도 비켜갔다고 하니 ‘동막골’ 옆 동네쯤 상상하면 비슷하려나. 예로부터 청정 쌀과 고랭지 채소를 재배해온 평화롭고 한적한 농촌인데, 몇 년 전 논밭 한가운데로 2차선 도로가 뚫렸다. 그림 같은 시골 마을 정경이 망가져서 아쉬운 건 1년에 한두 번 놀러가는 사람의 한가한 생각이고, 마을 사람들에겐 고맙고 유용한 길이다.

돌 쌓는 사람 전희택씨. 김송은
그래서인지 새로 생긴 도로 옆, 마을 어귀에 다수리를 홍보하는 조형물을 설치했다. 동글동글한 강돌을 쌓아 만든 돌탑 여러 개와 ‘다수리 강변마을’이라 새긴 커다란 바위, 거기다 그 위에 살포시 올라앉은 강아지까지. 프로의 솜씨는 아닌데, 내공과 집념이 느껴졌다. 그걸 보곤 “저거 만든 사람 만나보고 싶다”고 지나가듯 말했는데… 딸내미가 무려 시사주간지에 (손바닥만 해도) 글을 싣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실뿐더러 자랑까지 일삼으)시는 어머니는 ‘그분’을 찾아 섭외까지 다 해놓고 다짜고짜 나를 다수리로 불러내렸다.
그렇게 찾아간 전희택(70)씨의 집 마당에 들어서자 탄성이 나왔다. 둥근 탑, 네모난 탑, 꼬불꼬불한 탑, 돌로 만든 티테이블, 말, 곰, 매 같은 형상에 괴석까지 마당 양옆에 늘어선 크고 작은 조형물이 100개, 아니 200개도 넘을 것 같았다. 마루에 앉아 유리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돌탑 사이로 해가 지고 있다. 아, 이것이 신선놀음이로구나.
“농사지어봐야 골만 빠져서” 60살에 은퇴한 전희택씨는 평창에서 제일 아름다운 집을 만드는 게 꿈이다. 40대부터 괴석을 모았는데, 성이 안 차 특이한 걸 만들어보고 싶어 10년 전 돌탑을 만들기 시작했다. 여름엔 서울 사람들이 와서 구경도 많이 한다고. 담벼락에 ‘무인카메라 작동 중’이란 글귀가 붙어 있어, 정말 있는지 묻자 엄포용이라고 한다.
재료로 쓰는 돌은 원당·미탄·다수 등 인근 강과 산에서 모아 경운기에 싣고 온다. 2.5m 높이에 지름 50cm 정도의 돌탑을 쌓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의외로 하루. 하루 돌 줍고, 하루 쌓는 식이다. 저걸 어떻게 다 만들었는지 묻자, “머리를 쓰면 쉬워. 동그란 탑 있잖아. 그건 플라스틱 바가지 바닥을 뚫어서 그 모양대로 돌을 죽 돌려 붙이면 된다고. 안에는 세멘(시멘트)으로 바르지. 반쪽씩 만들어서 딱 붙이면 동그랗게 된단 말이야. 그걸 위로 쌓으면 저리 되는 거지.” 돌탑 만드는 게 소문이 나 최근에는 이웃 기화리까지 가서 둘레 8m, 높이 3m짜리 탑을 쌓아줬다. 경운기로 5~6대 분량의 돌이 들어가는 대공사였다.
“힘들지. 그래도 이쁘니까. 이쁘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멀리 가도 사방 살핀다고. 물가고 어디고, 돌 없는지.” 왜 그렇게 돌이 좋을까. “변하지 않잖아. 목숨이 없으니 수백 년 놔둬도 무궁무진 간다고.” 호랑이가 가죽을 남기는 것처럼 전희택씨는 돌탑을 남길 요량이다. “인생이, 사는 게 가져갈 게 없어. 밥 먹고 살면 되는 거야. 빚 안 지고 열심히 살다 가면 되지.”
김송은 만화월간지 기자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트럼프 “이란 작전 2~3일 내 종료할수도”…장기전·외교 재개 모두 열어둬

트럼프의 공습 ‘이란 정권교체’ 가능할까…중동 장기광역전 우려

범여권 주도 ‘사법 3법’ 완료…‘법원행정처 폐지’ 추가 입법 만지작

트럼프, 이란 국민에 “우리 작전 끝나면 정부 장악하라”

동사무소 직원 ‘점 하나’ 실수로 남동생이 남이 되었다

송언석, 천영식 8표차 부결에 “당 의원 일부 표결 참여 못해, 사과”

장동혁 “2억 오피스텔 보러도 안 와…누구처럼 똘똘한 한 채 아니라”

“이란, 카타르·쿠웨이트·UAE·바레인 미군기지·예루살렘에 미사일”

이 대통령 “개 눈에는 뭐만”…‘분당 아파트 시세차익 25억’ 기사 직격
![왜 부자는 수돗물을 마시고 가난한 사람이 병생수 마실까 [.txt] 왜 부자는 수돗물을 마시고 가난한 사람이 병생수 마실까 [.txt]](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7/53_17721459993113_20260226504293.jpg)
왜 부자는 수돗물을 마시고 가난한 사람이 병생수 마실까 [.t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