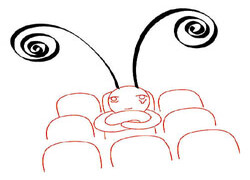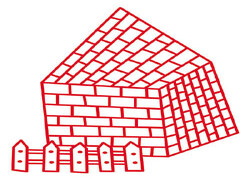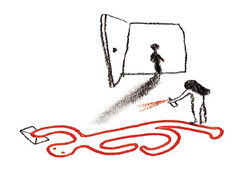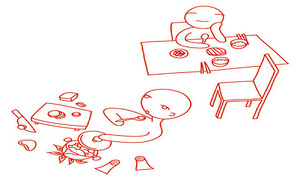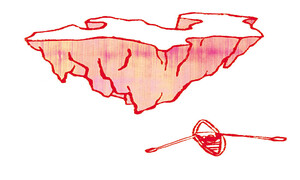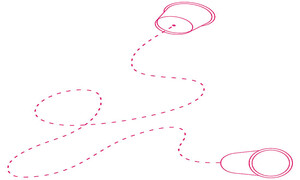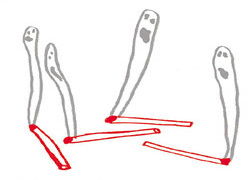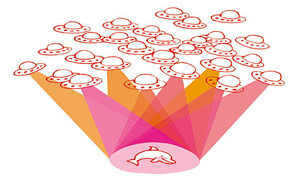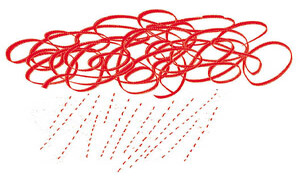[겸이 만난 세상]
▣ 겸/ 탈학교생 queer_kid@hanmail.net

소록도를 떠나기 하루 전, 가장 정이 들었던 할아버지께서 평생의 소원을 말씀하셨다. 한센병을 앓고 절망한 채 15살에 집을 나와 떠돌다 평생을 소록도에서 지낸 그는 가족과 연락이 끊긴 지 오래지만, 죽기 전에 고향 땅을 밟고 싶다는 말이 애잔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았다. 차를 가진 한 자원봉사자와 연결해주고 할아버지께 고향에서 맛있는 거라도 사드시라고 가진 돈을 몽땅 털어 드렸다. 서울로 돌아온 뒤 전화를 하니 그곳의 관리자가 다짜고짜 “이 새끼야, 일을 이 따위로 만들어”라는 말로 시작해 한 시간 동안 나를 질책했다.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그 사람은 보호자가 아닌 이상 환자와 함께 외출시킬 수 없다며 자신에게 한마디 의논도 없이 떠난 것에 화가 난 상태였다. 날 질책하고 심판하는 듯한 어조는 납득할 수 없었지만, 내 잘못이 무엇인지 이해했다. 내 제안을 흔쾌히 승낙했던 자원봉사자도 당황스러워하고, 관리자는 내게 분노에 가까운 울분을 토했다. 무엇보다 고향에 갈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었던 할아버지의 소원을 부득이하게 지키지 못한 상황이 자신을 책망하게 했다.
서울에 오고 나서 벌어진 악몽 같은 상황은 이뿐만 아니었다. 여행을 떠나기 전 더 이상 휴대전화를 쓰지 않기로 마음먹고 전화기가 고장난 친구에게 기계를 주었다. 그런데 가입자명이 엄마의 이름으로 되어 있던 터라 해지할 수 있는 사람도 본인뿐인데, 엄마는 내가 종종 그랬던 것처럼 연락을 두절하고 다시 어디론가 사라져버릴까 두려워하여 해지를 하지 않고 있었다. 해지해달란 부탁에 “이제 그만 방황하고 집으로 돌아와”라는 대답만 반복하는 엄마와 빨리 휴대전화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친구 사이에 끼어 어쩔 줄 몰랐다. 좋은 마음에 시작한 일들이지만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려 그 틈에 낀 나 혼자 나쁜 놈이 되었다.
소록도에서 서울로 돌아온 뒤 일주일 동안 한해 최악의 일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친 듯했다.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려 경찰서에 잡혀가 오물투기죄로 딱지를 떼고, 한 교육토론회 자리에 부패널로 섭외된 줄 알았더니 하루 전날 주패널로 섭외된 사실을 알고 당황스러웠고, 같이 살려던 친구와 약속이 파기되고 당장 내일 떠나야 함에도 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 결정적으로 가장 친한 친구와 크게 싸우고, 소중하다 생각해왔던 한 친구가 날 앞에 두고 자신에게 난 아무런 존재도 아니란 말을 던졌을 때 한순간에 무너져버렸다.
무너져내리고 나니 내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해야 했다.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은 영화도, 글도, 정신과 치료도 아니었다. 짐을 싸고 친구네 집을 도망치듯 나와 이유 없이 강원도로 가려 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도망치듯 사는 삶을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날 자신의 공허를 화려한 파티로 달래려 했던 댈러웨이 부인(버지니아 울프의 소설 )처럼 된장찌개를 끓이고 고기를 굽고 찜을 한 뒤 저녁상을 준비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난 쿨하지도 못하지만 미치지도 않았다. 인생이 조금 꼬였을 뿐이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동사무소 직원 ‘점 하나’ 실수로 남동생이 남이 되었다
![[단독] “새벽 2시 출근” 강동구 26살 청소노동자, 일자리 잃고 거리로 [단독] “새벽 2시 출근” 강동구 26살 청소노동자, 일자리 잃고 거리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5/53_17720019159043_20260225502317.jpg)
[단독] “새벽 2시 출근” 강동구 26살 청소노동자, 일자리 잃고 거리로

이 대통령 울컥…고문단 오찬서 “이해찬 대표 여기 계셨다면”

민주당, 법왜곡죄 막판 수정…“위헌 소지 최소화”

스케이트 날이 휘면 다시 펴서…아픈 누나 곁 엄마에게 메달 안긴 아이

피해자들은 왜 내 통장에 입금했을까

“이 대통령, 어떻게 1400만 개미 영웅 됐나”…외신이 본 K-불장

“누가 반대했나 밝혀라”…통합안 보류에 국힘 TK 의원-지도부 충돌

110V 때 지은 은마아파트…“전기화재 늘 걱정, 쥐가 전선 물까봐 무서워”

국회 의장석 앉은 한병도…‘필리버스터 사회 거부’ 주호영 대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