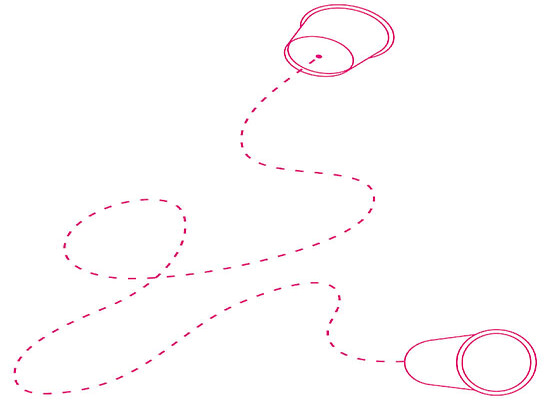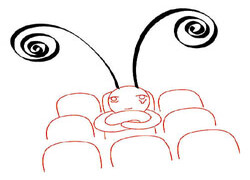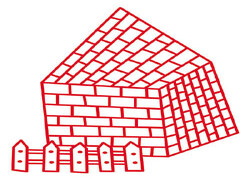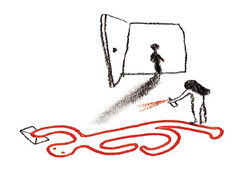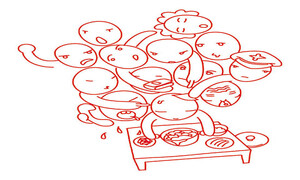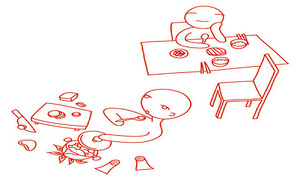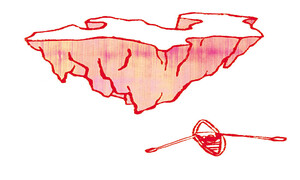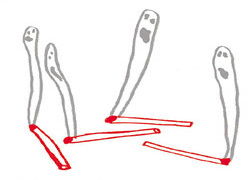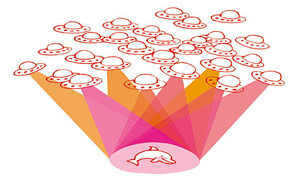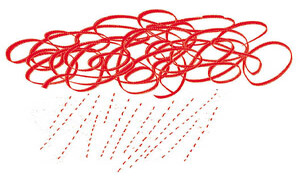[겸이 만난 세상]
▣ 겸/ 탈학교생 queer_kid@hanmail.net
며칠간 나에게 숙식을 제공해줄 청각장애를 가진 친구의 부모님께 행여 실례를 범하진 않을까 친구에게 물었다. “너희 부모님에게 조심해야 될 부분을 가르쳐줘.” 다른 사람들보단 조금 더 장애인들과 지낸 경험이 있지만, 지금껏 청각장애인과는 단 한번도 대화해본 적이 없는 나는 행여 실례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들을 대면하기가 무척 걱정스러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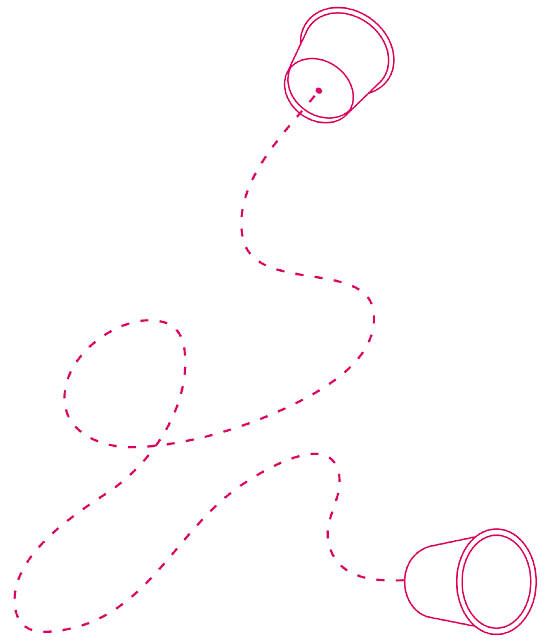
서울에서야 거리에서 종종 장애인들을 만날 수 있지만 내가 부산에 살 때는 일반적으로 장애인을 만나기란 쉽지 않았다. 학교에 다닐 땐 수백명의 학생들 중 왜 장애인이 한명도 없는 것일까, 심지어 사회 교과서마저 장애인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장애인의 삶은 어떠할까 궁금하여 한 성당에서 운영하는 장애 어린이들이 있는 곳에 찾아갔다. 그곳 아이들은 주민들이 동네 환경 망친다는 이유로 쫓겨날 판이어서 성당에 갇힌 채 학교에 다닐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난 장애로 인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일을 했다. 5평이 채 못 되는 비좁은 방에 8명의 개구쟁이들이 있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지능장애를 가졌던 만큼 간단한 덧셈뺄셈을 가르치는 데도 한두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자제력이 그다지 많지 않았던 나는 이름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는 아이들이 답답해 속으로 짜증을 내며 모르면 대충 넘어가버렸다. 그렇지만 집에 돌아가야 할 때면 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내일 또 오세요”라고 애정공세를 퍼붓는 부모 없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애처로워 내 시각으로만 그들을 보았던 졸렬함을 탓하며 몹시 부끄러웠다. 그 뒤 난 적극적으로 찾아나서지 않는 이상 사람들의 시선 밖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장애인과 대화할 수 있기란 쉽지 않음을, 그래서 더욱 장애인과의 소통에 큰 벽이 자리잡고 있음을 씁쓸히 깨달았다.
서울에 와선 중증장애인 운동단체와 일을 하고 몇달간 근육디스트로피 장애를 가진 형과 함께 살면서 활동보조를 했기에 장애인과 좀더 서슴없이 대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때 역시 언어장애를 가진 분들과 대화할 때면 알아듣기 힘든 발음으로 인해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대충 분위기 봐가며 맞장구를 쳤다. 그러던 어느 날 언어장애를 가진 형이 나와 대화하던 도중에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있으면 알아들은 척하지 말고 물어보는 게 예의다”라고 내게 충고했다. 나의 교만한 태도를 알아차리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차에 아차 싶어 그 뒤부턴 모르면 상대방이 귀찮아하더라도 세번이고 네번이고 물어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과 만나거나 대화할 때 인도적인 차원의 이해와 관용이 필요하다고 착각하는 듯하지만, 일상적으로 대면할 수 없는 장애인과 소통하기 위해선 ‘이해한다’는 기만이 아니라 장애인을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무지에 대한 부끄러움의 자각과 성찰이 필요하다.
뒤늦게 친구의 통역 없이 대화가 불가능한 나를 뉘우치며 ‘감사합니다. 밥 잘 먹겠습니다’ 정도의 간단한 수화를 배워 어머님께 표현했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순박한 미소를 지으며 쪽지에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지내’라고 써서 보여주었다. 짧은 대화였지만 정말이지 오랜만에 느끼는 가슴 따뜻한 말이었고 소통이었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박정훈, ‘항명’ 기소 군검사 재판서 “권력의 사냥개들” 비판

‘농지 전수조사’ 준비 착수…매각명령, 매해 1000명서 대폭 늘 듯

동사무소 직원 ‘점 하나’ 실수로 남동생이 남이 되었다

이 대통령 “불법 계곡시설 허위보고한 공직자들, 재보고 기회 준다”

기초연금 개편, 차등 지급·수급자 감축 검토
![[단독] “새벽 2시 출근” 강동구 26살 청소노동자, 일자리 잃고 거리로 [단독] “새벽 2시 출근” 강동구 26살 청소노동자, 일자리 잃고 거리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5/53_17720019159043_20260225502317.jpg)
[단독] “새벽 2시 출근” 강동구 26살 청소노동자, 일자리 잃고 거리로

김정은 “한국, 영원한 적”…미국엔 “평화적 공존도 준비” 대화 손짓

대구 간 한동훈 “출마지 미리 말 안 하겠다…국힘, 막으려 덤빌 것”

‘안귀령 황당 고발’ 김현태, 안귀령에 총 잡혔던 전 부하 생각은?
![이 대통령 지지율 67%, 취임 뒤 최고치…“다주택 정책 잘했다” 62% [NBS] 이 대통령 지지율 67%, 취임 뒤 최고치…“다주택 정책 잘했다” 62% [NBS]](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6/53_17720725126758_20260226501531.jpg)
이 대통령 지지율 67%, 취임 뒤 최고치…“다주택 정책 잘했다” 62% [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