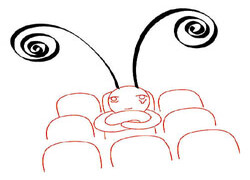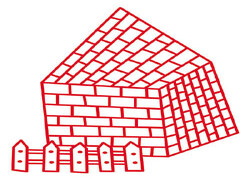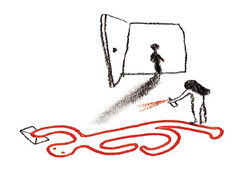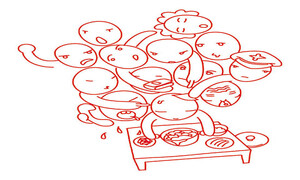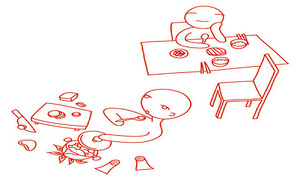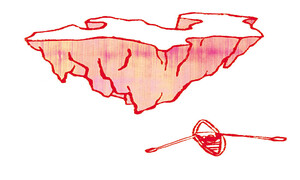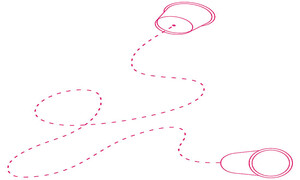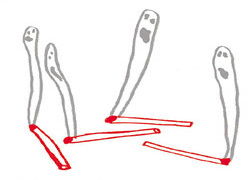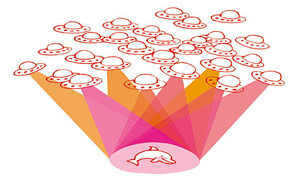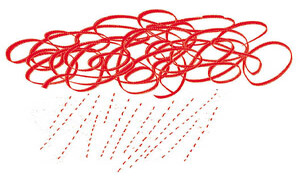[겸이 만난 세상]
▣ 겸/ 탈학교생 queer_kid@hanmail.net
결국 오늘에야 고시원을 떠나게 되었다. 9개월 동안 머물며 ‘나간다’ ‘나갈 거다’ 골백번은 되뇌었던 이곳을 이제야 나갈 수 있게 된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했다. 말하자면 돈 때문이다. 영화를 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난 뒤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냈다. 두달이나 고시원비가 밀려 있던 차에 미치지 않고서야 월 30만원씩이나 숙박비에 지출하는 짓은 계속할 수 없다. 게다가 난 고시원의 문화가 싫었다. 내가 고시원에서 얻은 것이라곤 ‘이웃’에 대한 무관심과 불면증뿐이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 밀린 고시원비를 가까스로 내고 드디어 오늘 짐을 싼다.

하지만 내가 갈 곳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고시원을 나오면 갈 곳이 없어 계속 머무르고 있었는데. 마치 버려진 고아처럼 느껴졌다. 은유가 아니라 정말 갈 곳이 없었다. 난 집이 없다는 것의 의미를 안다. 그것은 부산에 살 때부터 간접적으로 체험했다. 어릴 땐 복잡한 집안 사정으로 인해 매달 구청에서 압류 통보장이 날아왔고, 그때마다 아버진 구청장에게 편지를 써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부탁했다. 조금 철이 들 쯤엔 이곳은 나의 집이 아니라고,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며 잦은 가출을 했다. 정말이지 난 주워온 아이마냥 가족에게 못되게 굴었다.
서울에 와서도 마찬가지였다. 어디에도 내 몸 하나 누일 자리가 없었다.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무려 5번의 이사를 했다. 처음엔 알던 대학생 선배의 좁아터진 단칸방 하숙집에서 지냈다. 그 뒤 서울에서 알게 된 트랜스젠더와 살았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몸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의 활동 보조를 하며 일자리를 잠자리로 삼았고, 자식을 군대에 보낸 한 과부의 집에서 지내다 쓰러져 2주간 병원에서 지냈다. 병원을 나온 뒤 올해 초 고시원에 들어왔다. 여러 집을 떠돌며 신세를 졌지만 그 어디에도 편히 쉴 곳은 없었다. 어느 공간에서나 난 그저 잠시 있다 떠날 방문객일 뿐이었다. 어처구니없게도 난 외국인 노동자의 삶에서 집 없이 떠도는 초라한 자신을 본다. 집이 없다는 것보다 더 사람을 절박하게 만드는 것은 다시 돌아갈 곳조차 없다는 것이다. 돌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수 없는. 남한의 체제는 무책임하게 그들을 강제 추방하려 했지만 그들에겐 돌아갈 곳이 없으므로 돌아갈 수 없다. 돌아가야 할 곳엔 타국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는 자신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난 아직까지 가족을 책임지고 부양하지도 않을뿐더러 시사주간지에 미천한 글 따위로 하고 싶은 말이라도 뱉어낼 수 있다. 하지만 나 또한 머물 집도 돌아갈 곳도 없다. 이미 부산의 집은 내가 갈 곳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이것은 배부른 소리가 아니다. 내게 ‘10대는 가출이지만 20대는 독립이다’라는 광고 카피가 무색하게 들린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독립은 나이에 상관없이 돈이 없거나 돌아갈 집이 없으면 알아서 되기 마련이다.
지금 짐을 싸고 있지만 서울 어디에도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여기 또한 내가 있을 곳은 아니므로 떠나야 한다. 갈 곳이 없을 땐 스스로 길을 잃어버리는 수밖에 없다. 아는 것 하나 없는 어딘가로.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박정훈, ‘항명’ 기소 군검사 재판서 “권력의 사냥개들” 비판

‘농지 전수조사’ 준비 착수…매각명령, 매해 1000명서 대폭 늘 듯

동사무소 직원 ‘점 하나’ 실수로 남동생이 남이 되었다

이 대통령 “불법 계곡시설 허위보고한 공직자들, 재보고 기회 준다”

기초연금 개편, 차등 지급·수급자 감축 검토
![[단독] “새벽 2시 출근” 강동구 26살 청소노동자, 일자리 잃고 거리로 [단독] “새벽 2시 출근” 강동구 26살 청소노동자, 일자리 잃고 거리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5/53_17720019159043_20260225502317.jpg)
[단독] “새벽 2시 출근” 강동구 26살 청소노동자, 일자리 잃고 거리로

김정은 “한국, 영원한 적”…미국엔 “평화적 공존도 준비” 대화 손짓

대구 간 한동훈 “출마지 미리 말 안 하겠다…국힘, 막으려 덤빌 것”

‘안귀령 황당 고발’ 김현태, 안귀령에 총 잡혔던 전 부하 생각은?
![이 대통령 지지율 67%, 취임 뒤 최고치…“다주택 정책 잘했다” 62% [NBS] 이 대통령 지지율 67%, 취임 뒤 최고치…“다주택 정책 잘했다” 62% [NBS]](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6/53_17720725126758_20260226501531.jpg)
이 대통령 지지율 67%, 취임 뒤 최고치…“다주택 정책 잘했다” 62% [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