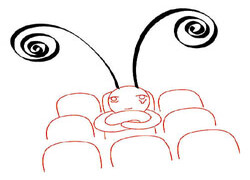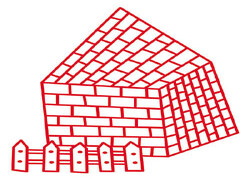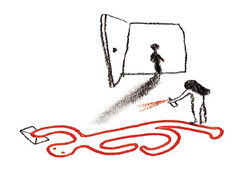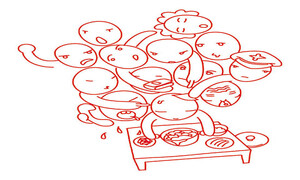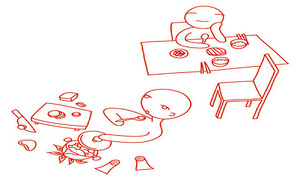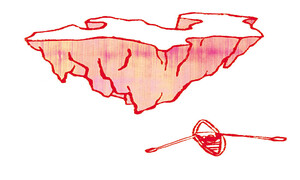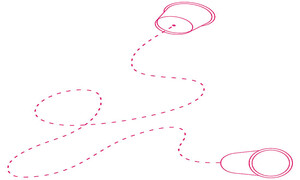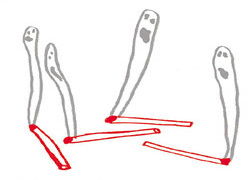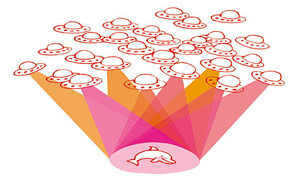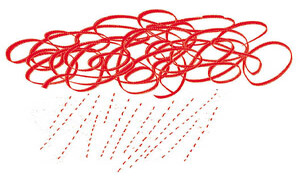[겸이 만난 세상]
▣ 겸/ 탈학교생 queer_kid@hanmail.net

도보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과 중 하나는 낮잠 자는 일이다. 그저 촌의 너저분하고 까칠한 땅바닥이지만 주저앉아 한참 햇빛을 받다 제풀에 쓰러져 배낭을 베개 삼아 낮잠을 청하면 논에서 불어오는 살랑 바람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산과 들이 어우러진 평화로움을 상상했던 촌의 풍경은 쿵쾅거리는 포클레인이 만들어내는 매캐한 연기와 온통 깎고 엎어 개발 중인 삭막함으로 뒤덮여 있었다.
서울에 살 땐 서울시 전체가 공사판이라고 느꼈지만 도보를 하며 남한땅 전체가 공사판임을 깨달았다. 되도록 개발이 되지 않은 곳을 둘러보려 했지만, 공장지대가 들어서고 아스팔트 도로와 다리를 놓고 콘크리트 건물을 세우는 도시화의 풍경은 시, 군, 촌의 작은 마을을 가리지 않고 어딜 가나 마찬가지였다. 남해안을 따라 걷다 보니 어디에서나 마주할 수 있는 비슷비슷한 풍경이었다. 때문에 걸으며 ‘짜증나’ ‘지겨워’를 골백번은 지껄였던 것 같다.
여행을 하며 한 가지 더 깨달은 점은 지금의 종교인에게는 믿음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무전여행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잠자리 구하기다. 난 단순히 “안 되면 교회나 절에서 자지, 뭐” 하는 심정이었다. 조금만 걷다 보면 교회의 십자가나 절의 마크인 만(卍)을 발견하긴 쉬웠지만 하룻밤 묵기 위해 목사님과 스님을 만나면 “요즘 같은 세상에 떠돌이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란 말을 듣게 되고 단번에 내쫓긴다. 틀린 말도 아니지만, 사람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설파하는 종교인을 존경하던 차에 문전박대는 꽤나 충격적이었다. 종교의 가르침과 종교인의 삶은 확연히 달랐고 요즘 종교는 교도를 늘려 자기 배 불리는 데만 애쓰는 것 같았다.
물론 일부지만 좋은 사람들도 만났다. 함안의 읍곡마을 절에서 퇴짜를 맞고 야밤에 어디서 자야 할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한 할머니께서 고맙게 선뜻 도시로 간 아들의 빈방을 내주었다. 간밤에 저녁을 먹을 때 한국전쟁 당시의 기억을 토로하며 “끔찍했지. 서울 그걸 초토화시키고…. 북한이 한 핏줄이라지만 북한은 우리의 적이야. 어휴.”라고 연신 얼굴을 찡그리시는 할머니 앞에서 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게 타인의 삶은 어떤 정치적 메시지보다 강렬하게 다가온다. 그리고 진주의 솔티마을에서 재워주신 아버지뻘 되는 아저씨께선 나를 ‘아가’라고 부르며 귀여워했다. 머리를 어깨까지 길러 도인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던 그는 자기는 인생을 쓸모없는 짓거리에 허비했다며 내게 사람을 도우며 살라고 말해주셨다. 밤에는 나를 위해 차를 타고 도시로 나가 저녁을 사주시기도 했다.
이 여행에서도 마찬가지로 희망과 절망을 안겨주는 것은 적막한 길, 삭막한 촌의 풍경, 굶주림 따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인연의 스침이었다. 순천시쯤에 접어들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은 인간적인 사람들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해남반도로 갈까 진도로 갈까 고민하던 중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소록도로 발걸음을 돌렸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동사무소 직원 ‘점 하나’ 실수로 남동생이 남이 되었다
룰라 ‘새끼손가락 없는 맞춤장갑’ 받고 미소…뭉클한 디테일 의전

트럼프 “관세 수입이 소득세 대체할 것…더 강력한 수단 쓰겠다”

스케이트 날이 휘면 다시 펴서…아픈 누나 곁 엄마에게 메달 안긴 아이

주한미군 사령관, ‘한국에 미-중 전투기 대치 사과’ 전면 부인

“누가 반대했나 밝혀라”…통합안 보류에 국힘 TK 의원-지도부 충돌

이 대통령 “농지매각 명령이 공산당? ‘경자유전’ 이승만도 빨갱이냐”

피해자들은 왜 내 통장에 입금했을까

전한길, 반말로 “오세훈 니 좌파냐?”…윤어게인 콘서트 장소 제공 압박

이 대통령 울컥…고문단 오찬서 “이해찬 대표 여기 계셨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