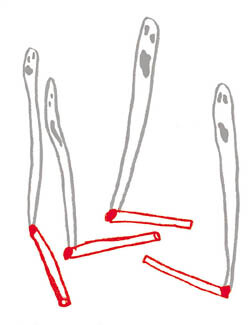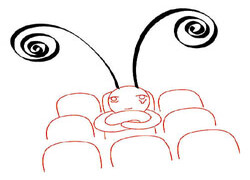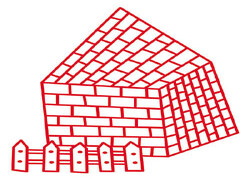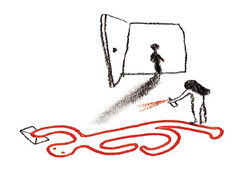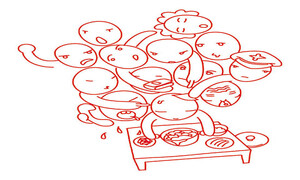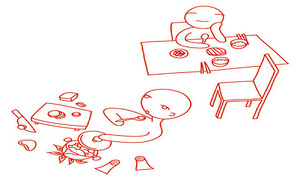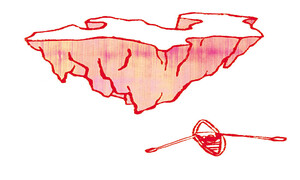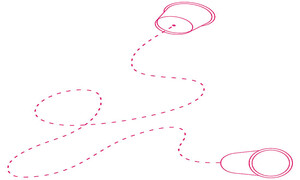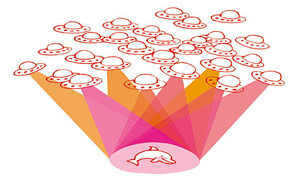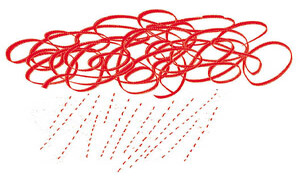[겸이 만난 세상]
▣ 겸/ 탈학교생 queer_kid@hanmail.net
애초 난 담배에는 관심이 없었다. 세상에 대한 지독한 경멸과 약간의 겉멋에 빠져들어 아나키즘 사이트를 들락날락하던 2년 전, 지리멸렬한 삶에 새로움을 불러일으킬 환각제를 발견했다. 아나키즘 사이트를 운영하던 사람의 개인 홈페이지 한켠에 각종 마약에 관련된 정보가 있었다. “이곳에 들어온 뒤 당신의 삶은 파괴될 수 있다”는 섬뜩한 문구에 지레 겁먹고 창을 닫을 수도 있었지만 그 나이 때 무서울 게 무엇이 있었겠는가. 되레 마리화나같이 야생식물에서 채취한 환각제는 담배나 코카인 같은 화학공정을 거친 약품보다 중독성이 적고 건강의 측면에서도 낫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능력하기만 한 골초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난 온 집안에서 폴폴거리는 담배에 대한 적개심으로 어릴 적 누구나 호기심으로 한번은 해봄직한 담배에 손을 대본 적이 없었다.

그런 내게 마리화나는 일상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게 해줄 환각제의 판타지를 대신했다. 게다가 그것은 68혁명과 같이 젊음과 저항의 상징이었고 같은 영화의 청춘들은 언제나 약물을 빨아대고 있지 않던가!(물론 이때의 감수성이란 반쯤의 역겨움과 나머지는 ‘후까시’지만) 그러나 한국에서 마리화나를 구할 길은 쉬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의 집에서 마리화나 파티를 한다는 메시지를 받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갔다. 하지만 마리화나를 하면 6개월간 혈액에 남는다는 말을 듣곤, 며칠 뒤 혈액 채취를 해야 할 약속이 잡혔던지라 결국 허탕을 치고 말았다.
그 뒤 내가 담배를 물게 된 것은 서울에 와서 도시 변두리에 살 때였다. 영화를 한답시고 서울에 올라왔지만 몇달이 지나도록 카메라 구경 한번 해보지 못하고 내키지 않는 아르바이트 따위를 전전하던 시절, 드라마틱하게 과장된 절망감은 감히 손대지 않았던 담배를 피우게 했다. 난 처음 담배를 피웠던 때를 생생히 기억한다. 룸메이트의 담배와 라이터를 들고 동네 주변을 떠돌다 길바닥에 주저앉아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다. 처음엔 연기를 빨아들이지 못하고 입 안에만 맴돌았는데, 이내 숨을 깊게 마시며 연기를 들이켰다.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지만 온몸이 나른해지고 온갖 잡념들로 복잡한 머리가 조금은 편안해졌다. 몇 모금 더 빨아댄 뒤 불을 끄고 일어났더니 머리가 어질했다. 마치 이래저래 꼬이기만 하는 삶을 위로하듯 세상이 나를 대신해 뱅뱅 돌았다. 담배가 말했다. 인생은 원래 그런 거라고. 그제야 비로소 아버지가 왜 그리도 담배를 피워대며 연거푸 한숨을 내뱉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가벼운 각성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허브향이나 맡으며 웰빙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각종 의학적 사실을 내세워 흡연의 폐해를 설파하지만 난 그것들을 전연 믿지 않는다. 국가 독점으로 담배를 생산할 땐 언제고, 담뱃값 500원 인상해서 국민건강복지와 금연 캠페인에 보탠다니 우습고도 우습다. 가난한 마음을 위로하는 삶의 마약마저 빼앗기 전에, 스트레스에 치여 살아가는 사람들부터 구제해야 하지 않나.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이 대통령 “개 눈에는 뭐만”…‘분당 아파트 시세차익 25억’ 기사 직격

민주 “응답하라 장동혁”…‘대통령 집 팔면 팔겠다’ 약속 이행 촉구

이준석-전한길 ‘끝장토론’…“25년간 극비로 부정선거 구축” 황당 주장
![왜 부자는 수돗물을 마시고 가난한 사람이 병생수 마실까 [.txt] 왜 부자는 수돗물을 마시고 가난한 사람이 병생수 마실까 [.txt]](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7/53_17721459993113_20260226504293.jpg)
왜 부자는 수돗물을 마시고 가난한 사람이 병생수 마실까 [.txt]

일본, 이제 ‘세계 5대 수출국’ 아니다…한국·이탈리아에 밀려나

이진숙 “한동훈씨, 대구에 당신 설 자리 없다” 직격

“초상권 침해라며 얼굴 가격”…혁신, 국힘 서명옥 윤리특위 제소 방침

홍준표, 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맞장구…“부동산 돈 증시로 가면 코스피 올라”

박정훈, ‘항명’ 기소 군검사 재판서 “권력의 사냥개들” 비판

러시아 “돈바스 내놓고 나토 나가”…선 넘는 요구에 우크라전 종전협상 ‘난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