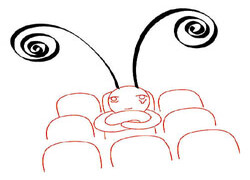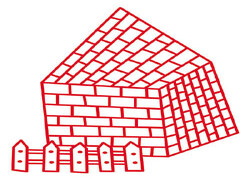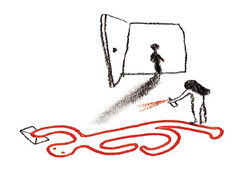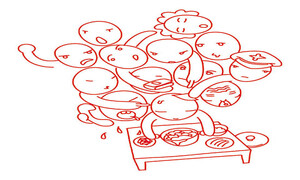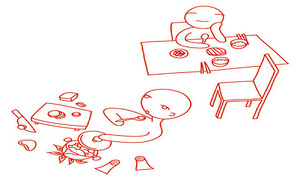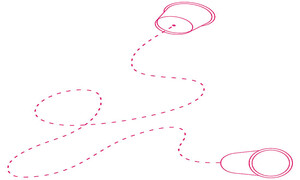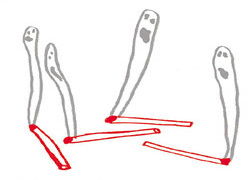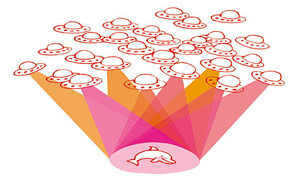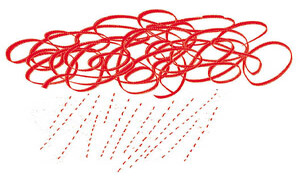[겸이 만난 세상]
▣ 겸/ 탈학교생 queer_kid@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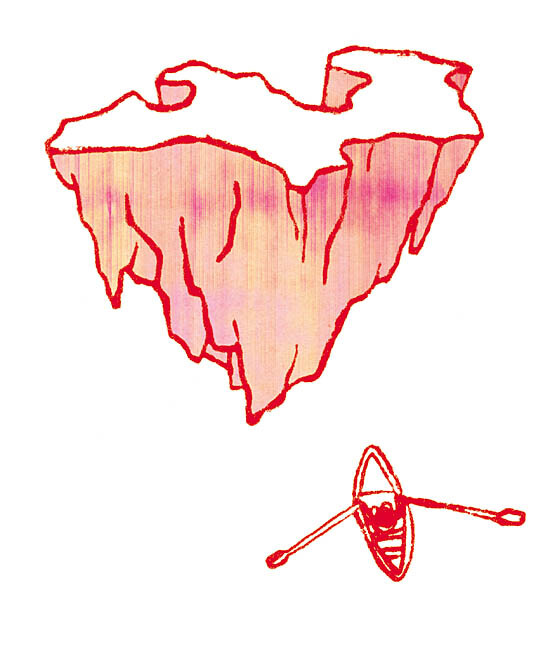
소록도에 와서 가장 먼저 놀랐던 점은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제 막 섬에 발을 들여놓은 내게 다들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혹시라도 아는 사람인지 자세히 들여봤지만 생면부지다. 알고 보니 소록도에서는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인사하는 문화가 있고, 나 또한 2주간 자원봉사를 하며 지나가는 이들 누구에게나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는 문화에 자연스레 익숙해졌다. 작은 사슴을 닮았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소록도는 잘 알다시피 일제 때 한센병 환자들을 강제 수용했던 곳이다. 말로만 들어온 터라 소록도에 도착해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만 해도 생명의 기운이라곤 느낄 수 없는 늙은 환자들이 다 쓰러져가는 칙칙한 판잣집에서 뒤엉켜 살고 있을 거라 예상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선 한센병 양성 환자들은 병원에서 치료하고, 완치된 사람은 오목조목 형성된 각 마을에 거주하며 텃밭 농사도 짓고 돼지와 같은 가축들을 기르며 사는 공동체로 변화됐다.
짧은 기간 동안 지내며 가능하다면 다시 오고 싶을 만큼 난 소록도를 좋아하게 되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순박해서 이곳이 좋다고들 하지만, 천형으로 불리던 한센병을 앓으며 문둥이라는 치욕스런 이름을 달고 살았던 그분들의 가슴에 박힌 가시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나로선 쉬이 말할 수 없었다. 내가 소록도를 좋아하는 이유는 누구에게나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어요?”라고 묻고 대답할 수 있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서로가 누구인지 어떻게 사는지 꿰고 있는, 자기 집 감을 옆집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인간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돈이 너희를 구원하리라’는 현대의 복음이 판치는 파탄된 윤리의 세계에서 난 사람들이 숨쉴 수 있는 대안은 힘없는 소수자들이 모여 자급자족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이라 생각했다. 자신의 이익만이 중요하고 타인의 간섭을 기피하는 극도로 개인주의화된 삶을 살아오며 난 늘 작은 공동체를 꿈꾸었다. 일본의 학생들이 등교 거부를 한 뒤 어느 섬을 사들여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는 소설 와 간디학교와 같은 생태교육 공동체는 탈학교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성미산을 지키며 가꾸어진 성산동 공동체를 보며 감동을 받곤 했다. 아나키즘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폭력적인 국가에 맞서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닌 자발적으로 모인 소수자들의 사회주의 공동체를 꿈꾸었기 때문이고, 쿠바나 프랑스의 어느 사회주의 공동체는 10대 시절 나의 유토피아였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자 그 모든 게 철없는 판타지에 불과한 듯해 무기력해졌지만, 소록도를 보며 다시 이웃과의 경계를 허물듯 담장을 허문 집에 텃밭을 일구고 자급자족하며 살고 싶어졌다.
“한 맺힌 인생이지. 가족들과 헤어지고, 인간 사회에서 소외되고. 방 안에 있으면 이젠 외로움과 고독만이 있을 뿐이야. 나야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지.” 소록도에서 지내며 친해진 한 할아버지의 애처로운 삶은 소록도 주민들의 한이 서린 섬에 더욱 애착이 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노령화된 이곳의 주민들이 사라진 뒤에도 소록도가 단순한 관광지가 되지 않고, 에이즈 양성환자들과 같은 소수자들의 또 다른 삶의 터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단독] 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집행 못 했다…남은 5일은? [단독] 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집행 못 했다…남은 5일은?](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6/53_17720869463045_20260226502791.jpg)
[단독] 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집행 못 했다…남은 5일은?

국세청 직원과 싸우다 던진 샤넬백에 1억 돈다발…고액체납자 81억 압류

박정훈, ‘항명’ 기소 군검사 재판서 “권력의 사냥개들” 비판

기초연금 개편, 차등 지급·수급자 감축 검토

‘법 왜곡죄’ 국회 본회의 통과…판·검사 최대 징역 10년

조희대, ‘노태악 후임’ 선거관리위원에 천대엽 내정

동사무소 직원 ‘점 하나’ 실수로 남동생이 남이 되었다

‘안귀령 황당 고발’ 김현태, 총부리 잡혔던 전 부하 생각은?

‘농지 전수조사’ 준비 착수…매각명령, 매해 1000명서 대폭 늘 듯

국힘 지지율 17% “바닥도 아닌 지하”…재선들 “절윤 거부에 민심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