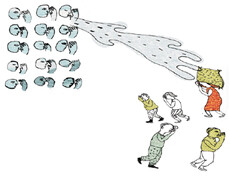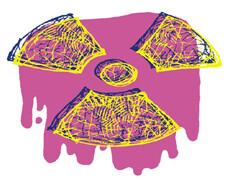이태옥 | 영광 여성의 전화 사무국장
“오메 성질난거.”
한글교실 자원봉사자 금안씨가 그답지 않게 차에 올라타며 성을 낸다.

진도에 따라 2개 반으로 나눠 한글교실을 진행하는 터라 우리 반(은나라반)의 수업이 끝나면 은하수반 자원봉사자 금안씨를 태우러 금순 할머니네 집앞에서 “빵빵”대야 한다.
2시간 동안 한글과 씨름하며 할머니들과 목 터지게 큰소리치느라 칼칼해진 목을 금순 할머니가 쥐어준 한 조각 사과나 귤로 풀곤 했는데, 툇마루 끝에 서서 손 흔드는 할머니의 모습이 오늘따라 더 처량해 보인다.
“뭔 일이여?” 묻는 내게 “싸가지 없는 자식놈들이 셋이나 있음 뭣혀. 이번 설에 한놈도 안 왔다잖여. 내가 이렇게 화가 난디 금순 할머니는 그 속이 어쩔 것이여”라며, 남의 자식이라도 너무한다며 가슴을 친다.
“의사, 회계사 아들 뒀다고 동네 사람들 부러워하드만 그 잘난 아들들이 명절에 혼자 사는 어머니도 안 들여다봤다~고라~고라.” 나도 함께 흥분할 태세를 갖춘다.
금순 할머니는 한글교실 초반부터 두각을 나타냈었다. “오메 잘허네. 글 다 알구만 뭣하러 왔소?”라고 칭찬성 타박을 주노라면 금순 할머니는 수줍게 일그러진 웃음을 보이곤 했다.
다른 사람들이 기역, 니은을 외칠 때 가위, 나비를 읽으며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하던 할머니였는데 1년여가 지난 지금에야 줄줄 쓰고 읽게 되었어도 배움에 대한 욕심은 커져만 갔었다.
“혼자 삼시롱(살면서) 뭣한다고(왜) 일만 한디야”라는 동네분들의 타박에 신 척(들은 척)도 안 하며 금순 할머니는 억척스럽다 싶을 정도로 품팔이에 매달렸었다.
40대 중반에 혼자 되어 농사지으며 아들 셋, 딸 셋을 키워내느라 오죽 죽을힘 쏟았을까 싶다. 행인지 불행인지 아들들은 공부를 잘해주었고 명문대 명문학과를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금순 할머니의 말년 인생을 부러워하는 이들이 많았을 게다.
“오메, 나는 한놈만 안 왔어도 속이 이렇게 에린디(아픈데)….” 옆에 앉은 흠순 할머니가 거들자 “아녀, 눈 오고 길 안 좋응께 나가 못 오게 혔어. 즈그덜 뒷바라지도 제대로 못한 애민데, 뭐.” 자식의 허물을 얼른 자기 것으로 돌리는 금순 할머니에게로 향하는 애잔함을 어찌할 수 없다.
세 아들 중 고등학교밖에 못 가르친 둘째아들은 아직도 어머니에게 잘못을 뒤집어씌운단다. “왜 나만 대학공부 안 시켰냐”며 큰일이 있을 때마다 손을 벌린다는 40줄의 아들과 그저 미안하고 죽을죄를 지어서 일년 내 들판에서 품 팔아 벌어들인 돈을 자식 밑으로 쏟아붓는 70줄의 어머니.
“아직 나가 할 일이 있당께. 둘째아들 손주놈 내년에 대학 간디, 대학은 나가 가르칠 것이여.”
죽을똥 살똥 일에만 매달리는 금순 할머니의 가슴속엔 손주 대학 뒷바라지로 아들에게 진 빚(?)을 갚을 요량이 하나 차 있다.
한없이 쪼그라지던 할머니가 한글공부하면서 차츰 자신감을 찾아가는 모습에 그나마 위안 삼아본다. 지난 시간에 배운 주민등록번호까지 외워버린 영리한 금순 할머니가 “느그덜 이번 설에는 꼭 내려오니라”고 내년 설엔 자식들에게 당당히 큰소리칠 수 있길 바라본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60살 이상, 집에서 6천보만 잘 걸어도 ‘생명 연장’…좋은 걷기 방법

부산 찾은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이었어도 코스피 5천~6천 가능성”

미국 공수부대 대규모 본토 훈련 취소…이란 지상전 투입설 확산

배우 이재룡, 또 음주운전 사고…중앙분리대 들이받고 도주까지

트럼프 “이란, 오늘 매우 강력한 타격 입을 것”…공격 확대 시사
![‘두번째 기회’는 안희정이 아닌 ‘김지은 동지’에게 [.txt] ‘두번째 기회’는 안희정이 아닌 ‘김지은 동지’에게 [.txt]](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7/53_17728477491692_20260305504002.jpg)
‘두번째 기회’는 안희정이 아닌 ‘김지은 동지’에게 [.txt]
![장래 지도자 선호도…조국 9%, 김민석·장동혁·한동훈 4% [갤럽] 장래 지도자 선호도…조국 9%, 김민석·장동혁·한동훈 4% [갤럽]](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6/53_17727619029891_20260306500988.jpg)
장래 지도자 선호도…조국 9%, 김민석·장동혁·한동훈 4% [갤럽]
![[단독] 윤석열,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냈다…위헌심판 기각에 불복 [단독] 윤석열,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냈다…위헌심판 기각에 불복](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6/53_17727819701798_20260306502051.jpg)
[단독] 윤석열,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냈다…위헌심판 기각에 불복

트럼프, ‘이민 단속 논란’ 놈 국토안보장관 경질…“청문회 발언이 결정적”

별 떨어진 후덕죽 “반성의 기회”…손종원 ‘더블 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