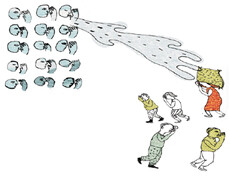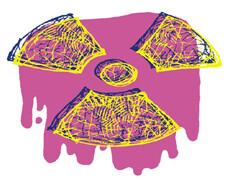화장동 동네 앞에서 판례 할머니 태워 나뭇단 가득 쌓인 장자동 안순 할머니 집 앞에 차를 세우니 인기척이 없다.
“워째 신발이 한나도 없네. 아무도 안 온 것 아니여?”라며 은하수반 자원활동가 정금안씨와 걱정스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집주인인 안순 할머니가 부스스한 머리로 방문을 밀다가 화들짝 놀란다.
“아니 오늘이 개학날인디 워째서 사람이 한나도 없다요. 뭔일이여?” 소리부터 밀고 들어서니 안순 할머니 “낼 아니고 오늘이여?”라며 숙제 못한 학생마냥 안절부절못한다.

“지난주에 와서 지지리 이번부텀은 화요일, 목요일에 한글공부 한다고 귀에 못 백히도록 야그하고 간께 한나도 안 오문 어쩐다요? 장자동 파장해야겄네, 그란해도 오라는 디 많은디”라고 부러 으름장 놓자 안순 할머니 “나가 잘못 알았는가벼. 어쩐다요. 눈이 안 뵌께 전화 좀 넣으씨요”라며 전화기 내놓는다, 닳고 닳은 전화번호부 뒤적인다 하며 정신이 없다.
“눈이 어두워 모른께 선상님이 쪼까 찾으씨요”라며 전화번호부 뒤적이다 페이지 한자락을 펼쳐준다. 읽도 못하고 숫자는 어두워도 달아빠진 책장 속의 손 흔적과 뒤섞인 낙서로 은하수반 반장 귀연 할머니집 전화번호를 짚어준다.
몇집 전화 돌려봐도 한낮엔 남의 집 일을 가던가 마실 나가 집에 눌러 있는 사람이 없는 게 시골마을의 겨울 한낮이다.
“모다들 낼인 줄 알고 있는가벼”라며 눈치 보는 안순 할머니에게 화장동 판례 할머니가 부아를 지른다. “장자동은 그만허고 화장동서 하잔게. 모일라 치문 이보담 낫제.”
기왕 온 길이니 두 사람에게 공부하자며, 칠판 들이고 웃옷 벗어젖히며, 5개월 전 기억 끄집어내니 가물가물 입에는 안 붙고 답답한 표정들이다.
“오메 어찌 안 잊어버렸다요. 잘허네” 하고 추어올리다가 막히는 구석에는 “잊어버렸으면 어쩐다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하제 뭐…. 겨울도 질고 헌께 꺽정들 마씨요”라며 부러 태평 떠니 그제사 맘 푸시는 표정들이다.
한창 “사자, 거위…” 외고 있는데 “딸들 왔남?” 하며 79살 최고령자이신 양례 할머니가 미닫이 문을 열다 “오메 선상님들 오셨소” 하며 반기신다. 살은 약간 빠졌어도 짱짱해 보이신다.
“난 몰랐당게. 어째 안 알려줬당가?” 눈 흘기며, 양례 할머니도 끼어앉아 “거울, 아버지”를 소리 높여 외치신다.
‘잘한다’를 추임새 삼아 소리 높여가는데 순애 할머니 마실 왔다가 눌러앉고, 막판엔 은하수반의 흠순 할머니까지 놀러왔다가 공부에 동참한다.
한창 농사일로 밀쳐놓았던 한글공부 시작하려니 어설퍼도 2시간 하고 보니 자신감 붙은 표정이다.
연필로 한 글자 한 글자 짚어가며 읽어나가는 양례 할머니 손떨림이 봄보다 심해지신 것 같아 걱정이다. 오늘 복습한 것 10번씩 읽어보고 한번씩 써오라는 숙제를 내놓으니 양례 할머니 “나는 손이 떨려서 못 써“라며 걱정스런 기색 역력하다. “할머니, 글씨 못 쓰면 어쩐다요. 읽기만 해도 어딘디. 안 써와도 암시렁 않은께 읽어만 오씨요”라고 달래니 “그래도 돼?”라며 밝은 웃음 내보인다.
다섯명 학생으로 꽉 들어찬 안순 할머니네 사랑방이 학구열로 후끈 달아오른다.
이태옥 | 영광 여성의 전화 사무국장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미 국방 “오늘 이란 공격 가장 격렬할 것”…전투기·폭격기 총동원 예고

‘국힘 당원’ 전한길 “황교안 보선 나왔으니 국힘은 후보 내지 마”
![[단독] 경찰, “김병기 배우자, 3년 전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인정” 진술 확보 [단독] 경찰, “김병기 배우자, 3년 전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인정” 진술 확보](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0/53_17731327937719_20260310503420.jpg)
[단독] 경찰, “김병기 배우자, 3년 전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인정” 진술 확보

‘명태균·김영선 무죄’ 선고 판사, ‘해외 골프 접대’로 500만원 벌금
![[단독] 조희대 대법, ‘재판소원법’ 대응 TF 꾸린다…헌재도 실무 준비 [단독] 조희대 대법, ‘재판소원법’ 대응 TF 꾸린다…헌재도 실무 준비](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0/53_17731217429546_20260127500444.jpg)
[단독] 조희대 대법, ‘재판소원법’ 대응 TF 꾸린다…헌재도 실무 준비

이란 안보수장 “트럼프, 제거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김정은 ‘두 국가’ 선언은 생존전략…전쟁 위험 극적으로 줄었다”

윤석열 “출마하시라 나가서 싸우라”…선고 다음날 ‘내란 재판 변호인’ 독려

문형배 “법왜곡죄, 국회 입법 존중해야…나도 고발 여러 번 당했다”

이란 모지타바, 아버지의 ‘핵무기 금지 파트와’ 깨고 핵무기 가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