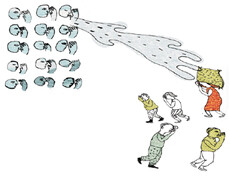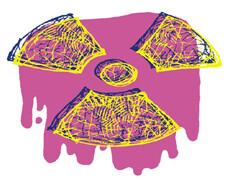이태옥/ 영광 여성의 전화 사무국장
“한번도 내 삶을 후회하거나 원망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성운동의 ‘따까리’를 자처하며 사는 게 행복합니다. 내일 죽는다 해도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겁 없이 내뱉은 말이다.
영광댁 이야기를 쓰면서 만나게 된 사회단체 회원들과의 자리에서 난 감히 내 인생을 정리하듯 말하고 말았다.
너무 폼 잡느라 오버했나 싶어 “너 니 말에 책임질 수 있어?”라며 곱씹어 물어봐도 “그렇다”.

인생이니 삶의 목표니 등등의 단어들이 오히려 어색하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다. 지나고 보니 진흙길이었고 깎아지른 벼랑도 넘어봤지만 그럭저럭 살다보니 여기까지이다.
월드컵 때였다. “자잘하고 소소한 농촌 사람들 이야기를 써달라”는 고경태 팀장의 전화를 받고 고치기를 수십번 거듭하며 떨림으로 첫 원고를 보냈던 것이 1년8개월이나 되었다.
얼마 전 마~악 마침표를 찍은 원고를 보던 큰아들이 “엄마는 꼭 마지막에 이렇게 쓰시네요”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코 내가 너무 오랫동안 이 난을 잡고 있었구나” 싶었다.
공교롭게도 그제가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전남농민장으로 장례를 치른 지 7주기였다.
서울·수원·김포·평택·부여·공주·정읍·고창·광주·화순·곡성·영암·고흥·함안 등 전국에서 농사짓거나 다시 도시민이 된 보고 싶던 사람들이 실컷 왔다갔다. 농민운동 하겠다고 여성농민회 만들겠다고 비닐하우스 치며, 소젖 짜며, 돼지 키우며 빚에 쪼들려도 세상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연차는 다르지만 농사짓다 도시로 떠밀려가 각각의 일터에 자리잡은 마음 따신 사람들과 나눈 그리움이 아직도 가슴 가득하다.
인간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라 한다. 맞는 말이다. 사랑하는 동지이고 남자였던 남편을 먼저 보내고도 순간순간 내게 밀려오는 “행복감은 무엇일까?” 하는 의문에 사로잡히기도 했지만 행복하기도 했다.
여성운동은 다양성을 품을 가슴과 위풍당당함을 가르쳐주었다. 내 인생의 고비에서 만났던 여성운동에 감사할 따름이다. “혹여 이 글이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는 2002년 6월 어느 날 첫 글의 마지막 글귀처럼 이 글이 농사짓는 사람들이나 여성들에게 누가 많이 되었을 줄 안다.
짧은 시선에도 불구하고 애정의 눈길 거두지 않은 독자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허락 없이 자신들의 이야기가 곡해(?)되어 실리고도 모른 척해준 영광 사람들과 우리 마을 신평 어르신들에게 겁나게 미안하다.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사람들 틈에 끼여 행복하게 살고 싶다. 자유무역협정(FTA)의 무시무시함을 아는지 모르는지 밭 가운데서 백발 노부부가 포도나무 가지를 순치기하는 모습이 정겹다. 그래도 땅을 지키고 사는 이들로 가슴 더워지는 세상이라 믿고 싶다.
☞ '영광댁 사는 이야기' 이번호로 마칩니다. 그동안 사랑해주신 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60살 이상, 집에서 6천보만 잘 걸어도 ‘생명 연장’…좋은 걷기 방법
![‘두번째 기회’는 안희정이 아닌 ‘김지은 동지’에게 [.txt] ‘두번째 기회’는 안희정이 아닌 ‘김지은 동지’에게 [.txt]](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7/53_17728477491692_20260305504002.jpg)
‘두번째 기회’는 안희정이 아닌 ‘김지은 동지’에게 [.txt]

부산 찾은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이었어도 코스피 5천~6천 가능성”

미국 공수부대 대규모 본토 훈련 취소…이란 지상전 투입설 확산

‘항명’ 박정훈 준장 진급…이 대통령 “특별히 축하드린다”

트럼프 “이란, 오늘 매우 강력한 타격 입을 것”…공격 확대 시사

“유심 교체하고 200만원씩 이체하세요”
![[단독] 윤석열,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냈다…위헌심판 기각에 불복 [단독] 윤석열,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냈다…위헌심판 기각에 불복](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6/53_17727819701798_20260306502051.jpg)
[단독] 윤석열,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냈다…위헌심판 기각에 불복

배우 이재룡, 또 음주운전 사고…중앙분리대 들이받고 도주까지
![[단독] ‘쿠팡 가만 안 둬’ 스코틀랜드 3위 연기금, 총대 메고 소송 전면전 [단독] ‘쿠팡 가만 안 둬’ 스코틀랜드 3위 연기금, 총대 메고 소송 전면전](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1217/53_17659590361938_241707891273117.jpg)
[단독] ‘쿠팡 가만 안 둬’ 스코틀랜드 3위 연기금, 총대 메고 소송 전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