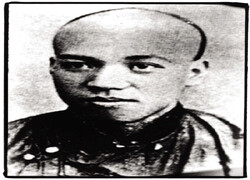유교적 기제들은 동원 수단 불과… 동구 및 아시아 ‘현실 사회주의’의 문화전략 중 하나일 뿐
12년 전 필자가 교환학생이 되어 처음 한국에 갔을 때 필자의 지도교수에게 남한이 어떤 곳인가를 여쭈어보았다. 북한의 석학들과 교류도 하고 학술대회 등의 기회로 북한에도 몇번 가본 지도교수는 이야기를 길게 한 뒤에 필자를 놀라게 한 말을 했다. “남북한의 차이는 유교적 자본주의와 유교적 사회주의의 차이일 뿐이요. 외국에서 이식된 껍데기는 달라도 유교라는 알맹이는 같소. 명심하시오!”

‘유교왕국론’에 강한 의심을 느끼다
필자는 속으로 어리둥절했다. 남한은 규율과 궁핍의 사회인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개방된 서구형 사회라고 상상했기 때문이다. 나중에 그 상상은 다소 깨졌지만 ‘유교적 자본주의’라는 성격 규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웠다. 나 에서 읽어낼 수 있는 ‘유교’보다는 군사적인 규율의 내면화와 자본주의적 생존 공포에서 파생되는 ‘승리 제일주의’ 등이 훨씬 더 실감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남한에 대해서는 필자가 그때부터 ‘유교적 성격’ 등을 들먹이는 것을 꺼렸지만, 잘 모르는 북한에 대해서는 “그쪽을 1950년대부터 아는 지도교수님이 잘 아시겠지” 하며 유교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다고 믿게 되었다. 더군다나 소련이 붕괴한 뒤에는 ‘북한의 유교적 사회주의’(즉, 전근대적 유교 왕권의 근대적 재현론)가 러시아 한국학계의 통설쯤으로 됐기에 의심을 갖기가 힘들었다.
북한을 정치적으로 혐오하는 1990년대 일각의 젊은 학인들은 ‘시대착오적인 유교 왕국’이 곧 무너지리라고 말했던 반면, 중립적인 입장인 다수 전문가들은 ‘민족문화의 진수인 유교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생명력이 더 강하리라고 반박했다. 대북관은 달라도 “유교적 가치가 북한 사회의 기초”라는 테제는 공유한 셈이었다.
북한에서 몇년간 통역원으로 일하고 이북 사회에 대한 ‘내재적인 접근’을 해온 한 러시아 중진 전문가는 최근에 낸 라는 교과서에서 북한의 공식적인 ‘집단주의 원칙’이나 ‘사회주의 대가정론’을 충효사상에, ‘생활총화’(주기적인 ‘호상비판’과 자아비판)를 향약제도에 각각 대비시키는 등 ‘유교적 사회주의론’을 구체화하기도 했다. 그는 남한의 반공규율 사회도 같은 ‘유교 정신의 규범적 구현’으로 보고 박정희주의에 대한 비판을 ‘타 문화에 대한 몰이해’라고 반박까지 했다.

이 관점은 옛 소련의 한국학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3년 전 80년대 세대에 큰 영감을 준 미국의 수정주의 사학자 브루스 커밍스는 (한국어 번역: , 김동노 옮김, 창비, 2001)라는 책에서 북한을 ‘유교적인 근대국가’로서 이해하고 있다. 커밍스는 ‘어버이 수령’이나 충성·효성·은덕과 같은 북한 정치 용어들의 뻔한 유교적 계보의 추적에 그치지 않고 ‘정심수신’(正心修身), 즉 도덕적 수양만이 진정한 인간을 키울 수 있다는 유교의 훈육주의적 도덕주의와 주체사상의 ‘사회·정치적인 생명’(제1생명)과 ‘주체형 혁명가 만들기’의 논리를 유형적으로 비교하기까지 했다.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내재적 접근을 문화론적으로 구체화한 점에서는, 커밍스에 의해서 전개된 이 ‘근대형 유교국가론’이 분명히 장점도 있다. 그러나 최근에 필자는, 서구 학자들에게 거의 정설이 된 듯한 이 ‘북한의 유교적 근원론’에 강한 의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물론 북한 정치론이나 일상 문화의 많은 요소들이 유교적 이데올로기 일색인 조선시대의 정치·생활적 상식에 기인한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만약 이 요소들을 확대 해석하여 북한 전체를 몽똥그려 유교적인 사회로 범주화한다면, 그것은 에드워드 사이드가 이야기했던 오리엔탈리즘의 일종에 해당될 우려가 많다.
오리엔탈리즘의 짙은 냄새
유럽의 전형적인 오리엔탈리즘에서는 동양을 ‘시간이 멈춘, 진보할 줄 모르는, 정체된 곳, 과거만이 보이는 곳’으로 인식했는데, “한반도 사회는 전통적 유교주의를 벗어날 수 없다” “아무리 근대화·현대화를 외쳐봐야 유교주의자일 뿐이다”라는 담론이 이 ‘근대형 유교 왕국론’에서 논리적으로 나온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침략을 막으려는 커밍스 같은 진보 학자들은 미국인들이 납득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북한의 체제와 문화를 긍정적으로 이해시키려는 취지에서 ‘위대한 철학’으로 생각하기 쉬운 유교와 북한의 현실을 연결시키는 셈이지만, ‘불변한 유교 왕국론’은 서구인의 전유물인 ‘근대’에 ‘유교주의자로 태어난 그들’이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이 ‘유교 왕국론’에 의거해서 쓰여진 북한 관련의 러시아, 서구인들의 텍스트를 읽을 때 “동양은 동양이고 서양은 서양이니 그들은 영원히 만날 수 없는…”이라는 영국 제국주의의 시인 키필링(1865~1936)의 오리엔탈리즘적 문구가 떠오른다. 북한의 정치·문화는 정말 근대의 얇은 외피 밑에 전근대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아 재배치한 것뿐인가
물론, 북한의 제도 이념들은 유교적인 문맥이 강한 많은 전통적인 개념적 기제들을 활용한다. ‘김일성 민족’은 하나의 가부장적 대가정이며, ‘밑’의 충성과 효성이 ‘위’의 은덕과 전통적 방식으로 교환된다. 태양절(4월15일 김일성 생일) 때의 ‘명절 공급’은 일종의 하사품으로, 김일성 묘는 현대판 종묘의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통의 가시적인 ‘근대적’ 효용이 과연 이북에만 있는 것인가
소련의 경우 공산당 집권층은 이미 1920년대 중반부터 전통적인 정교회(正敎會)의 기독교 신앙을 강하게 연상시키는 각종 상징적·이념적 기제들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미라로 처리돼 영구 보존된 레닌의 시신은 원래 정교회 신자들의 최대 숭배 대상인 성인의 성골(聖骨)을 가시적으로 연상시켰으며, 레닌의 묘를 방문하러 모스크바를 멀리에서 찾는 노동자·농민들은 자신을 ‘순례자’라고 지칭했다.
기독교가 아직 세계 인식을 주도했던 민간에서는 사무실마다 걸린 마르크스·레닌의 초상화들이 ‘성상’으로, 꼭 읽고 인용해야 할 지도자들의 노작을 ‘성경’으로, 그리고 경건한 모습으로 임해야 하는 당 회의를 ‘예배시간’으로 각각 불렀다. 러시아 공산당으로서는 종래의 종교적 패턴의 이용이 어쩌면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다. 그래야 농민 문맹자의 나라를 ‘압축적 근대화’에 총동원하기 위한 문화적 헤게모니를 장악해 권력의 정통성에 강력한 합의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것은 북한이나 러시아의 ‘불변하고 정체된 유교적/정교회적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체제와의 긴장 관계 속의 따라잡기식 ‘속성 근대화’와 전통적 대중의 동원의 문제다. 이와 같은 대중적 종교성·전통 상징성의 폭넓은 이용, 종전 상징들의 교묘한 재배치는 동구권 및 아시아의 ‘현실 사회주의’의 중심적 문화 전략 중의 하나라고 봐도 될 듯하다.
“주자의 외투를 빌려입은 1900년대 신채호”
그러나 극도의 중앙집권제인 북한의 체제는 향촌에 상당한 자율성을 부과했던 유교 왕권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북한 국가전략의 목적은 전통 유교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강성대국의 건설’ ‘주권 국가 사수’ 등이고, 정책 기조도 유교의 기조와 상반되는 ‘선군 정책’이다. 그렇다면 유교적 기제들은 동원 수단에 불과하고 동원의 목적은 메이지식의 ‘부국강병’과 일정한 유사성을 보이는 군사주의적 근대 규율 사회의 건설·유지일 것이다. 메이지 프로젝트나 동북아·동남아 지역에서의 메이지 계통의 프로젝트(남한·대만·싱가포르의 권위주의적 근대화 등)들과의 차이라면, 그것이 주로 북한의 세계 체제 바깥에서의 국제적 위치와 사회주의적 변혁 과정에서 엘리트층의 전면적 교체 등일 것이다.
그토록 많은 외국인들이 북한의 진면목으로 아는 유교적 냄새를 풍기는 상징물들은 결국 극단적인 근대주의라는 북한 얼굴 위의 한 마스크에 불과하다. 커밍스는 김일성을 ‘마오쩌둥(즉, 공산주의)의 외투를 빌려입은 주자(朱子·성리학의 창립자)’라고 부르지만, 필자는 그를 차라리 ‘주자의 외투를 빌려입은 1900년대의 신채호’라고 부르고 싶다. 그의 극단적·국가주의적인 반외세적 근대주의는 개화기의 급진적인 민족주의와 상통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개화기부터 오늘날까지 남북을 포함한 한반도의 근대 프로젝트에 대한 ‘친북’과 ‘친남’을 지양한 탈근대적·탈민족주의적 종합 분석이 이루어지고 김일성주의의 근대주의적 뿌리가 분명해진다면 자연적으로 ‘불변의 유교주의’ 같은 서구 중심주의적 오리엔탈리즘의 목소리들도 조용해질 것이다.
[참고문헌]
1. Charles Armstrong,
2. D. L. Brandenberger; A. M. Dubrovsky, “‘The People Need a Tsar’: The Emergence of National Bolshevism as Stalinist Ideology, 1931∼41”, -
3. Bruce Cumings,
4. S. O. Kurbanov,
5. Nina Tumarkin, “Religion, Bolshevism, and the Origins of the Lenin Cult”,
박노자 | 오슬로국립대 교수 · 편집위원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1/53_17732246670747_20260311503553.jpg)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

관세 ‘만능키’ 꺼낸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한국 포함

장동혁 “지방선거 전 징계 논의 중단”…오세훈 인적 쇄신 요구는 외면

‘왕사남’ 장항준 “막살고 싶은데…와이프가 경거망동 말라 해”

침묵하던 장동혁 “절윤 진심”…오세훈, 오늘 공천 신청 안 할 수도

‘오래된 지도로 잘못 공격’…미군, 이란 초교 ‘170명 집단희생’ 조사

미 민주당 “이 대통령 덕에 안정됐던 한미 동맹, 대미 투자 압박에 흔들려”
![‘공소취소 거래설’ 진실은? [그림판] ‘공소취소 거래설’ 진실은? [그림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311/20260311503585.jpg)
‘공소취소 거래설’ 진실은? [그림판]
![‘절윤’ 결의에도 국힘 지지율 여전히 17% [NBS] ‘절윤’ 결의에도 국힘 지지율 여전히 17% [NBS]](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2/53_17732834157654_20260312501458.jpg)
‘절윤’ 결의에도 국힘 지지율 여전히 17% [NBS]

이스라엘, 이란 정권 붕괴 기대했지만…“환호가 좌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