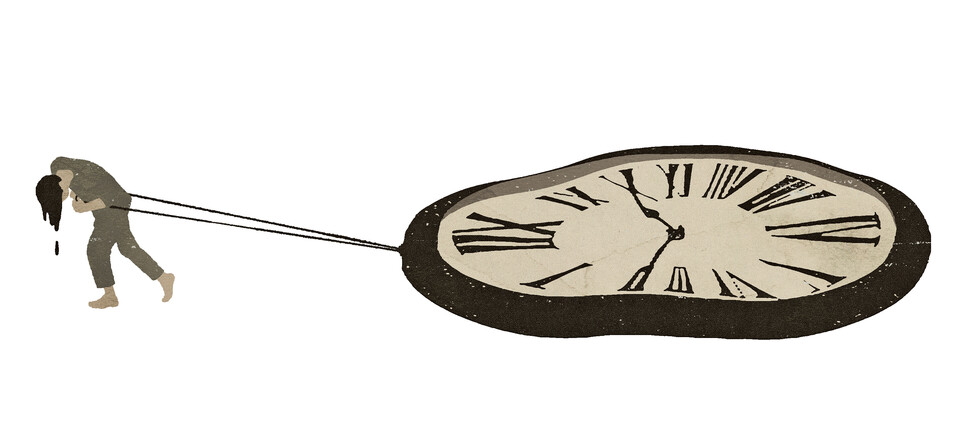
일러스트레이션 이강훈
은행잎이 물들어가는 것을 알아채고 황망했다. 벌써 가을인가. 올해 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밀리고 밀린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요즈음. ‘잠시 멈춤’(?) 했던 시간이 갑자기 빠르게 흐르고, 지난 7~8개월의 일상을 10월 한 달 안에 욱여넣어 한꺼번에 사는 듯한 이상한 느낌이다. 물론 사실이 아니라 느낌일 뿐이다. ‘재택근무’가 특히 여성들에게 집에서의 노동 강도를 심화하고, ‘언택트(비대면) 시대’가 콜센터와 택배를 비롯한 연결노동을 죽도록 바쁘게 했듯, 시간이 ‘잠시 멈춤’ 했다는 표현은 사회 주류의 한정된 경험이자 질문의 대상이다.
‘긴급’이라는 명목으로
전 지구적으로 표준화된 시계와 달력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겪는’ 시간은 원체 한 가지인 적이 없었다. 누구의 시간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가(“감히 회장님을 기다리시게 하다니”). 누구의 시간이 가용자원으로 간주되는가(“너는 프리랜서니까 급할 때 좀 와주면 좋겠어”). 그리고 누구의 시간을 외면하는가(“집에 가면 새벽 5시인데 밥 먹고 씻고 바로 터미널 가면 한숨도 못 자고 또 물건 정리를 해야 한다. 너무 힘들다”-얼마 전 사망한 택배노동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모두 권력이 관통하는 문제다.
지난 수개월 동안 자주 들어온 ‘긴급’이라는 시간성 역시 따져볼 것이 많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세대주가 수령하도록 한 조치는 호주제가 15년 전 폐지된 게 맞는지 의심케 했다. 많은 페미니스트가 지적했듯이, 재난 시기에 심화하는 불평등은 늘 ‘긴급’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됐다. 우리는 ‘긴급’하게 상황을 개선할 수 있지만, 반대로 ‘긴급’의 이름으로 퇴행시킬 수도 있다.
코로나19 이후 가장 ‘핫한’(?) 주제로 떠오른 ‘돌봄’은, 특히 시간의 격차와 불평등을 많이 생각하게 하는 주제다. ‘돌봄 위기’ 담론은 눈에 띌 정도로 늘었지만, ‘위기’ 논의가 정말 위기의 현실을 변화시키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 말은 무성한데, 아무래도 그리 다급하지 않아 보인다. 위기에 대해 말하는 것과 위기를 겪는 것, 그리고 위기를 돌파하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있다.
가령 “노인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라는 요양시설 인력배치 기준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실은 1명의 요양보호사가 2.5명을 돌보는 것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 ‘필요의 시간’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몸은 수시로 상태가 변한다. 식사 시간에는 한꺼번에 많은 손길이 필요하다. 24시간을 2교대나 3교대로 나누어 돌보는 경우가 많기에 서로 겹치는 인수인계 시간도 반드시 필요하다. 평균연령 50~60대인 요양보호사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연차휴가나 병가를 낼 수 있으려면, 대신 돌봄을 맡아줄 다른 동료가 있어야 한다. 적절한 간격의 휴식시간도 필요하다. 이 모든 필요 시간을 무시한 결과, 대부분 요양시설에서는 1명의 요양보호사가 쉼 없이 8~20명을 돌봐야 한다. 그것이 어떤 돌봄일지 상상해보라.
언제나 ‘위기’였던 돌봄의 시간
쉽게 말해서, 법적 기준에 맞게 운영하면 돌봄은 상시적 ‘위기’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요양시설 인력배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이후 10년 넘게 계속됐다. (안 변했다.) 코로나19 때문에 ‘돌봄 위기’가 온 것이 아니다. 돌봄은 언제나 위기였다. 단지 돌봄에서 면제된 사람들에게는 그때도 지금도 위기가 아닐 뿐이다. 어떻게 돌봄 위기를 ‘모두의’ 위기로 만들 것인가.
전희경 여성주의 연구활동가·옥희살롱 공동대표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내란 특검 “홧김에 계엄, 가능한 일인가”…지귀연 재판부 판단 ‘수용 불가’

태진아 “전한길에 법적 대응”…일방적으로 콘서트 참석 홍보·티켓 판매

러 대사관, 서울 시내에 ‘승리는 우리 것’ 대형 현수막…철거 요청도 무시

‘어디서 본 듯한’....국힘 이정현 야상 점퍼 ‘시끌’

트럼프, ‘슈퍼 301조’ 발동 태세…대법원도 막지 못한 ‘관세 폭주’
![[사설] 중국 도발한 주한미군 훈련, ‘단순 항의’로 끝낼 일 아니다 [사설] 중국 도발한 주한미군 훈련, ‘단순 항의’로 끝낼 일 아니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2/53_17717529577243_20260222502024.jpg)
[사설] 중국 도발한 주한미군 훈련, ‘단순 항의’로 끝낼 일 아니다
![[단독] 군 특수본, ‘선관위 장악 지시하달’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기소 [단독] 군 특수본, ‘선관위 장악 지시하달’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기소](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2/53_17717357343273_20260222501198.jpg)
[단독] 군 특수본, ‘선관위 장악 지시하달’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기소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220/20260220502864.jpg)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
![이러다 정말 다 죽어요! [그림판] 이러다 정말 다 죽어요! [그림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2/53_17717564410097_20260222502174.jpg)
이러다 정말 다 죽어요! [그림판]

몸에 피 한방울 없는 주검이 되어 돌아온 새 신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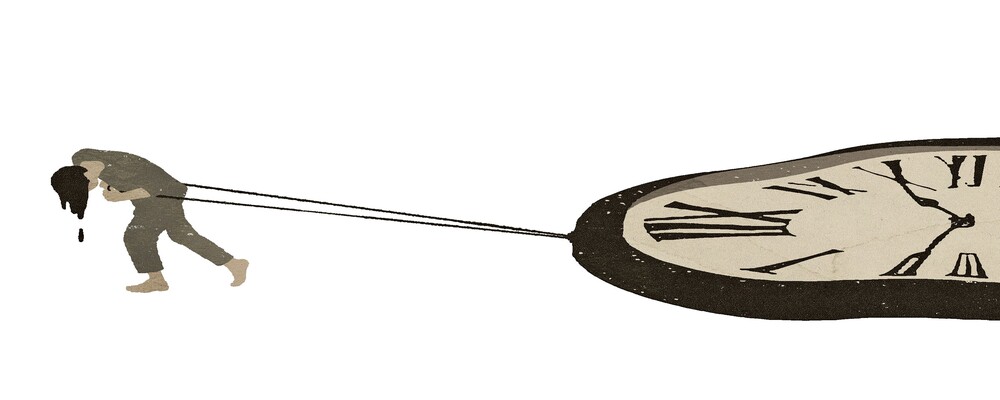



















![[단독] 최대 키스방 사이트 폐쇄되자 복제 사이트 등장 [단독] 최대 키스방 사이트 폐쇄되자 복제 사이트 등장](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711/53_17522195984344_2025071150149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