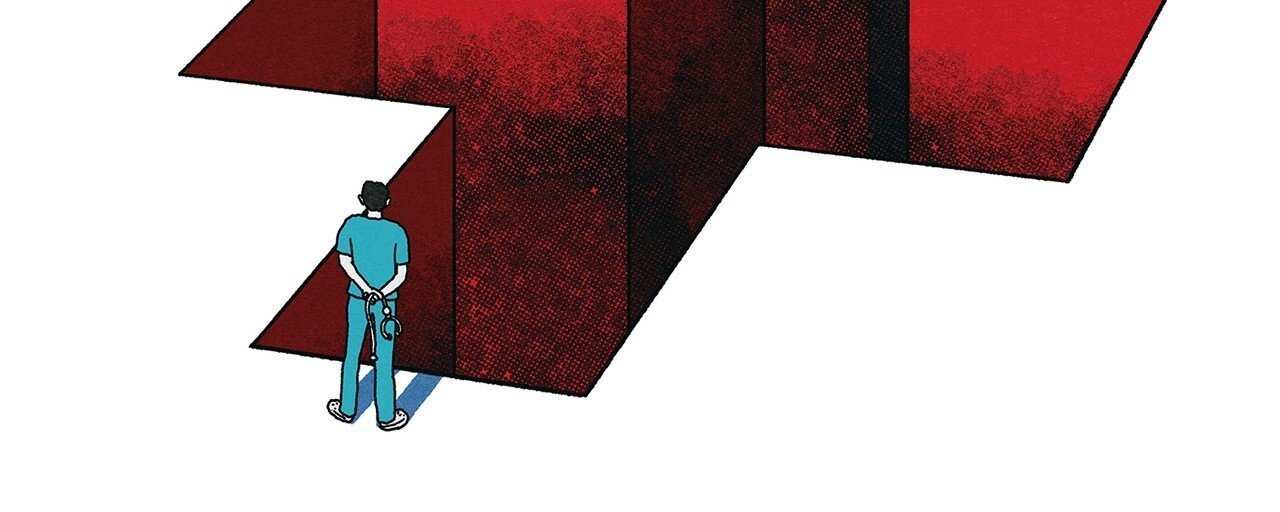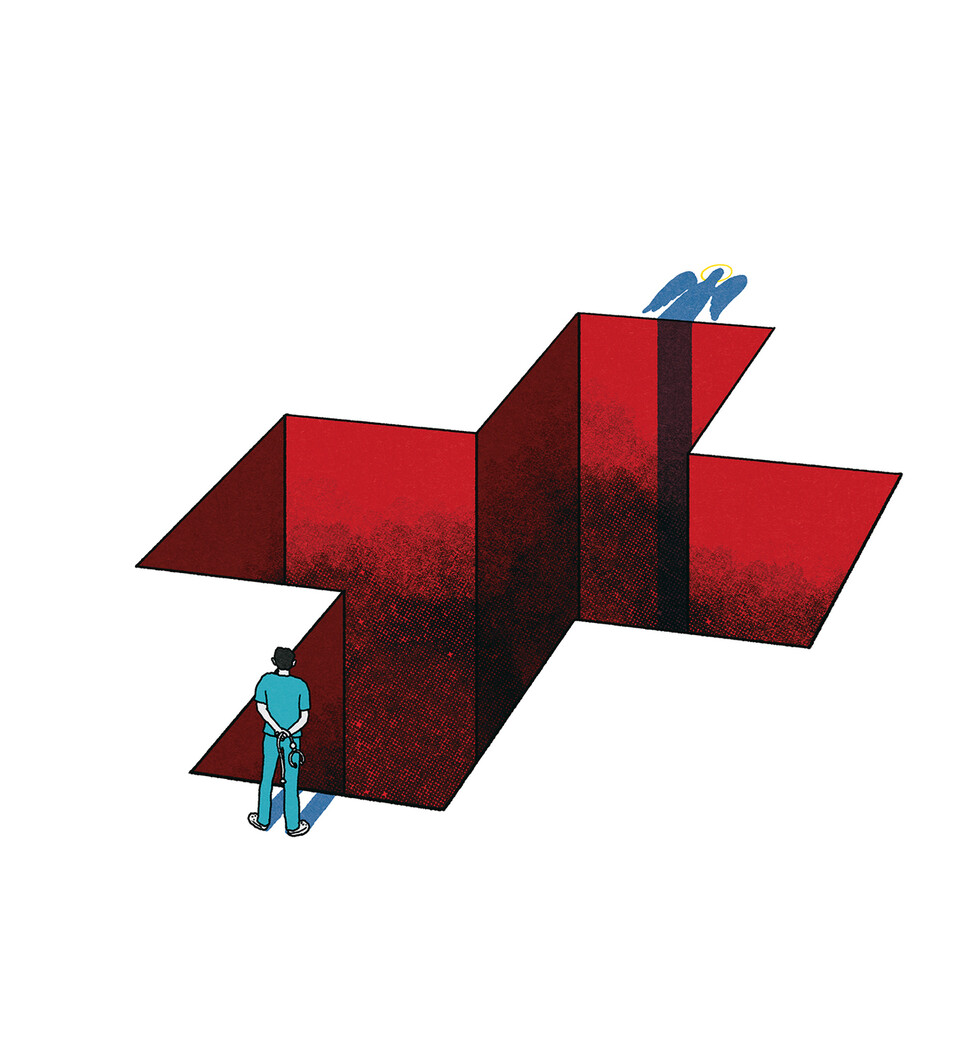
의대생이 돌아왔다. 오랜 의정 갈등을 거치는 동안 의사가 꿈이라는 이들의 말을 참 자주 들었다. 총리, 장관, 양당 대표 등 주요 정책 결정권자 모두가 그들의 말을 경청하겠다고 나섰다. 미디어도 앞다퉈 보도했다. 이미 엄청난 특권이다.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은 1천 일 넘게 길거리에서 천막농성을 해왔지만 그들의 발언은 여전히 주목받지 못한다. 예비 의사들의 그 많은 말을 들었으면서도 나는 아직도 이들이 왜 의사 정원을 한 명도 더 늘릴 수 없다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정부의 성급하고 졸속적인 정책 추진 과정은 논외로 하더라도 필수 진료과의 수가를 인상하고,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하며, 지역수가를 신설하겠다는 필수의료 패키지가 왜 즉각 철회되어야만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보다 못한 일부 교수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특권의식을 버리고 의사의 책임과 공공성을 유념하라고 당부했다. 다수 노동자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삶도 돌아보자고 권했다. 그러나 이 젊은 예비 의사들은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비(非)의사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 자신들과 달리 의대에 오지 ‘못한’ 절대다수의 벌이가 얼마나 소박한지, 다른 직종의 일이 얼마나 쉽게 대체될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젊은 의사의 패닉은 한국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초래한 공포다. 한국 사회는 공부 못하면 인생은 끝이라고 아주 오랫동안 학습시켜왔다. 망하지 않으려고 대학생들은 전부 대기업·공기업에 들어가려 안간힘을 쓴다. 또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의대에 가기 위해 엔(N)수를 감행한다.
이렇게 어렵사리 얻은 의사 면허인데 의대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설립 같은 국가의 개입이 달가울 리 없다. 한국 사회에서 의사는 시련과 고난을 거쳐야 도달할 수 있는 현세의 영웅이다. ‘7세 고시’부터 시작해 의대 입시, 살인적인 전공의 시절을 지나면 비로소 부활하여 영약을 지니고 귀환할 수 있다. 직업적 안정성과 고소득을 지고의 가치로 여기는 풍토가 만든 이 시대의 신화다. 종교를 대체할 정도로 강력한 의학의 권위도 신화의 탄생을 거들었을 것이다. 의사가 진단을 내리면 누구나 그 말을 믿고 고분고분 치료를 따른다. 수전 손택은 이제 일상적인 경험이나 인식을 벗어난 초월적 개념은 의학의 언어로만 존재한다고 봤다. 성직자가 아니라 의사가 구원을 약속하며 최신 의료기술과 약제가 면죄부를 대체한 것이다. 성과 속의 차이는 건강한 자와 병에 걸린 자, 더 나아가 계급 차에 있다. 권위는 스스로 부여할 수 없고 언제나 외부에서 주어지는바, 의사의 권위는 사유하는 법을 잃어버린 이 사회가 만들고 다져온 결과물이다. 지금껏 부모와 사회가 공모해 가장 진부하고 전형적이며 단순한 가치를 추종해온 셈이다. 이번 의료대란을 목도한 미래 세대가 그것을 더욱 당연히 여기고 체화할 것을 생각하면 응급실 뺑뺑이를 지켜보는 것만큼이나 아찔하다.
사유가 필요하다. 어른이 먼저 사유하고 아이들에게도 사유하는 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과거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며 다음 세대의 삶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소통할 때 갈등을 해결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의사가 왜 힘들지만 명예로운 직업인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 때, 초등 의대반이 ‘한강처럼 글쓰기’ 수업만큼이나 어불성설이라는 데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 더 근본적인 가치를 사유하는 법을 장려하는 교육이 존중받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의사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을 것이다.
신성아 ‘사랑에 따라온 의혹들’ 저자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배현진 지역구 공천, 중앙당이 하기로…친한계 공천권 제한

전한길은 ‘가질 수 없는 너’…가수 뱅크도 윤어게인 콘서트 “안 가”

‘윤석열 출국금지’ 국회 보고했다고…박성재 “야당과 결탁했냐” 질책

‘사법개혁 3법’ 통과 앞…시민단체들 “법왜곡죄, 더 숙의해야”

정부, ‘엘리엇에 1600억 중재판정’ 취소 소송서 승소…배상 일단 면해

‘노스페이스’ 영원그룹 회장, 82개 계열사 은폐해 고발 당해

조희대, 민주당 사법 3법 ‘반대’…“개헌 해당하는 중대 내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대낮 음주운전…감봉 3개월

몸에 피 한방울 없는 주검이 되어 돌아온 새 신랑

이 대통령 “나의 영원한 동지 룰라”…양팔 벌려 꽉 껴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