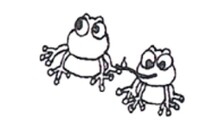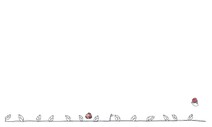일러스트레이션 제천간디학교 이담
6월3일 수요일, 처음 학교에 갔다. 3월에 경험했던 새 학기의 설렘을 느끼기에는 후덥지근한 날씨였다. 우리 학교는 언덕 위에 있어, 등굣길부터 난관이었다. 내 몸속 동맥은 염증으로 좁아졌고, 각종 약의 부작용에 시달린다. 특히 움직인 뒤 숨차서 호흡을 조절하지 못하면 과호흡이 올 수도 있다. 제어하지 못하는 내 숨이 버겁고 상황이 고통스러워서 무섭다. 언덕길은 평지를 걷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서, 위험이 크다. 그래서 아빠 차를 타고 구불구불한 길을 지나 학교 앞까지 올라간다.
차창 밖으로, 첫 등교를 하기에는 너무 더운 날씨를 견디며 올라가는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복잡해진다. 누군가 나에게 ‘너는 왜 차를 타고 올라오냐’고 추궁하면 뭐라 대답해야 할지 괜히 궁리해보기도 한다. 내 몸이 배려받는 게 당연한 상태임을 알지만 다들 걸어가는 상황에서 차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너무 눈에 띄는 것 같다. 병 때문에, 배려받기 위해서보다는 나의 노력이나 능력을 인정받아 두드러지고 싶다.
희귀한 염증이 있는 혈관과 살아가려면 내가 걷는 길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계속 말한다. 차창 밖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가고, 너는 지금 여기 네 길을 가는 거라고.
나는 지난해 9월 병을 진단받고 올해 1월 중학교를 졸업하기까지 학교에 ‘반쯤 발을 걸친’ 상태로 지냈다. 아예 나가지 않은 기간을 모으면 2주에서 한 달 가까이 된다. 학교에 가더라도 주로 한두 교시만을 버티고 집에 왔다. 처음 며칠은 배웅해주던 반 친구들도 그런 일이 두어 달 반복되자 “잘 가” 정도의 인사만을 나누었다. 나의 이른 귀가가, 부재가 자연스러운 일상이 돼가는 듯해 조금은 서운했다. 그 아이들의 길과 내 길이 겹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입안을 씁쓸하게 채웠다.
고등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한 달여 동안 봐왔기 때문인지 아예 초면처럼 침묵이 오래가진 않았다. 하지만 친분이 모호한 아이들 앞에선 실수하지 않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가장 크게 고민한 문제는 두 가지였다. 내 몸은 병마와의 전쟁터이고 나는 여전히 전쟁 중인데, 내 언어가 무겁거나 절박해서 친구들이 쉽게 다가와주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을 평소보다 가볍게 하려고 노력했다.
또 다른 고민은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배려해달라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하나였다. 점심시간에 교실에서 급식실로 이동해야 하는데, 친구 무리에 섞여 가고 싶었다. 나는 본래 느리게 걸으면서 주변을 다 챙겨 보는 걸 좋아하는데 아프면서 더 느려졌다. 친구들에게 좀 천천히 가도 되냐고 말하기가 어려웠다. 용기 내서 물어봤을 때 친구들이 흔쾌히 그러겠다고 해서 안도했지만, 급식실에 갈 때는 한 줄로 서서 바닥에 붙은 안내 표시만큼 정확히 거리를 두고 가야 했다.
아프기 전 학교는 나에게 일상의 궤도였다. 그래서 아프면서, 내 주된 일상의 초점이 ‘학교의 나’에서 ‘내가 가진 다양한 모습’으로 옮겨왔을 때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학교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것처럼, 병을 앓기 전의 나로 돌아갈 순 없다. 놓친 것들에 대한 갈망이 너무 슬펐지만 이제야 조금은 알게 된 것 같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내 모습을 사랑하지만, 그것 외에 많은 부분이 나를 이룬다는 걸. 학교는 성적을 쌓아 올리는 탑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하는 평원이자 바다이자 산길이자 물길이라는 걸.
신채윤 고1 학생
*‘노랑클로버’는 희귀병 ‘다카야스동맥염’을 앓고 있는 학생의 투병기입니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남국불패’...김남국, 인사청탁 사퇴 두 달 만에 민주당 대변인 임명

트럼프가 쥔 ‘관세 카드’ 232조·301조…발동되면 세율 조정 만능키

조희대, 사법개혁 3법 또 ‘반대’…“개헌 사항에 해당될 내용”

“서울마저” “부산만은”…민주 우세 속, 격전지 탈환이냐 사수냐

‘어디서 본 듯한’....국힘 이정현 야상 점퍼 ‘시끌’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220/20260220502864.jpg)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
![국가는 종교를 해산할 수 있는가 [한승훈 칼럼] 국가는 종교를 해산할 수 있는가 [한승훈 칼럼]](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2/53_17717559809613_20260222502135.jpg)
국가는 종교를 해산할 수 있는가 [한승훈 칼럼]
![[사설] ‘무기징역’ 빼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윤석열 1심 판결 [사설] ‘무기징역’ 빼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윤석열 1심 판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2/53_17717557735175_20260222502090.jpg)
[사설] ‘무기징역’ 빼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윤석열 1심 판결

전한길 콘서트 줄줄이 손절…“3·1절 행사라더니 완전 속았다”

‘헌법 불합치’ 국민투표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개헌 투표 가능

![길 뒤의 길, 글 뒤에 글 [노랑클로버-마지막회]](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3/0212/53_16762087769399_20230203500028.jpg)